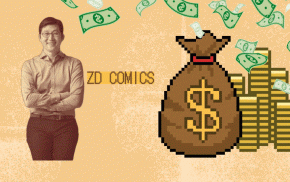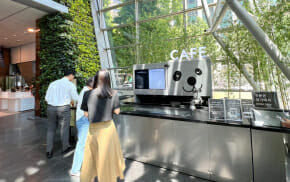친구 A를 소개한다. 이 친구의 '재테크 역사'는 파란만장하다. A가 직장에 막 입사한 신입사원 시절, 은행보다 더 금리가 높다는 말에 저축은행에 저금을 했다. 1년 여가 채 되지 않아 절대 망할 것 같지 않았던 대형 저축은행은 소란스럽게 파산했다.
저축은행에 눈길을 주지 않으리라 다짐한 A는 이번에 국내 1위 시중은행에서 터무니없는 금융상품을 사 몇년 여를 고생했다. 주가연계증권(ELS)에 가입했기 때문이었다. 상환을 몇 차례나 연장한 끝에 겨우 원금을 건졌다. 시간이란 기회비용을 대입하면 손실을 본 것과 다름없었다.

'적금이 최고다'는 의지를 가진 A는 이번에 보험상품으로 전전긍긍 중이다. 신혼집을 마련해야 해 한푼이 아쉬운 시점에, 보험상품을 해지하기가 곤란해서였다. 설계사는 분명 '저축형 보험' 이라고 했지만, 알고보니 연금보험이었다. 심지어 중도 해지 시, 이제까지 낸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품이었다는 것을, 해지하려고 보니 알게 됐다.
이쯤되면 A가 혹시 멍청한 것은 아닌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그렇지 않다. A는 국내 여러 대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을 정도의 일 잘하는 직원이다. 그저 A는 자신의 월급을 조금이라도 더 불리고 싶었던 아주 소박한 마음을 갖고있었던 소시민이었을 뿐.
주위를 둘러보자. A같은 혹은 A보다 더 많이 돈을 잃은 이들이 많다. 금융사들은 수익을 내기 위해, 직원들은 성과평가를 잘 받기 위해, 핀테크 업체들은 사업 확대를 위해 달콤한 말로 우리를 투자의 길로 인도한다.
최근 심심찮게 볼 수 있는 사례는 사회초년생에게 '커피 값 한잔이면 은행보다 더 좋은 금리를 준다'거나 보험 상품을 마치 '적금 처럼' 팔아넘기는 일들이다.
관련기사
- 신한금융, 3분기 연속 당기순익 8천억 돌파2018.10.25
- 재출범 우리은행지주 차기회장 시나리오 셋2018.10.25
- "예대마진 가장 높은 은행은 기업은행"2018.10.25
- "작년보다 블록체인 관련 직업 채용 300% 증가"2018.10.25
'위험한 상품일수록 금리는 높다'는 이야기를 모르는 이가 적진 않다. 하지만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은지, 또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 아는 이들은 극소수다. 얼마전 KEB하나은행 역시 이 위험한 수준을 속여 팔아 국정감사에서 큰 질타를 받았다. 과거로 시계를 돌리면 서민들의 알토란 같은 돈을 허공에 날린 동양사태도 있다.
불완전판매는 없어야 한다. 위험성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사회초년생에게 재테크를 가르쳐준다는 말도 안되는 '훈수'는 사라지기를 기대한다. 이 세상에 잃어도 되는 돈, 버려도 되는 돈이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