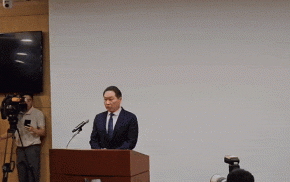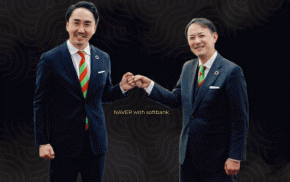세계 TV제조업계가 ‘스마트TV’ 열풍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 열풍에 방송콘텐츠 업계는 고요하다. 스마트TV가 성공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방송콘텐츠 확보를 꼽는 상황에서 왜 방송사들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일까.
최근 외신에 따르면 구글TV진영은 미국 ABC, NBC, CBS 등 대형 방송사업자측에 콘텐츠 제류를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방송사측은 구글TV의 수익배분 문제에 확신을 갖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콘텐츠 유출, 불법복제 등의 우려도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광고 시장의 주도권이 구글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방송사들을 복지부동하게 한 원인이었다.
국내의 상황도 이와 비슷하다. 제조업체가 방송사에 구애를 보내지만 화답은 없다. 뛰어들기에는 이르다는 신중론이 대부분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방송사(SO)측에 콘텐츠 제휴를 제안했다. 새로 출시될 스마트TV에 VOD 콘텐츠를 제공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방송사들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최종 타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듯한 모양새다.
방송사들은 향후 스마트TV가 대세를 이룰 것이란 제조업체의 장밋빛 전망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 제품가격이 비싼데다 조작방법이 어려워 시장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방송사는 VOD 서비스 시스템을 새롭게 구성해야 하는 부담을 갖는다. 서버와 네트워크 등에서 상당한 비용을 필요로 한다.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는 “VOD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운영, 네트워크 비용과 TV시장전망을 따져보면 방송사가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 너무 크다”라며 “일단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사용자가 많지 않은 상황과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가 맞물려 운영비용만 들어간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이미 시중에서 판매중인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고사양 TV는 인터넷 기능을 내장했다. 여기에 SBS와 KBS가 연간 사용료를 받고 콘텐츠를 제공했다. 이들은 현재 관련 매출이 거의 없어 고민에 빠져있다.
지상파 방송사 외에도 케이블TV를 향한 제조업체의 구애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과금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케이블TV진영도 진입을 꺼린다.
케이블TV는 다수의 채널(PP)을 방송플랫폼 사업자(SO)가 한 곳에 모아주는 형태로 제공하게 된다. 이같은 이유로 인해 제조업체도 PP보다는 SO측에 먼저 제휴를 제안했다.
SO측은 스마트TV의 과금체계를 확정해줘야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SO업계 관계자는 “스마트TV에서 케이블TV의 콘텐츠를 이용한다고 했을 때 그 수익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확신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PP채널마다 개별적으로 제공할 경우는 소비자 불편이 문제다. 케이블TV나 IPTV는 가입자 인증시스템(CAS)을 내장해 VOD 이용 시 로그인 절차가 줄어든다. 하지만 스마트TV는 로그인을 건별 이용마다 따로 거쳐야 한다.
케이블TV업계 관계자는 “VOD 한편을 볼 때마다 로그인을 따로 해야 하는데, 시청자가 리모컨으로 이를 얼마나 이용할 지 미지수”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제조업체들의 방송서비스 마인드 부족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방송서비스는 시청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형태로 콘텐츠를 가공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TV제조사들은 성능좋은 기계,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화려한 영상만 제공하면 성공할 것이란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다”라며 “VOD는 이미 IPTV, 케이블TV에서 이미 하고 있는데, 획기적인 변화없이 구태만 반복하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방송사와 제조업체가 실시간 방송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라며 “방송사의 초기 리스크를 제조업체가 분담하고 서비스 개발에 나서는 것이 상호간에 이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소니, '구글TV' 마침내 공개2010.09.02
- [한글자막]크기 줄이고 가격 내리고…신형 ‘애플TV’ 공개2010.09.02
- [한글자막]애플, ‘iOS’ 대대적인 업데이트 예고2010.09.02
- '99달러 애플TV' 현실화 됐다2010.09.02
TV가 너무 많은 기능을 끌어안는 시도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TV와 모바일 기기 간에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여러명이 함께 이용하는 가전인 TV를 개인화하는 시도가 필요하다”라며 “TV는 콘텐츠의 허브역할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이 콘텐츠 이용수단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