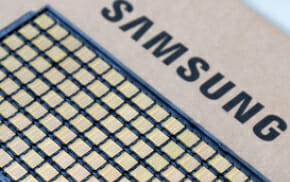1990년대 중반에나 통했던 PC 마니아들의 농담 중 하나가 '램(RAM)은 돈이요 금이다'라는 격언 아닌 격언이다. 메모리 값은 언제 사도 변함이 없으니 사 두었다가 시간이 지나 내다 팔면 원금을 건질 수 있다는 '안전자산'이라는 말이었다.
물론 개인 PC 메모리 용량이 GB(기가바이트)를 돌파한 요즘은 이런 농담이 통하지 않는다. 오래 된 메모리는 개인 소장품, 혹은 구형 PC를 손보려는 이들의 소모품 이외에는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

그런데 철지난 '메모리 재테크'를 21세기에 창의적으로 실현하려는 이들이 있다. 바로 일부 유통사다.
지난 1일 일본 정부가 대(對) 한국 첨단 소재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하자 며칠 되지 않아, 국내 시장에서 일반 소비자 대상으로 판매되는 DDR4 메모리 가격은 상승하기 시작했다. 용량에 따라 다르지만 적게는 몇 천원, 많게는 만 원 가까이 오른 제품도 적지 않다.
이들이 가격을 올리면서 소비자들에게 내미는 이유는 '메모리 수급 문제', '재고 부족' 등이다. 그러나 국내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확보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은 일찌감치 '감산은 없다'고 선을 그은 상황이다. '물량 부족'이라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소비자는 없다. 결국 궁색한 변명이다.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것이 장사의 기본, 나아가 시장 가격 형성의 공리(公理)라고 강변한다면 이를 부정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우려를 '닥쳐온 위기'로, 혹은 '공급난'으로 침소봉대해 추가 이득을 챙기는 행위는 과연 옳은가.
수출 규제에 편승해 메모리나 SSD 등 반도체 제품 가격을 올리면 당장의 이득은 얻을 수 있다. 국내 조립 PC 시장의 수요는 매달 15만 대를 넘나든다. 메모리 모듈 하나당 5천원만 더 챙겨도 7억 5천만원의 매출이 추가로 발생한다. 여기에 메모리를 하나만 꽂는 사람은 없으니 추가 이익은 더 늘어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는 결국 용산전자상가, 나아가 국내 유통 시장에 이미 불만이 쌓일 대로 쌓인 소비자들의 이탈을 가속시킬 것이다.
지금은 21세기다. 곳곳을 돌며 받은 명함에 가격을 적고 제일 싼 곳을 찾아가던 1990년대, 가격비교 사이트에 올라온 허위 매물때문에 헛걸음을 하던 2000년대 초반도 아니다. 아마존이나 이베이에서 터치 몇 번, 클릭 몇 번이면 바다를 건너 문 앞까지 메모리가 도착하는 '대 직구 시대'다.
게다가 메모리는 특수한 제품이다. 업계 표준화 단체인 JEDEC의 규정에 따라 규격화됐다. 아마존이나 이베이 등에서 구입한 미국산 제품이나, 국내에서 울며 겨자먹기로 웃돈을 주고 산 제품이나, 대만산 메인보드에 꽂으면 똑같이 작동한다. 가장 큰 걸림돌인 초기 불량도 적다.

소비자들은 더 이상 궁색한 변명에 동정하지 않는다. 신용카드 한도와 해외 온라인 쇼핑몰의 배송 기간, 관세/부가세 면제 금액을 저울질 할 뿐이다. 대형 유통업체들의 횡포를 근절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벌써 1만 3천명 이상이 동의했다.
관련기사
- 文대통령-여야5당 대표, 18일 오후4시 청와대 회동2019.07.17
- 日 수출규제, ‘다자외교+WTO 제소+상응조치’가 해법2019.07.17
- AMD 3세대 라이젠, 초반 흥행 '순항'2019.07.17
- 文 "수출규제, 日에 더 큰 피해…결코 성공 못해"2019.07.17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던가, 돌이켜 보면 지난 해 인텔 프로세서 수급난이 불거진 이후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작년에 이어 지금 이 시간에도 빈대 잡는 재미에 여념이 없는 일부 유통사 관계자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금 묻는다. 초가삼간은 언제까지 태우실 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