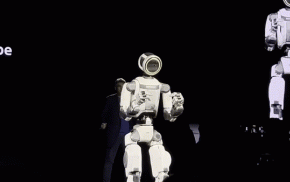"정말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돈 문제 아닙니까. 기술 격차가 어느 틈에 좁혀질 지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해요. 과거 반도체 산업을 통째로 한국에 내줬던 일본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될 것 같아 두렵기도 하고요."
국내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거금의 펀드를 조성한다는 보도를 전해 듣고선 이렇게 말했다.
'반도체 굴기(일으켜 세우다)'를 선언한 중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본격적으로 차이나머니를 쏟아붓기 시작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3천억 위안 규모의 반도체 펀드를 추가로 조성키로 했다.
4일(현지시간) 전후로 이 소식은 국내외 언론 보도를 통해 급속도로 퍼졌다. 국내 업계는 현재 반신반의(半信半疑)하고 있다. 앞으로 힘겨운 싸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중국이 메모리 호황을 이끌고 있는 한국과의 기술 격차를 단 번에 좁히진 못할 것이라는 희망도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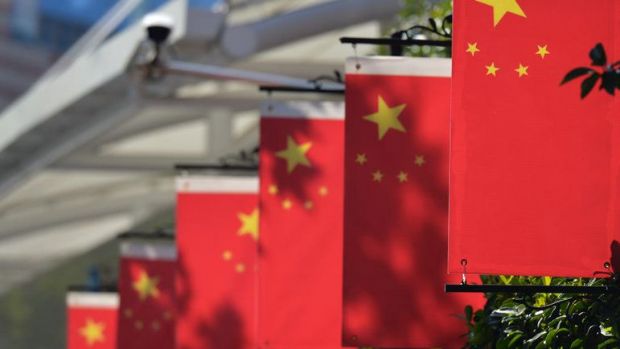
■ 51조원, 얼마나 큰 규모이길래?
중국 정부가 새롭게 조성하겠다고 밝힌 펀드는 그 규모가 우리 돈으로 51조원에 달한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인 삼성전자가 지난해 기록한 연간 영업이익 53조6천500억원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는 중국이 지난 2014년 꾸린 펀드의 투자금인 약 23조5천억원에 비해 2배 이상 큰 규모다. 4년 전에 설립된 1차 펀드의 투자는 지난해 말까지 이어졌다. 투자금은 약 70개 이상의 크고 작은 프로젝트에 투입됐다.
이번 펀드는 중국의 국유 펀드인 '국가 직접회로산업투자펀드'가 선봉에 서지만, 실질적인 집행 역할은 중국 정부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중국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75%로 끌어올리고, 반도체 수입액을 대폭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의 반도체 수입액은 연간 2천억 달러(약 215조3천억원)에 달한다.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 등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해 온 반도체를 직접 만들고 산업을 일으키겠다는 포부로 보인다"며 "미래의 국가 먹거리 사업으로 반도체 산업을 택하고 거액을 베팅한 것"이라고 말했다.

■ "반도체 펀드, 공급 부추기고 수출길 막을 것"
그렇다면 글로벌 D램 업계 1, 2위인 삼성과 SK의 투자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삼성전자는 지난 1분기 반도체 부문 시설투자에 7조2천억원을 투입했다. 그 마저도 전사 시설투자 비용인 8조6천억원의 80% 비중에 달한다. 업계 2위인 SK하이닉스는 최근 5천억원을 투자해 이천 반도체 후공정 라인을 증설키로 했다. 중국의 51조원 투자금과 비견될 바가 아니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업계는 이 상황에서 특히 두려운 것이 '정부 주도의 투자'라고 한목소리로 지적한다. 이번 펀드 역시 정부가 운영 가이드라인을 먼저 제시하면 국유펀드가 이를 이어받아 따르는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막대한 자금의 힘을 통해 인력과 설비 투자가 강화되면 반도체 제품 양산은 물론 자급력을 갖춰 국내 업체들의 수출길이 막힐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당장은 D램이 이끌고 있는 메모리 호황이 연말까지 지속될 전망이지만, 중국 업체들이 메모리 양산에 본격 뛰어들면 시장 논리에 따라 공급이 늘어 가격은 하락 수순을 밟게 된다.
최근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중국의 창장메모리(YMTC)와 푸젠진화(JHICC), 이노트론 등 3대 메모리 업체들이 올 하반기에 시험 양산에 돌입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대량 생산체제에 들어간다. 창장메모리는 낸드플래시에, 푸젠진화와 이노트론은 D램 분야에 주력 중이다.

■ "삼성·SK하이닉스, 눈 뜨고 코 베이지 않아"
그러나 일각에선 한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가 쉽사리 좁혀지진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힘겨운 싸움이 될 것이라는 데에 이견은 없지만, 그렇게 비관적인 상황까진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한국과 중국의 메모리반도체 기술 격차는 3년 가량으로 추산된다. 푸젠진화와 이노트론이 보유한 D램 공정기술은 20나노 후반~30나노 급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내 업계는 10나노 이하 단위의 미세공정 경쟁에 뛰어들었다. 삼성전자는 경기도 화성캠퍼스에 착공한 극자외선(EUV) 전용 공장에 7나노 LPP(Low Power Plus) 공정을 도입한다.
낸드플래시도 마찬가지다. 창장메모리가 올해 양산하겠다고 밝힌 낸드 제품은 32단 64기가바이트(GB) 수준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현재 64단, 78단 제품을 양산 중이고, 96단과 128단 양산을 목전에 두고 있다.
관련기사
- D램 계속 강세…삼성·SK, 속도 더 낸다2018.05.08
- 中, 51조 규모 '반도체 펀드' 조성2018.05.08
- D램 가격 3개월만에 또 상승…왜?2018.05.08
- D램담합의혹...삼성·SK하이닉스 영향 제한적2018.05.08
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이 기술과 설비 투자를 하는 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가만히만 있겠느냐"며 기술 격차가 실제로 많이 벌어져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시기를 잘 맞춰 투자를 단행하고 기술 유출을 최대한 막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스마트폰 등 먹거리 사업의 패러다임 변화 등을 잘 감지하고 차세대 메모리 개발 등에 박차를 가해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해법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