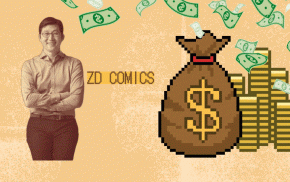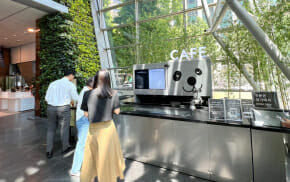‘뉴딜’ 정책. 1933년 당선된 美 F.D.루스벨트 대통령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했던 일련의 경제정책이다. 대공황을 벗어나기 위해 정부가 대중의 요구를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시장 개입 정책을 펴나갔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후 미국 경제는 회복, 침체를 반복하다가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전시 경제체제로 전환된다.
때문에 약 80년이 지난 현 시점에도 뉴딜 정책의 성과에 대한 경제전문가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자본주의 경제정책을 진화시키고 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뉴딜정책으로 인한 인플레, 그리고 다시 치솟은 실업률 등 폐해에 대한 지적도 만만치 않다.
최근 보편요금제 논의 과정을 보고 있으면 뉴딜정책과 오버랩 되는 측면이 있다.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한다는 부분에서,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그렇다.
보편요금제는 현 정부의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기존 3만원대 요금제를 2만원대에 쓰도록 만들어 통신비를 인하하겠다는 취지로 시작했다.

이통사들이 고가요금제에만 혜택을 집중시켜 상대적으로 저가요금제 이용자들이 통신비를 과부담하고 있어 이를 경감시켜주겠다는 것이다.
이후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놓은 초안은 월 2만원대에 음성통화 150~210분, 데이터 900MB~1.2GB를 제공한다는 것이며, 이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요금인가대상사업자인 SK텔레콤이 의무적으로 출시해야 한다.
보편요금제가 출시되면 가장 타격을 입는 곳은 알뜰폰 사업자다. 알뜰폰 역시 정부가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통해 통신비 인하를 꾀하겠다고 만든 정책이다. 하지만 소매요금을 직접 규제하는 보편요금제와 알뜰폰 정책은 양립하기 쉽지 않다.
또 보편요금제와 알뜰폰의 타깃층이 중저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알뜰폰 가입자의 이탈도 예상된다.
정부가 알뜰폰 사업자를 위해 특례 규정을 만들고 보편요금제를 재판매할 경우 도매대가를 더 낮춰주겠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들이 보편요금제를 쓰기 위해 알뜰폰 사업자를 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보편요금제는 알뜰폰 사업자뿐만 아니라 이동통신사도 정부가 민간의 상품에 인위적으로 개입해 요금제를 출시토록 하는 것은 경영권 침해에 해당되고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반발한다.
최근 한국은행이 공개한 소비자물가지수에서는 2015년을 100으로 기준을 삼았을 때 이동통신비는 0.66 하락했으나 휴대폰은 5.56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2014년 10월 단말기 유통법 실시 이후 통신비는 내려갔으나 휴대폰 가격은 올랐다는 것이다.
이통사들은 이 뿐만 아니라 지난해 9월부터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 어르신 요금 감면 등 저가요금제,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도 강화하고 있다며 보편요금제 도입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해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지적도, 심지어 전직 통신 관료들조차도 보편요금제에 대해서는 고개를 가로젓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보편요금제의 첫 단추를 잘 못 꿰면서 정부정책의 일관성도 훼손됐으며 통신비 인하의 방향성이 흐트러졌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 보편요금제 심사 초읽기...업계, 노심초사2018.04.27
- 보편요금제 규개위 심사 D-1...업계, 초긴장2018.04.27
- "보편요금제보다 제4이통과 완전자급제"2018.04.27
- 알뜰폰 생존 요구사항은…정부, 보편요금제만 눈길2018.04.27
오히려, 제4이통사의 역할로서 한계에 부딪힌 알뜰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프랑스의 프리모바일 사례처럼 경쟁정책을 더 발전, 진화시켰어야 했다는 것이다.
정부의 보편요금제안이 규제개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지만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도 이 같은 상황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탓이다. 보편요금제는 이래저래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계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