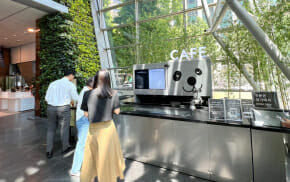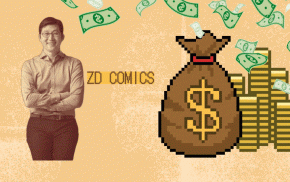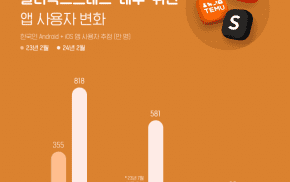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정의로움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심 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법률을 적용하는 공정함. 법에 대해 문외한이기는 하지만, 보통사람이 율사(律士)에 거는 기대는 아마도 이 두 가지가 가장 크지 않을까 한다. 그런데 조성진 LG전자 사장에 대한 검찰의 악착스러운 기소는 이런 보통사람의 상식적인 법 감정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너무 가혹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적잖다.
조 사장은 경쟁사인 삼성전자의 세탁기를 망가뜨렸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초 사건이 벌어졌고 작년 12월11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지난 10일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 사건은 초기에 전자 업계의 큰 관심을 끌었으나 삼성이 고소를 취하하고 두 번의 무죄 선고가 내려지면서 일단락되는 듯했다. 설마 대법원에 상고까지 할까 하는 생각이 컸다.그런데 검찰은 달랐다.

15일 상고를 선택했다. 검찰의 이번 선택은 ‘정의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다소 철학적인 고민을 하게 만든다. 이번 일은 일반인의 법 감정에 비춰볼 때에도 철저하게 수사하고 처벌하는 게 옳아 보였던 여러 대기업 부정 비리 사건과 많이 다르다. 세계 가전 업계 1, 2위가 다퉈 여론의 관심을 끌었지만, 사건 자체만 따질 때는, 불의(不義)와 정의(正義)을 논할 소재로 마땅찮아 보이는 탓이다.
이 사건 쟁점은 세 가지다. 조 사장의 행위와 세탁기 손괴의 인과 관계, 손괴의 고의성,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업무 방해. 1심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시된 증거만으로 세탁기 손괴가 피고인 때문에 발생했다는 사실과 손괴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여러 증거조사를 살펴보면 1심의 무죄 판단이 옳다"고 역시 무죄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은 단순한 의견표명이나 가치판단이 아닌 객관적으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적극적인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명예훼손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고 삼성이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까지 한 사안이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10개월을 구형하면서 그 이유로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공정한 질서를 교란한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시장에 잘못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시장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 처벌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상고까지 한 걸로 봐 조 사장의 행위가 불의한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 보인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것보다 법 적용의 적합성 여부를 본다. 1심과 항소심만 본다면 사실관계 입증 측면에서 LG를 응징하려는 검찰이 유리할 게 없어 보인다. 따라서 법 적용의 적합성이나 정의의 문제가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검찰이 교란을 막고자 하는 시장의 여러 주체들(삼성을 포함한 기업 및 소비자 등)이 과연 검찰의 정의로움에 동의할지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다.
파손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만만치 않은 ‘세탁기 문 세게 여닫기 행위’를 놓고 대한민국 최고 법 기관이 나서 따져야 할 정의란 대체 무엇일까. 불량할 수도 있는 마음까지 찾아 처벌해야 한다는 뜻일까. 설사 손괴의 고의성을 입증한다 해도 이미 피해자와 합의가 끝난 사안을 놓고 이렇게까지 모질게 하는 걸 보면 처벌코자 하는 대상은 행위와 그 결과가 아니라 마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관련기사
- 삼성-LG 세탁기 사건 대법원 간다2016.06.17
- '세탁기 파손혐의' LG전자 사장 항소심도 무죄2016.06.17
- 檢, 조성진 LG사장 무죄 판결에 '항소'2016.06.17
- 조성진 LG사장, 모두 무죄…"法 현명한 판단에 감사"2016.06.17
일반인의 법 감정으로 볼 때 조 사장은 파손의 인과관계나 고의성의 사실 여부를 떠나 어설픈(?) 행위 탓으로 이미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한 해 수십조 원의 수출을 책임지고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세탁기를 만드는 기업가의 체면을 이미 톡톡히 구긴데다, 수사와 재판 때문에 사업장인 경남 창원과 서울을 무려 15번이나 오갈 만큼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게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1심과 항소심의 판결이 옳은 것으로 나올 경우 조 사장이 어설픈 행위에 대해 과도하게 대가를 치른 셈이 되는데 그건 누가 보상하는 걸까. 그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넘어가도 되는 일일까. 삼성의 고소 취하는 그래서 이 복잡한 걸 고려한 법보다 상위의 사회적 합의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검찰은 누구를 위해 어떤 정의를 실현하려는 건지 다시 생각해봐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