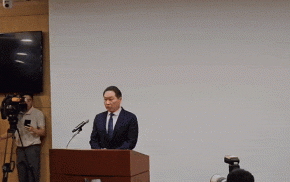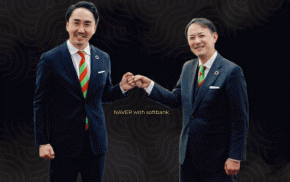2014 브라질 월드컵이 13일 새벽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첫 경기는 개최국인 브라질이 역전승을 거두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울상을 짓는 곳이 있습니다. 치킨 판매점입니다. 한국의 예선 경기가 오전 7시‧4시‧5시에 열리는 탓에 ‘치킨에 맥주 마시며 한국경기 볼 일’이 없어졌습니다. 월드컵 특수를 기대했던 치킨집이 울상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울상을 짓는 곳이 또 있습니다. 케이블업계입니다. 지상파가 “월드컵 중계권료를 내라”고 압박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케이블사업자는 가입자들이 케이블TV에서 지상파방송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KBS2, MBS, SBS에 가입자당 280원을 지불합니다. 이는 같은 유료방송인 IPTV나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상파3사가 얻는 수익이 연간 약 1천700억원입니다. 케이블‧IPTV‧위성방송의 가입가구가 1천750만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케이블을 포함한 유료방송업계에서 “이미 채널당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월드컵이라고 왜 돈을 또 내라는 것이냐”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지상파-케이블 간 월드컵 중계권을 놓고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이유입니다.
지상파는 케이블이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 중계방송의 재송신 대가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 한다’고 해놓고 ‘약자 코스프레’를 하며 돈을 내고 있지 않다며 압박합니다. 반면, 케이블은 계약서에 단서조항으로 ‘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 중계방송 재송신 등에 대해 별도로 협의한다’고 되어있을 뿐이며 “지상파가 월드컵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다”고 비난합니다.
누구 말이 사실일까요? 시비를 가리지 않아도 분명한 것은 ‘국민의 시청료 부담’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나라 국민들은 연간 약 6천700억원을 수신료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TV만 있다면 전기세를 납부할 때 무조건 함께 내야 합니다. 여기에 ‘보편적 시청권’에 해당하는 지상파방송을 보기 위해 유료방송에 간접적으로 시청료를 또 냅니다. 유료방송사가 채널당 280원을 지불하는데 이는 당연히 유료방송요금에 포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상파의 VOD를 볼 때도 돈을 내야 합니다. 지상파는 수익을 올리기 위해 VOD 이용료를 500원에서 1천원으로, 홀드백 시간도 1주일에서 한 달로 늘려놨습니다. 여기에 월드컵 중계권료를 유료방송업계가 별도로 지불한다면 결과적으로 이 돈도 시청자가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4년 전 남아공 월드컵을 앞두고 KBS‧MBC가 SBS를 상대로 소송제기를 하던 당시 KBS 담당팀장의 인터뷰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상파-케이블 간의 상황이 그 때와 판박이이기 때문입니다.
“중계권료가 올라가면 방송사가 그 손실분을 보전하기 위해 광고비를 올릴 것이고, 광고비가 올라가면 기업이 그 비용을 제품에 전가할 것이다. 결국은 소비자가 돈을 내는 것이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계약서’에 대한 부분도 지상파보다는 케이블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60조의3 금지행위에는 ‘중계방송권자로서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올림픽이나 월드컵의 경우에는 국민 전체가구 수의 100분의 90 이상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하도록 명문화 돼 있습니다. 즉, 중계방송권자인 지상파가 국민 전체가구 수의 90%를 확보하기 위해 ‘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 중계방송 재송신 등에 대해 별도로 협의한다’고 했을 가능성입니다.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케이블‧IPTV‧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에 의존하지 않고 지상파TV만 이용하는 가구는 전체 가구 중 약 6.8%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지상파가 방송법의 금지행위 위반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유료방송사들이 월드컵을 중계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한 단서조항으로 보입니다.
또, 지상파3사를 대변해 방송협회가 발표한 성명서에서도 그 이유를 유추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성명서에는 “지상파방송사는 중계권료 상승이 이미 지상파방송사만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매년 수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케이블SO도 국민관심행사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의 보장을 위해 역할을 분담하자고 요청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 월드컵 개막하니 뜨는 가전 "이런 것도?"2014.06.13
- 모바일 IPTV선 왜 월드컵 축구 못 보나2014.06.13
- 월드컵 개막, 축구 게임 꽃필까2014.06.13
- 월드컵 개막…관련 웹사이트 DDoS '몸살'2014.06.13
즉, ‘중계권은 우리가 사왔지만 고통분담 차원에서 너희도 돈을 내라’는 것입니다. 보편적 시청권을 언급할 때의 지상파의 위상은 공공성‧공익성으로 대표되지만 돈 앞에서는 상업성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공공성‧공익성 보호를 위해 통신사들과 달리 지상파가 정부로부터 국민의 자산이자 공공재인 주파수를 무료로 제공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지상파의 보편적 시청권을 앞세운 횡포에 결국 그 피해자는 시청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씁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