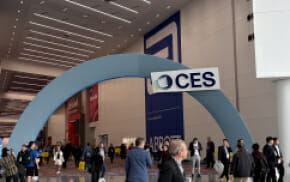인류가 특허를 법으로 보호하는 까닭은 기술 개발을 장려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왜 기술 개발은 장려돼야 하는 걸까. 두 말 할 것도 없이 기술의 발전이 인류의 행복에 도움을 줄 거라는 믿음 때문이다. 그게 곧 문명이다.
문제는 매사가 그렇듯 인간 욕심이 끝이 없다는 데 있다. 인간 전체를 위해 개발하거나 발견한 공로를 인정해 인류 사회가 특권을 부여하는데 그 권리자는 그걸 한도 끝도 없이 영생하는 권리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이는 자못 심각한 문제다. 취지와는 달리 문명이 인간을 이롭게 하지 못하는 결과로 나온다.
대표적인 게 이른바 ‘특허괴물(patent troll)’이다. 처음에는 인류에게 엄청난 선물을 가져온 주체들이 나중엔 뿔 없는 도깨비가 되는 것이다. 잘난 부모 밑에 태어난 덕에 평생을 놀고먹으며 제 부모를 욕보이는 망나니 자식이나 타인의 공(功)을 돈 주고 산 뒤 그 몇 배의 이득을 취하려는 장사치가 그런 괴물들이다.
오직 제 뱃속을 채우려고 할 뿐 인간과 세상을 고민할 생각은 애초부터 없는 자다. 괴물이라 불러 미안할 게 전혀 없는 족속이다.
언제부턴가 이들의 칼날이 시퍼렇게 춤추는 세상이 됐다. 소송이 남발된다. 한때 그리고 지금도 사회가 그 권리를 보장했기에 거리낄 이유도 없다. 비슷한 것은 일단 걸고 넘어간다. 그 망나니들이 날뛸수록 인류 전체에게 돌아갈 문명의 혜택은 점차 미루어질 수밖에 없다. 혁신가는 어느새 반동(反動)이 되어 있다.

인류가 이 불편한 현실을 모를 리 없다. 그래서 만든 게 프랜드 조항이다. 영어에서 나온 말이다. FRAND라고 쓰는데, Fair와 Reasonable 그리고(And) Non-Discriminatory의 앞 대문자를 줄여 만든 조어다. 기술을 발명하더라도 인류 전체를 위해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면 공정한 조건으로, 누구도 차별하지 말고 제공하게 하자는 인류 사회 약속이다. 공개하지 않으면 문명 발전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 기술을 피해서 그와 같은 문명 제품을 만들 수 없을 때 프랜드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다.
영어 단어 친구(friend)와 비슷한 발음일 만큼 인류애적인 조항이다.
특허에 대해 더 심한 주장을 펴는 사람도 많다. 카피레프트(copyleft)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렇다. 카피레프트는 지적재산권을 의미하는 카피라이트(copyright)의 반대말이다. 그 창시자는 미국의 리처드 스톨먼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류의 지적 자산은 소수에게 독점되면 안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이 생각은 창조주가 아닌 한 어떤 발명과 발견도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다는 판단에 따른다.
인류가 창안한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 이미 예전에 있었거나 지금 어디엔가 있는 것을 베끼면서 거기에 뭔가를 조금 더 부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그러니 누구도 그걸 처음이나 원조라고 주장할 수 없고 모든 건 수 만 년 인류 역사를 통해 우연히 얻는 것일 뿐이다. 창조는 공유해야 마땅한 것이다.
이 주장이 극단에 치우쳐 있다 해도 그 가치는 손상되지 않는다. 그 논리는 진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도 발견하고 주운 사람한테 권리가 인정되듯 어느 정도 부가가치를 추가했다면 그로 인한 공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다수는 동의한다. 그것까지 부인할 순 없다.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할 건 그래서 ‘그 공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가’라고 묻는 것이다.
세기의 특허전쟁을 도발한 애플 사례를 들어보자. 스티브 잡스가 세계적인 혁신가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 공은 그와 함께 그가 창업하고 최고경영자로(CEO)로 삶을 마감한 조직인 애플과 같이 나눠야 할 몫이다. 문제는 언제부턴가 도가 지나치다는 사실이다. 언제까지 그 공로가 인정돼야 하는가. 혁신의 대가가 어느 날 갑자기 괴물로 변해 문명의 확산을 반대하는 것까지 인정해야 하는가.
인류는 밤 새워 개발한 필수 표준 특허마저도 더 많은 인류에게 필요하다면 프랜드 조항으로 묶어 권리를 제한한 지 오래다. 그런데 필수 표준 특허가 아닌 상용 특허(대표적인 게 디자인)는 그걸 개발하는 데 훨씬 더 적은 노력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프랜드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특허를 피해 만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면이 디스플레이로 꽉 찬 스마트폰 이외의 스마트폰을 과연 상상이나 할 수 있는가. 없다면, 기술 특허가 아니지만 이 또한 프랜드 조항이어야 마땅한 일이다.
생각해보라. 오죽하면 ‘애플 세(稅.택스)’라는 말까지 나올까. 모든 스마트폰 제조회사가 전면이 디스플레이로 꽉 찬 스마트폰을 만들 때 소비자에게 조금 더 돈을 받아 애플에 그것을 넘겨줘야하는 게 마땅한가. 과연 그것이 디자이너 몇 명의 아이디어와 기술과 인문학을 동시에 고민했다는 천제적인 CEO에 대한 영원한 보답이어야 하는가. 지난 5년간 매년 50조원 이상씩 수백조원을 몰아준 것으로도 그 보답이 모자란단 말인가.
관련기사
- 美법원 특허설명 동영상 편향성 논란2014.03.31
- 삼성전자, 日서 애플과 특허소송 1심 패소2014.03.31
- 삼성-구글-시스코, '3각 특허 동맹' 결성2014.03.31
- 삼성·구글 특허동맹…소송꾼 애플에 직격탄2014.03.31
그만큼이면 충분하고 그들은 만족할 때도 된 것 아닌가.
인류를 위해 애플 디자인 특허는 소멸돼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