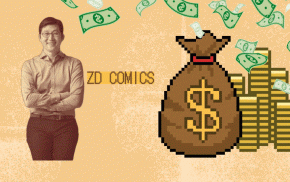갑오년(甲午年) 청마(靑馬)의 해인 올해는 대한민국에 이동통신 서비스가 선보인 지 꼭 30년이 되는 해다. 지난 1984년 5월에 개통된 카폰이 그 시초다. 당시 카폰은 포니 승용차 가격보다 비싸 특수 계층만 사용하던 귀족폰이었다. 이후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지속적으로 발전해 지금은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부럽지 않은 환경이다. 이동통신은 내부적으로 국민의 생활과 기업의 문화를 혁신케 한 일등공신의 역할을 해왔으며 외부적으로는 우리나라 최대 수출 산업으로 올라선 스마트폰의 젖줄이 되었다. 지디넷코리아는 국내 모바일 혁명의 역사를 6회에 걸쳐 되돌아보는 시리즈를 마련했다.[편집자주]
------------------------------------------------
*글 싣는 순서
1) 생각나시나요?…차보다 비쌌던 30년전 그 폰
2) 응답하라 1997…삐삐·시티폰, 그 아련한 추억
3) 보조금이 태어났다…격동의 이통 5社 시절
4) 아이폰 전에 꿈꿨다…손안의 멀티미디어 3G
5) 어느날 아이폰이 왔다…4년만에 시효 끝?
6) 호모 모빌리쿠스 시대…스마트폰이 곧 당신!
------------------------------------------------
올해 1월 9일(한국시간으로 1월 10일)로 애플 아이폰이 세상에 등장한 지 7년째를 맞는다. 애플 창업주 고(故) 스티브 잡스는 2007년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모스콘웨스트에서 ‘맥월드 컨퍼런스’를 열어 처음으로 아이폰을 소개했다.
이후 일어난 혁명에 대해 더 이상 말해 무엇 하겠는가. 아이폰이 일부 마니아들만의 기기가 될 것이라고 비웃던 자칭 전문가들은 몇 달 만에 얼굴을 못 들게 됐다. 세계 휴대폰 산업은 아이폰 출시 전후로 나뉜다고 해도 과하지 않다.
기존 휴대폰 회사들의 운명도 아이폰을 기점으로 확 달라졌다. 스마트폰 시대에 적응한 승자와 도태된 패자가 극명히 나뉘었다.

■ 2010년 국산 스마트폰의 대반격, 새 역사 첫장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한국 주자들, 즉 삼성전자-LG전자-팬택은 상당히 잘했다.
블랙베리와 노키아가 무너지는 동안 이들은 시장에서 의미 있는 지분을 챙겼다. 삼성전자는 근래 점유율 기준으로 애플을 누른 세계 1위다.
시작은 불안했다. 자체 운영체제(OS)가 없던 삼성전자는 마이크로소프트(MS) 윈도 모바일 OS를 받아 2008년 ‘옴니아’, 2009년 ‘옴니아2’를 잇달아 내놨다. 지금까지도 삼성전자 휴대폰 사업의 오점으로 불리는 문제작들이다.
윈도모바일이 애플 OS에 비해 기술 수준이 낮았고,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하드웨어도 기대 이하였다. 통신사들이 이 제품을 ‘아이폰 대항마’라고 내세우자 과대 마케팅이라는 고객 항의가 빗발쳤다.
당시 무선사업부장(사장)이었던 신종균 삼성전자 IM(IT·모바일) 사장은 지난 2011년 간담회에서 옴니아를 두고 “그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등 최고의 성능으로 내놨지만 산업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 상대적으로 구형 모델이 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LG전자와 팬택은 2009년까지 스마트폰을 아예 내놓지 못했다. LG전자가 2009년 말이 돼서야 부사장급이 이끄는 스마트폰 전담 사업부를 만든 것은 회사 규모에 비해 너무 늦은 대응이었다.

한국산 휴대폰 반격의 해는 2010년이었다. 3월 삼성전자가 갤럭시S를 처음 공개, 본격적인 아이폰 추격에 나섰다.
갤럭시는 구글이 애플 견제를 위해 만든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했다. 윈도모바일과 달리 당시 애플과 겨뤄볼 만한 전력으로 평가받았고, 실제 흥행도 일으켰다.
삼성전자가 만든 하드웨어도 4인치 슈퍼AMOLED 디스플레이, 1GHz 프로세서 등 업계 최고 수준을 자랑했다. 안드로이드 지원을 받아 삼성전자의 특기가 살아난 것이다.
갤럭시S를 글로벌 시장에 출시한 2010년 3분기 삼성전자 스마트폰 판매량은 780만대로 전 분기 310만대 대비 155% 급증했다. 대만 HTC를 밀어낸 것도 이 때부터다.
그해 LG전자는 ‘옵티머스Q’, 팬택은 ‘시리우스’, ‘베가’ 등을 내세워 시장에 뛰어들었다. 고전했지만 블랙베리나 노키아보다 강한 생존력을 키웠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
■ 삼성폰 1위로, LG-팬택도 단단해져
2011년 3분기에 결국 일이 터졌다. 일반 휴대폰을 빼고 순수 스마트폰으로 범위를 좁혀도 삼성전자가 애플보다 많은 분기 판매량을 기록한 것이다.
정확한 당시 분기 스마트폰 판매량은 삼성전자 2천800만대, 애플은 1천707만대였다. 애플이 삼성전자 대비 1천만대 이상 못 팔았다.
갤럭시S2가 출시 5개월 만에 1천만대 고지를 넘었고, 삼성-애플 양강의 합친 점유율 60% 시대가 열렸다. 삼성전자를 향한 애플의 소송 공격도 시작됐다.
스마트폰 중심의 삼성전자 IM사업부는 올 3분기만 봐도 영업이익이 6조7천억원에 달한다. 회사 전체 영업이익에서 무려 66%를 차지한다. 1분기에는 이 비중이 75%였다.
LG전자는 그룹 오너 일가인 구본준 부회장이 2010년 3월부터 대표이사를 직접 맡았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제 자리를 찾자는 이른바 ‘독한 LG’ 슬로건을 걸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분기 처음으로 스마트폰 분기 판매량 1천만대를 돌파했다. 수익성 부족 문제가 무겁지만 기술력은 세계 선두 급이라는 평가다. LG디스플레이와 LG이노텍 등 LG 계열사들이 스마트폰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함께 사력을 다해 온 결과다.
LG전자는 근래 삼성전자와 애플에 이어 3위 자리를 놓고 중국 업체들과 경쟁이 치열하다. 소니와 HTC 등은 누른지 오래다.
팬택 역시 LG전자처럼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으나 글로벌 대기업들을 상대로 자금 동원, 마케팅 등이 힘겹다. 지난해 9월 박병엽 창업주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뒤 회사는 국내 영업 올인 전략에 들어갔다.

지난 2년 동안 지문 인식 기능 스마트폰을 애플보다 먼저 내놓는 등 공룡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일들을 종종 일으켰다.
한 때 시장을 재패했던 블랙베리-노키아 등과 비교하면 팬택의 잠재력은 더 높이 평가 받는다.
이준우 팬택 대표는 “22년간 닦아온 기술력, 품질, 상품력에 고객의 소리를 집대성한 팬택만의 제품으로서 진실되게 다가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 업계는 스마트폰 이후 카드에 눈을 돌리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착용형(웨어러블) 기기와 플렉시블(휘는) 디스플레이 개발에 막대한 전력을 배치했고, 팬택도 현재의 위기를 돌파하면 생각해 볼 부분이다.
스마트폰 시장 성장률이 둔화되는 추세여서 이 같은 전략은 더 중요해졌다.
관련기사
- 아이폰 전에 꿈꿨다…손안의 멀티미디어 '3G'2014.01.09
- 보조금이 태어났다…격동의 이통 5社 시절2014.01.09
- 응답하라 1997…삐삐·시티폰, 그 아련한 추억2014.01.09
- 생각나시나요? 차보다 비쌌던 30년전 그 폰2014.01.09
스마트폰 코리아는 롤러코스터 꼭대기에서 내려올 일만 남았다는 지적들이 무겁다. 그러나 길은 있다. 삼성전자가 세계 시장에서 애플을 제친 건 우연이 아니다. 삼성의 내재적인 강점이 특별한 것이고 거기에다 애플까지 알게 됐으니 꼭대기에서 내려올 일만 남은 건 아니다.
휴대폰 업계 한 전문가는 “시장을 제패한 삼성전자도 스마트폰 이후 어떤 무기를 내세워야 할지 고민이 크다”며 “아이폰 등장 이후 보여줬던 집중력을 배가시켜야 할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강점을 지키고 약점을 보완하면 못 할 것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