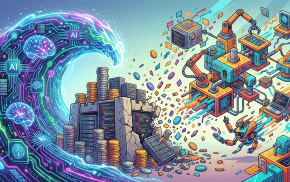갑오년(甲午年) 청마(靑馬)의 해인 올해는 대한민국에 이동통신 서비스가 선보인 지 꼭 30년이 되는 해다. 지난 1984년 5월에 개통된 카폰이 그 시초다. 당시 카폰은 포니 승용차 가격보다 비싸 특수 계층만 사용하던 귀족폰이었다. 이후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지속적으로 발전해 지금은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부럽지 않은 환경이다. 이동통신은 내부적으로 국민의 생활과 기업의 문화를 혁신케 한 일등공신의 역할을 해왔으며 외부적으로는 우리나라 최대 수출 산업으로 올라선 스마트폰의 젖줄이 되었다. 지디넷코리아는 이에 맞춰 국내 모바일 혁명의 역사를 6회에 걸쳐 되돌아보는 시리즈를 마련했다.[편집자주]
----------------------------------------------------
*글 싣는 순서
1) 생각나시나요?…차보다 비쌌던 30년전 그 폰
2) 응답하라 1997…삐삐·시티폰, 그 아련한 추억
3) 보조금이 태어났다…격동의 이통 5社 시절
4) 아이폰 전에 꿈꿨다…손안의 멀티미디어 3G
5) 어느날 아이폰이 왔다…4년만에 시효 끝?
6) 호모 모빌리쿠스 시대…스마트폰이 곧 당신!
----------------------------------------------------
현재 우리나라 이동전화 가입자는 5천440만여명으로 전체 인구 5천만여명을 넘어섰다. 스마트폰 보급률은 68% 수준으로 우리 국민들은 최신 단말기 수요에도 민감하다.
이런 성향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모바일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힘을 실어줬다. 또 전 산업 분야에 걸쳐 모바일 혁명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제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통해 뉴스와 책, 게임을 접한다. 이동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스마트 오피스가 보편화됐으며, 자동차-제조-서비스-농업 등 산업 분야에서는 이를 응용한 첨단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이동통신 단말기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나오면서 신생 벤처들이 새로운 기회를 잡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쓰고 있는 이동통신 서비스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그 시초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84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전기통신공사(현 KT)의 위탁회사인 한국이동통신서비스주식회사가 AMPS(Advanced Mobile Phone System) 방식으로 ‘차량전화(카폰)’ 서비스를 시작하면서다. 한국이동통신서비스주식회사는 현재 SK텔레콤의 전신이다.
결과적으로 SK텔레콤의 연혁이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한국이동통신서비스는 1984년 3월 29일 구의동 광장전화국에 사무실 한 칸을 마련하고 납입자본금 2억5천만원, 32명의 직원으로 출발했다. 이 회사가 카폰 서비스를 시작할 때만 해도 첫 해 가입자는 2천658명, 매출액은 3억9천만원에 불과했다. 현재 SK텔레콤 가입자수는 2천700만명을 훌쩍 넘겼고, 매출액은 2012년 기준 16조3천5억원의 초대형 통신사로 성장했다.
지금이야 전국민 1인 1폰 시대를 맞이했지만, 1984년 5월 첫 출시된 카폰은 ‘귀족폰’이라고 불릴 정도로 부의 상징이었다. 카폰(Car Phone)은 말 그대로 차량에 장착해 이동 중에 통화를 할 수 있는 ‘장비’로 우리나라 무선통신 시대의 서막을 열었다.

■ 400만원 카폰...포니2 승용차 보다 비싼 귀족폰
카폰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설비비 88만5천원, 채권 20만원, 그리고 허가신청료, 장치비, 무선국 준공검사료 등을 포함하면 초기 가입비만 총 116만8천원을 지불해야 했다. 여기에 단말기 가격은 300만원 수준으로 카폰을 쓰기 위해서는 400만원 가량이 필요했다.
당시 평범한 직장인의 월급은 30~40만원 수준이었고, 1982년 출시된 포니2 승용차 1대 가격은 347만원이었다. 카폰 1대가 자동차 값 보다 비쌌으니 지금으로선 상상하기도 힘든 시절이었다.
카폰은 대기업 최고위급 임원이나 국회의원 등 고위직들이 주로 사용했고 고급승용차에 장착됐다(1986년 출시된 국산 고급 세단의 대명사 그랜저 1세대 가격은 1천690만원이었다). 또 80년대 서울지역 국민주택규모의 집값은 평당 100만원 내외로 30평 아파트 한 채가 3천만원 정도였다.
당연히 일반인의 경우 카폰 구입을 상상할 수도 없었다.
요즘 재벌이 나오는 드라마처럼, 80년대 드라마에는 종종 귀족폰이 소품으로 활용되곤 했다. 과시용으로 자동차 외부에 가짜 카폰용 안테나를 달고 다니는 웃지못할 일도 빈번했다. 카폰은 없지만 안테나만 달아 놓고 고위층이나 갑부인 척 행세하던 사람들이 왕왕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폰 출시 첫해 가입자수는 2천658명에 달했다.
지금 상황과 비교해 보면 미미한 숫자지만 서울, 안양, 수원, 성남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만 제공했던 서비스라는 점과 자동차 값 보다 비싼 단말기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미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어느 정도 인지 예견해 볼 수 있던 중요한 지표였다.

■ 88년 휴대폰 보급, 이동통신사에 한 획 긋다
일반인을 겨냥한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실질적인 개화 시점은 카폰 출시 이후로부터 만 4년 후인 1988년 5월부터다. 이 때부터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이 공중전기통신 사업자로서 본격적인 이동통신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88 서울올림픽대회를 지원할 목적으로 같은 해 7월 1일 이동전화(휴대폰)가 처음 도입되면서 우리나라 이동통신사에 커다란 한 획을 긋는다.
수도권에 몰려 있던 서비스 지역은 점차 지방으로 확산돼 1991년 말에는 전국망 서비스가 이뤄졌다. 1993년 말에는 전국 74개 시 전역 및 읍 단위까지 이동통신 서비스가 제공됐고, 주요 고속도로와 그 인접 지역까지도 서비스 커버리지에 포함됐다.
1988년 첫 상용 휴대폰이 보급되면서 휴대폰 보편화가 시작됐다.
가입자수는 1991년 4월 12일에 10만 가입자를 돌파한 데 이어, 1995년 1월 16일에 100만명, PCS 사업자가 합류한 이후 1998년 5월 21일에 500만명, 1999년 12월 24일 1천만명을 넘었다. 그리고 2013년말 기준으로 5천450만여명을 기록했다.
이는 국내 총인구수를 넘어선 것으로 ‘전국민이 사용하는 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했다.

1984년부터 1996년 디지털 이동통신 시스템이 적용되기 전까지를 1세대 이동통신이라고 한다.
1세대는 음성통화 서비스만 가능했던 아날로그 방식의 서비스다. 지금이야 휴대폰(스마트폰)으로 문자, 이메일, 영상통화, 게임, 검색 등 각종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88올림픽이 열렸던 그 당시만 해도 들고다니는 전화인 휴대폰의 등장은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카폰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비쌌지만(휴대폰 가격은 240만원 수준) 성공의 상징으로 인식돼 서서히 이용자 수가 늘어났다.

일례로 1994년 박중훈 주연의 영화 ‘게임의 법칙’에서는 백수건달이었던 주인공이 조직의 중간보스가 된 후 길거리에서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나 걸으면서 전화하는 거야”라는 말로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는 장면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값 비싼 휴대폰 대신 삐삐, 시티폰 인기 끌기도
휴대폰만이 이동통신 서비스의 전부는 아니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 이동통신의 태동은 무선호출 서비스라고도 할 수 있다. 1981년 체신부가 수립한 ‘무선호출 서비스 기본 계획’에 따라 일본 NEC사의 시스템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신호음 방식의 무선호출 서비스가 개시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1982년 12월 15일 일명 ‘삐삐’라고 불리는 무선호출기가 등장했다.
무선호출 음을 딴 별칭인 '삐삐'는 단말기 가격과 통신요금이 저렴해서 90년대 중반까지 큰 인기를 끌었다. 지금의 스마트폰 열풍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전 연령층에서 폭넓게 사용됐다.
처음에는 수도권 지역 위주로 서비스됐지만 1986년 3월 부산 지역으로, 10월에는 대구, 대전, 광주 지역으로 서비스 지역을 넓혀갔다. 1984년 3월 1만명에 불과했던 삐삐 가입자는 도입 10년 만인 1992년 4월 21일에는 가입자 100만명, 1993년 7월 19일에 200만명, 1995년 11월 6일에 500만명을 넘는 등 폭발적인 상승세를 기록했다.
삐삐는 012, 015 등의 사업자 식별번호로 시작하는 번호에 전화를 걸어 일반호출과 음성녹음을 남기는 서비스다. 삐삐 단말기를 보고 호출된 번호로 전화를 걸어 “호출하신 분이요”라고 상대방을 찾으면 된다. 단순 번호 호출 기능이었기에 ‘8282’(빨리) ‘1004’(천사) ‘38317’(사랑, 거꾸로 보면 독일어로 사랑을 뜻하는 LIEBE와 유사하다) 등의 암호가 등장하기도 했다. 수도권 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단말기에 번호를 지정해 지역을 수정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었다.
삐삐가 유행하던 시절 90년대 초반 강남역 인근 커피숍에는 삐삐 세대들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테이블마다 전화기를 설치하는 대신, 당시 커피 한 잔에 5천원이라는 거금을 받았다.

삐삐 수요가 늘면서 1997년에는 ‘시티폰’이라는 발신전용 휴대폰이 등장했다.
삐삐를 받고 부랴부랴 전화기를 찾아 뛰어다니거나 공중전화에 긴 줄을 서는 일이 흔했기에, 삐삐를 받고 바로 전화를 걸 수 있는 시티폰은 반짝 인기를 끌었다.
관련기사
- 삐삐 번호 012 부활, 내년부터 사물통신용2014.01.06
- 한국ICT 경쟁력 4년 연속 세계 1위2014.01.06
- 삐삐부터 스마트폰까지...사랑은 IT를 타고2014.01.06
- 이동통신 역사 20년…카폰서「손안의 TV로」2014.01.06
다만 시티폰은 통화품질이 좋지 않은데다 공중전화망을 이용했기에 전화를 걸기 위해서는 공중전화기 옆 100미터를 벗어나면 안됐다. 다행히 통화요금은 기존 휴대폰의 절반 정도로 공중전화 요금 수준이었지만 삐삐와 함께 구입해 한다는 점, 통화품질이 최악이라는 점, 진정한 이동통신이 아니라는 점 등 많은 단점이 있었다. 나중에는 삐삐 기능이 내장된 시티폰이 나오긴 했지만, 같은 해 10월 PCS 사업자의 본격 등장으로 휴대폰 대중화의 길이 열리면서 경쟁력을 잃고 시장에서 퇴출됐다.
(2편에서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