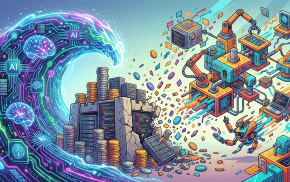“싸면 좋은 것 아닌가요?”
기자가 최근 받은 메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문의다. 이동통신사가 보조금을 지급해 휴대폰을 싸게 판다는데 왜 정부가 규제를 하느냐는 아주 당연한 의문이다.
탁 까놓고 얘기해보자. 맞다. 소비자는 싸면 쌀수록 좋다. 99만원짜리 LTE 스마트폰을 10만원에 판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다. 소비자 입장에서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 차이가 거의 없어진 상황에서 가격이 우선 고려요소라는 점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문제는 이것이 그냥 싼 것은 아니라는데 있다. 예컨대 내가 10만원에 갤럭시S3를 샀다면 또 다른 누군가는 99만원을 주고 산다. 이 누군가는 우리 부모님, 친구, 지인일 수 있다. 바로 어제 수십만원을 주고 산 휴대폰 가격이 하루 만에 폭락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내가 낸 비싼 통신비도 마케팅비라는 명목으로 보조금으로 둔갑한다. 보조금 재원은 이용자 전체가 낸 통신비로 형성되나, 정작 혜택은 휴대폰을 자주 바꾸는 사람에게로 집중된다. 결국 일부 저렴한 휴대폰에 대한 부담이 전체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용자 차별을 이유로 들어 보조금을 규제하고 있지만, 시장 상황은 그보다 더 복잡하다. 보조금 과다 지급과 맞물린 높은 단말기 출고가, 불투명한 판매점 유통구조 등 곳곳이 뇌관이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휴대폰 유통구조가 정상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보조금 규제 방식이다. 현재 정부 규제는 단순히 보조금 상한선을 넘기지 말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일반폰(피처폰) 시절 정해진 보조금 상한선 27만원은 LTE 스마트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높은 단말기 출고가에 대한 조정은 없다.
즉, 소비자 모두가 100만원을 넘나드는 스마트폰 가격에서 27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모두 지불하라는 소리다. LTE 스마트폰 출고가를 조정하거나, 보조금 상한선을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는 이유다. 이용자들의 반발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답답하다. 동시에 얄밉다. 매년 수조원에 달하는 마케팅비를 지출하는 이통사들은 통신비 인하 얘기만 나오면 몸을 사리는데 정부는 빙산의 일각만 죽어라고 때리고 있다. 이통사가 휴대폰 유통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지적은 아예 안 들리는 척이다.
여기에 제조사들은 이통사와 담합해 높은 출고가의 스마트폰을 내놓고도 보조금 논란은 강 건너 불구경이다. 심지어 일부 소비자들은 ‘나만 싸게 사면 돼’ 식의 이기적인 행태까지 보이는 상황이다.
자연히 유통현장에서는 호구+고객이라는 뜻의 ‘호갱’이 양산된다.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현란한 직원의 말솜씨와 할부원금, 약정할인반환금, 에이징 등 복잡한 휴대폰 용어 속에서 길을 잃기 일쑤다. 한 대 팔면 퇴근한다는 ‘퇴근폰’, 한 달 월급이 나온다는 ‘월급폰’이라는 신조어가 씁쓸하다.
관련기사
- 17만원→1천원…영업정지가 남긴 것들2013.03.14
- “과다 보조금”…청와대 칼 빼든 이유2013.03.14
- 영업정지 역효과, 보조금 규제 어쩌나2013.03.14
- KT vs SKT·LGU+ 보조금 네탓 공방2013.03.14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이통사 보조금 과당경쟁에 과징금,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내리며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장장 66일간 이어진 영업정지는 오히려 보조금 경쟁을 촉발했다. 정권 말 방통위의 ‘약발’이 다한 점도 작용했겠으나, 이제는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신호기도 하다.
급기야 청와대마저 휴대폰 보조금을 손보겠다며 나섰다. 보조금 문제가 청와대까지 나서야 할 사안이냐의 논란은 차치하고서라도 휴대폰 유통구조의 문제점에 대한 전반적 성찰과 개선이 이뤄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