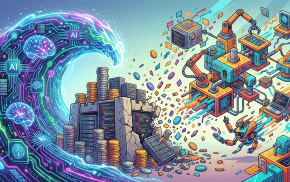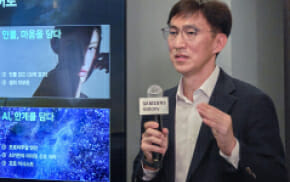휴대폰 보조금 규제를 놓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딜레마에 빠졌다. 보조금 과다 투입을 막기 위한 영업정지 조치가 반대로 시장 과열을 불렀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보조금 상한선 27만원을 현실화하고 100만원에 달하는 단말기 출고가의 재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13일 KT의 영업정지 종료를 앞두고 방통위가 이통3사에 대한 추가 과징금, 영업정지 등의 제재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방통위는 오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지난 1월 7일까지의 보조금 과다 지급 사실조사에 따른 추가 제재를 결의할 예정이다.
문제는 효과다. 이미 영업정지가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지난 3개월여 기간 동안 여실히 증명됐다. 수차례에 걸친 방통위의 경고도 소용없었다. 이동통신사들은 고객 이탈을 우려해 이 기간 동안 그야말로 ‘목숨을 건’ 보조금 경쟁을 벌였다.

실제로 지난해 9월 보조금 경쟁 대란 당시 갤럭시S3 가격은 17만원(온라인 번호이동 기준)이었지만, 영업정지 기간 중인 11일 현재는 오히려 13만원으로 떨어졌다. 심지어 지난 6일 새벽 온라인에서는 1천원짜리 갤럭시S3까지 등장했다.
보조금 과열의 지표가 되는 번호이동 건수(자사 번호이동 미포함) 또한 마찬가지다. 이통시장 비수기로 꼽히는 지난 1월 번호이동은 100만8천36명을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월 역시 84만6천997명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었다.
시장조사업체 애틀러스리서치는 “불법 보조금 문제를 방통위의 정책 실효성 차원에서 보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이미 방통위의 과당경쟁 규제 정책의 기본 틀이 붕괴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통신업계에서는 보조금 규제 현실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LTE폰이 확산되면서 단말기 출고가가 100만원에 달하면서 27만원으로 정해진 보조금 상한선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만약 출고가를 그대로 놔두고 보조금만 줄일 경우 소비자가 비싼 단말기 대금을 고스란히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시장에서는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느냐 안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위반하느냐가 문제”라는 말이 공공연하다.
통신사 고위 임원은 “LTE폰에서는 27만원의 상한선을 지키기 쉽지 않다”며 “단말기 가격이 높아지면서 보조금 가이드라인 실효성이 없어지고 있어 출고가 인하, 상한선 재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통신사 임원도 “보조금은 비싼 휴대폰을 싸게 살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우리나라 휴대폰 유통구조상 당장 보조금을 없애거나 하지는 못한다”며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낮춰가려면 높은 단말기 출고가도 함께 내려 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표현명 KT T&C부문 사장 역시 “휴대폰 대리점이 도떼기시장도 아니고 똑같은 폰이 어제는 70만원, 오늘은 50만원 하는 상황에서는 영원히 고객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휴대폰 보조금에 포함되는 제조사 장려금을 없애는 대신 단말기 출고가를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기사
- 이통사 영업정지 곧 종료...막판 눈치싸움2013.03.11
- KT vs SKT·LGU+ 보조금 네탓 공방2013.03.11
- 보조금 점입가경…1천원짜리 갤S3 등장2013.03.11
- 영업정지 아랑곳…1월 번호이동 활활2013.03.11
최근 방통위는 보조금 상한선에 대한 적정성 연구에 들어갔다. 방통위는 지난 2008년 단말기 보조금 제도가 폐지된 이후 이용자 차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010년 5월 보조금 한도를 27만원으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 시행 중이다. 다만 박근혜 정부 들어 통신 관련 정책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됨에 따라 구체적인 규제 개선 방향은 미정이다.
앞서 전영만 방통위 시장조사과장은 “27만원 상한선 기준이 적당한지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며 “이통3사의 영업보고서나 IR 자료 등을 검토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