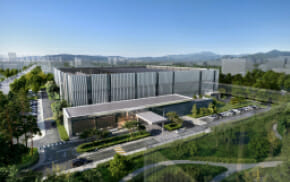1.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에서 오는가
작년 12월 31일(현지시각) 일론 머스크(Elon Musk)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 X를 통해 뉴럴리크(Neuralink)가 올해부터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장치의 대량 생산을 시작하고, 수술 절차 또한 거의 전면 자동화된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uters, 2026). 이는 지금까지 진행했던 임상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상용화 국면으로 진출하겠다는 공표다.
Neuralink의 인간 대상 임상은 2023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임상시험용 의료기기 사용 승인(Investigational Device Exemption, IDE)을 부여하면서 시작되었다(Reuters, 2023). 이후 2024년 1월, Neuralink는 첫 임상 참가자인 놀란드 아부(Noland Arbaugh)에게 뇌 이식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시연에서 그는 생각만으로 커서를 움직여 컴퓨터를 사용해 비디오 게임을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Financial Times, 2024).
여기까지 놓고 보면, BCI 기술은 이미 준비를 마친 듯하다. 수술 로봇은 대기 중이고, 클리닉 설립 계획도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그러나 ‘대량 생산’이라는 단어가 지닌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이는 우리의 가장 내밀한 자아인 뇌마저 규격화된 공정의 산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서늘한 경고와도 같다. 뇌가 하나의 하드웨어처럼 공정과 효율의 언어로 다루어지는 순간, 그 안에 깃든 인간의 존엄은 과연 안전한가.
우리는 흔히 기술적 특이점(singularity)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질문은 어쩌면 ‘윤리적 특이점’에 더 가깝다. 생각이 신호가 되고, 신호가 데이터가 되며, 그 데이터가 외부 시스템과 연결되는 시대에 인간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될 수 있는가. 이 글은 2026년 대량 생산 시대를 목전에 둔 지금,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들—신경 데이터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그리고 정신적 자유는 어떻게 지켜질 수 있는가—를 차분히 짚어보고자 한다. 생각이 클라우드로 전송되는 순간에도, 인간은 여전히 인간으로 남을 수 있을까. 그 물음에서 이 이야기는 출발한다.
2. 생각이 데이터가 되는 문턱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 질문은 칸트 이전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반복되어 온 철학적 난제다. 그러나 인류는 오랫동안 이 질문에 대해 하나의 합의에 가까운 답을 공유해 왔다. 그것은 바로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내면의 성소, 곧 우리의 ‘정신’이다.
이 글을 쓰는 이 순간에도 필자는 내가 밖으로 내뱉지 않은 생각, 침묵 속에 감춰둔 감정, 아직 결정되지 않은 욕망과 망설임들이 내 안에 존재함을 알고 느끼고 있다. 이 내면의 영역은 법도, 권력도, 타인의 시선도 쉽게 닿을 수 없는 곳에 존재한다. 그래서 나는 나의 정신을,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타인이 마구 흔들어 대지 못하는 나만의 그것으로 안도감을 가지고 소유한다.
일종의 이러한 불투명함이야말로 내 자유의 마지막 보루이자, 인간다움의 최후 방어선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은 나와 동일하게 이 글을 읽고 있을 당신도 전유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 인공지능(AI)과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의 결합은 그 난공불락이라 믿었던 마지막 성소의 암호를 해독하며, 그 빗장을 기술적으로 해제하고 있다.
머스크가 이끄는 Neuralink는 침습적 BCI를 통해 뇌 신호를 기계와 직접 연결하는 기술을 개발·시험하고 있다. 이는 비단 Neuralink만의 시도가 아니다. 미국의 Synchron은 FDA의 IDE 하에 환자들에게 기기를 이식했으며, 상업적 승인에 앞서 대규모 임상시험을 준비했다.
BrainGate는 브라운대학교 연구진이 시작한 BCI 프로젝트로, 초기 단계에서 인간의 뇌 신호를 컴퓨터로 무선 전송하는 가능성을 입증한 선도적 연구로 평가된다. 사례 연구에서는 뇌 신호를 최대 약 97%의 정확도로 음성으로 변환하는 데 성공해, 근위축성 측삭경화증(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LS) 환자가 생각만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프랑스의 Clinatec은 Wimagine 장치를 통해 사지마비 환자의 보행과 신경 소통 회복 가능성을 제시했으며, Onward Medical과의 협력을 통해 BCI와 척수 자극을 결합한 시스템이 상·하지 운동 기능 회복에서 타당성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했다(Barrie, 2024).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생각이 데이터가 되는 문턱’을 통과하고 있다. 질문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기술이 우리의 뇌를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된 세상에서, 과연 우리의 ‘정신적 자유’는 어떻게 지켜질 수 있는가?

3. 행동의 감시에서 ‘뇌의 해킹’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온 프라이버시 침해는 주로 ‘행동’과 ‘흔적’에 국한되어 있었다. 클릭 기록, 위치 정보, 구매 이력, SNS 활동 등이 그것이다. 조지 오웰(George Orwell)의 소설 '1984』(Nineteen Eighty-Four, 1949) 그려낸 감시 역시 ‘행동을 들여다보는 권력’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감시는 모두 사후적으로 남겨진 외적 행위를 분석하는 데 머물러 있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다시 말해, 무엇을 생각했는지는 알 수 없고, 다만 생각이 행동으로 번역된 이후의 결과만이 감시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BCI 기술은 이 경계를 넘어선다. 이제 수집되는 것은 행동 이후의 데이터가 아니다. 행동 이전, 의식 이전, 그리고 선택 이전의 신경 데이터(Neural Data)다. 최근의 뇌신경과학 연구들은 AI가 fMRI나 EEG 데이터를 해독하여 사람이 보고 있는 이미지를 재구성하고, 머릿속에서 떠올린 문장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연구자들은 fMRI를 사용하여 기록된 대뇌 피질의 의미론적 표상으로부터 연속적인 언어를 재구성하는 비침습적 디코더를 소개했다. 이 디코더는 새로운 뇌 활동 데이터를 바탕으로 피험자가 들었던 말이나 상상한 말, 심지어 소리 없는 영상을 보았을 때의 내용까지 의미를 복원해 내는 ‘이해 가능한 문장’을 생성했다. 연구자들은 대뇌 피질 전반에 걸쳐 이 디코더를 테스트하였으며, 연속적인 언어 정보가 뇌의 여러 영역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해독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Tang et al., 2023).
이 변화가 갖는 함의는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선다. 지금까지 프라이버시는 개인이 무엇을 했는가에 관한 문제였다면, 이제 그것은 개인이 무엇을 하려 했는가, 더 나아가 무엇을 의미로 구성하고 있었는가의 문제로 이동하고 있다. 뇌가 알고리즘에 의해 해석 가능한 신호 공간으로 편입되는 순간, ‘동의’와 ‘자율성’, ‘내면의 자유’는 더 이상 자명한 전제가 아니다.
우리의 뇌는 더 이상 미지의 블랙박스로 남아 있지 않다. 두개골 안의 뇌는 여전히 생물학적 기관이지만, 동시에 분석·예측·잠재적 개입의 대상이 되는 입출력(I/O) 시스템으로 재정의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 개념만으로는 이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4. 신경권(Neurorights): 새로운 인권 탄생
필자의 저서 'BCI와 AI 윤리'에서 강조했듯, 기존의 법과 윤리 체계는 이러한 상황을 방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신체의 자유, 통신 비밀, 개인정보 보호법만으로는 뇌 속의 정보를 온전히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개념이 바로 ‘신경권(Neurorights)’이다.
신경과학과 신경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인간의 뇌로부터 정보를 접근·수집·공유·조작할 수 있는 전례 없는 가능성을 열고 있다. 이러한 활용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인권 원칙에 대한 중대한 도전을 제기한다.
마르첼로 이엔카(Marcello Ienca)와 로베르토 안도르노(Roberto Andorno)는 네 가지 새로운 권리를 도출했는데, 그것은 인지적 자유에 대한 권리, 정신적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 정신적 온전성에 대한 권리 그리고 심리적 연속성에 대한 권리이다(Ienca & Andorno, 2017).
신경권은 크게 두 가지 핵심 권리를 포함한다. 첫째는 ‘정신적 프라이버시(Mental Privacy)’로, 개인의 신경 데이터가 본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수집·분석·이용·거래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기존 개인정보 보호 개념이 행동 데이터와 식별 정보에 머물러 있던 한계를 넘어, 사고·의도·의미 형성 과정 자체가 데이터화되는 상황을 전제로 등장한 권리 개념이다.
둘째는 ‘인지적 자유(Cognitive Liberty)’로, 개인의 생각, 감정, 판단 형성이 외부의 기술적 개입—특히 알고리즘적 조작이나 신경 자극—에 의해 변경·유도·통제되지 않을 권리를 뜻한다. 이 두 권리는 전통적 자유 개념의 단순한 확장이 아니라, 자유의 존재론적 기준점 자체가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이해할 수 있다.
고전적 자유(liberty)가 외부 강제의 부재, 즉 행동의 자유를 중심으로 정의되었다면, 신경권이 문제 삼는 것은 그보다 선행하는 단계인 사고의 형성 조건이다. 실제로 현대 신경과학과 BCI 연구는 선택과 행동이 발생하기 이전의 신경 과정이 기술적으로 관측·해석·개입 가능하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입증해 왔다. 이로 인해 자유는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생각하고 의미화할 수 있는가가 외부 시스템에 의해 구조화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재구성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이미 제도적 논의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칠레다. 2021년 칠레는 신경기술의 잠재적 오남용을 다루는 두 가지 이니셔티브를 논의한 세계 최초의 선도적 사례 중 하나다. 하나는 헌법 개정안이고, 다른 하나는 신경권(neurorights)을 신설하는 법안이다.
헌법 개정은 신속히 승인된 반면, 구체적인 신경권을 창설하는 법안은 현재도 하원에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초기에는 지지가 있었지만, 현재 두 이니셔티브 모두 비판에 직면해 있다(Arriagada-Bruneau et al., 2025).
그러나 이 조치는 신경기술이 개인의 뇌 활동과 인지 과정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나 신체권 중심의 인권 체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논의가 된다. 이러한 접근은 인지적 자유(cognitive liberty)를 표현의 자유나 사상의 자유의 하위 범주로 환원하기보다는, 신경과학과 인공지능이라는 기술 조건의 변화 속에서 독립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할 권리 영역으로 이해하려는 국제적 논의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따라서 뇌 데이터를 단순한 ‘개인정보(data)’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신체의 일부인 ‘장기(organ)’로 간주할 것인지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은 기술 사회가 인간의 존엄을 어떤 방식으로 재정의해야 하는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이러한 논쟁을 기술 발전의 속도를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지체 현상으로 치부하기보다는 인간의 가장 내밀한 성소인 정신적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해 인류가 선제적으로 수행해야 할 숙의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편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는 다가올 기술 환경 속에서 인간의 존엄을 방어할 미래의 법적 면역 체계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단계라 할 수 있다.
5. 디지털 식민화와 뉴로 자본주의(Neuro Capitalism)
의료차원에서의 엄청난 혜택에도 불구하고, 만약 강력한 윤리적 제동 장치 없이 BCI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는 ‘정신의 디지털 식민화’라는 디스토피아에 직면할 수 있다.
거대 테크 플랫폼들은 우리가 무엇을 ‘좋아요’ 하는지를 넘어, 무엇을 볼 때 뇌의 보상 회로가 반응하는지를 직접 측정하려 들 것이다. 뇌파 헤드셋이 보편화된 미래의 교실을 상상해 보자. 학생의 집중도가 교사의 태블릿에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딴생각을 하는 순간 경고음이 울리는 수업. 이것을 교육이라 부를 수 있을까, 아니면 사육이라 불러야 할까?
극단적인 시각에서 볼 때, 이는 인간을 자율적인 도덕 판단의 주체가 아니라, 효율성 최적화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뉴로-자본주의(Neuro-Capitalism)’의 민낯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지점이 있다. 바로 자유는 ‘감추는 능력’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Minority Report)'(2002)는 범죄를 저지르기도 전에 뇌의 의도를 읽어 처벌받는 사회를 경고했다. 이는 제레미 벤담의 ‘판옵티콘(Panopticon)’이 신체 감시를 넘어 정신 감시로 확장된 형태다.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는 '인간의 조건』(The Human Condition, 1958)'에서 사적 영역의 붕괴가 인간을 끊임없이 드러나고 평가받는 존재로 만들며, 그 결과 자유의 조건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논증한다(Arendt, 1958).'
아렌트에게 사적 영역은 단순한 은신처가 아니라, 인간이 공적 세계에 자신을 드러내기 이전에 생명과 사고, 감정이 타인의 판단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면제되는 공간이다. 오늘날 이를 ‘불투명성’이라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은 사적 영역이 수행해 온 비가시성·비노출성의 기능을 현대적 어휘로 옮겨 적은 표현에 가깝다. 이런 불투명성은 인간이 공적 세계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이자, 동시에 타인의 시선 밖에서 자기 자신으로 회복될 수 있는 최소한의 토대라고 말할 수 있다.
6. 맺음말: 나의 뇌는 누구의 것인가
필자의 연구가 일관되게 붙들어 온 핵심 가운데 하나는 ‘윤리 감수성(Ethical Sensitivity)’이다. AI와 BCI를 둘러싼 논의가 흔히 성능, 효율, 상용화의 속도로 기울 때, 우리가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다르다. ‘이 기술은 편리한가?’가 아니라 ‘이 기술은 인간을 어떤 존재로 만들고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기술은 도구지만, 도구가 인간을 해석하는 방식—무엇을 정상으로 두고 무엇을 결함으로 분류하며 무엇을 데이터로 환원하는가—를 바꾸는 순간, 윤리는 부가 옵션이 아니라 방향 그 자체가 된다.
물론 BCI와 AI는 난치병 환자에게 실질적인 희망을 제공하고, 소통과 이동의 경계를 넓힐 수 있는 강력한 가능성이다. 말할 수 없던 사람이 다시 말할 수 있게 되고, 움직일 수 없던 사람이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 기술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선물에 가깝다.
그러나 같은 기술이 다른 장면에서는 정반대의 얼굴을 드러낼 수 있다. 치료의 이름으로 수집된 신경 데이터가 어느 순간 산업의 원료가 되고, 편의의 이름으로 설계된 인터페이스가 인간의 욕구와 선택을 ‘예측’하는 수준을 넘어 ‘유도’하는 체계가 된다면, 우리는 삶의 가장 안쪽—사고의 형성, 망설임, 침묵, 미완의 감정—까지 공정과 효율의 언어로 재분류하는 시대에 들어서게 된다.
여기서 프라이버시는 더 이상 클릭과 위치, 구매 이력의 문제가 아니다. 행동 이후의 흔적이 아니라 행동 이전의 의도, 말로 나오기 전의 생각, 심지어 아직 스스로도 명료하게 규정하지 못한 감정의 결까지 데이터가 될 수 있다.
뇌가 ‘입출력(I/O) 장치’처럼 이해되는 순간,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도 완전히 투명해야 하는 존재가 될 위험에 놓인다. 그 투명성은 곧바로 자유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자유란 단지 선택지의 개수가 아니라, 선택이 형성되는 내면의 공간—말하지 않을 권리, 드러내지 않을 권리, 멍하니 있을 권리, 엉뚱한 상상을 품을 권리—이 보장될 때 비로소 성립하기 때문이다. 내면이 완전히 노출되는 사회에서, 인간은 스스로 결정하는 존재라기보다 타인의 시선과 알고리즘의 기준에 ‘조정되는’ 존재로 전락할 수 있다. 우리는 그 체제를 ‘정신적 판옵티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질문은 피할 수 없다. 나의 뇌는 누구의 것인가? 나의 신경 데이터는 누구의 소유가 될 수 있으며, 누구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가? 더 나아가, 내가 말하지 않은 생각과 설명하지 않은 감정, 실패할 자유와 망설일 자유는 앞으로도 온전히 존속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기술의 선의에 맡겨질 수 없다. 필요한 것은 선전이 아니라 원칙이며, 낙관이 아니라 제도다.
최소한 정신적 프라이버시와 인지적 자유—내면이 동의 없이 수집·분석·거래되지 않을 권리, 그리고 나의 사고와 감정이 외부의 개입으로 조작되지 않을 권리—는 기술 발전의 속도와 무관하게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기술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묻는 일만큼, 우리가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묻는 일이 중요하다. 어떤 혁신도 인간의 내면을 공공재처럼 개방할 권리는 없다. 설령 기술이 가능하더라도,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경계가 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의 정신은 동의 없이 침범될 수 없는 최후의 성소로 남아야 한다. 그것이 인간을 인간으로 남게 하는 마지막 선이며, 우리가 지켜야 할 자유의 가장 깊은 형태가 아닐까?
◆ 필자 박형빈 서울교육대학교 윤리학과 교수는....
▲약력
· 서울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 미국 UCLA 교육학과(Department of Education) 방문학자
·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에듀테크전공·AI인문융합전공 교수
· 서울교육대학교 신경윤리·가치AI융합교육연구소 소장
▲주요 경력 및 사회공헌
· 현 신경윤리융합교육연구센터 센터장
· 현 가치윤리AI허브센터 센터장
· 현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
· 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주요 수상
· 세종도서 학술부문 우수도서 3회 선정 ― 『어린이 도덕교육의 새로운 관점』(2019, 공역), 『뇌 신경과학과 도덕교육』(2020), 『양심: 도덕적 직관의 기원』(2024, 역서)
▲주요 저서
· 『도덕적 AI와 인간 정서』(2025)
· 『BCI와 AI 윤리』(2025)
· 『질문으로 답을 찾는 인공지능 윤리 수업』(2025)
· 『AI 윤리와 뇌신경과학 그리고 교육』(2024)
· 『양심: 도덕적 직관의 기원』(2024)
· 『도덕지능 수업』(2023)
관련기사
· 『뇌 신경과학과 도덕교육』(2020)
· 『통일교육학: 그 이론과 실제』(2020)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