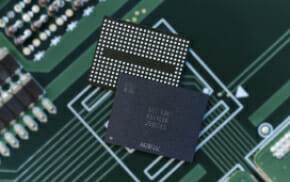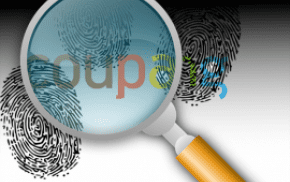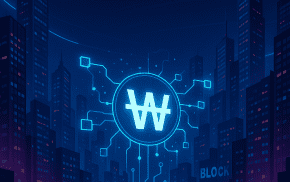김양균 기자, 칼럼 잘 봤네. ‘정신이 팔린 동안에’란 제목으로 쓴 15일자 말일세. 간곡한 진심이 느껴져 답하는 글을 쓰기로 했네. 이런 글을 써보긴 처음일세. 김 기자 칼럼이 그만큼 생각할 거리를 많이 담고 있다는 뜻일 걸세. 결론부터 말하면 김 기자 생각에 아주 많이 공감하면서도 어떤 면에선 약간 다르게 보는 것도 있다네. 그것에 대해 이렇게 말할 기회가 주어져 기쁘기 한량없네.
김 기자 글에서 진한 인간적 감성을 느낄 수 있어 참 좋았다네. ‘절대적 빈곤’에 처한 이들을 봐오면서 김 기자가 흘렸을 눈물을 생각하고 있다네. 팔레스타인과 시리아와 아프카니스탄의 난민들. 왜 아니겠는가. TV 화면으로만 봐도 가슴이 저려오는데 직접 눈으로 목격했으니 그 참상과 아픔이 오죽했겠는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고작 글 한 줄이라니 그 절망감 또한 얼마나 컸겠나.

지금은 그런 글 한 줄마저 쓸 수 없는 형편이니 더 답답해하고 있으리라 생각되네. 밤마다 그곳으로 달려가 그들과 아픔을 함께 하는 꿈을 꾸고 있을 지도 모르겠구만. 그 아픔과 절망감과 꿈이 기자 김양균의 삶을 지탱시키는 동력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네. 그렇게 살아가는 김 기자이니 모두가 부동산과 주식을 향해 ‘영끌’에 나서는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천박하게 보일지 짐작이 가네.
김 기자는 부동산과 주식을 향해 모두 ‘영끌’에 나서며 주위를 살피지 않고 오직 직진만 하는 우리 사회에 대해 “두렵다”고 했네. 왜 그렇지 않겠는가. 김 기자 지적처럼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각박하”기만 하네. 김 기자는 그 원인으로 “무언가 우리 눈을 가린 탓”이라고 썼네.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를 김 기자는 지적하지 않았지만 말하지 않아도 우리들 대부분은 그것을 알지 않겠는가.
걱정은 다른 데 있다네. ‘앎’이 곧 ‘행위’는 아니라는 점일세. 우리는 행위해야 할 많은 앎을 알지만 실제로는 행위하지 않고,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행위하는 경우도 수두룩하다네. 예수와 부처의 말씀을 귀가 닳도록 들으면서도 그대로 살지 않고, 최선의 정치체제를 개발하고도 도리어 그걸 폭력의 도구로 써온 게 우리들 인간 아니겠는가. 뭣도 모르는 기업에 몰빵하는 것도 우리 인간이고.
김 기자 글이 좋았던 까닭이 거기에 있네. 김 기자의 글에서 앎이 아니라 인간이 희망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어떤 것의 일면을 봤기 때문이네. 그것은 어쩌면 몇 줄의 글로 설명될 수 없을 것이네. 김 기자가 느꼈던 두렵다는 감정도 어쩌면 그중 하나일 걸세. 두려움 많은 자가 어찌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할 수 있었겠는가. 두려움 많은 자가 어찌 다른 사람을 발아래 부릴 수 있겠는가.
김 기자의 그런 마음의 바탕이 참 부럽다네. 또 더 많이 느끼고 싶고 가능하면 본받고 싶다네. 이제는 김 기자와 다른 생각을 말할 차례네. 다름이 아니고 기술에 관한 관점이 그것일세. 김 기자는 “기술의 진보가 우리의 삶까지 진보시키는가”라고 묻고 “나는 확답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네. ‘진보’라는 말을 쓴다면 나도 확답은 못하겠네. 다만 나는 ‘기술이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확신하네.
이 코너의 타이틀을 ‘이균성의 온기(溫技)’라고 짓고 시간 날 때마다 어줍지 않은 글을 써온 까닭이 바로 그것이라네. 인간 세상을 변화시키는 요소에는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게 나는 과학기술이라고 믿는 편이라네. 다만 모든 게 그렇듯 주체의 의도에 따라 과학기술도 인간에게 나쁜 쪽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편이네. 핵(核)을 생각해보게.
어디 핵 뿐이겠는가. 로봇으로 인한 노동의 소외나 일의 재편,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 지나친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기후위기. 그 예는 숱하게 많을 걸세. 과학기술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이면에 해결해야 할 문제를 숱하게 쏟아내면서 결국 정반합의 변증법적 원리에 따라 발전하는 게 아니겠는가. 김 기자가 맡은 ‘생태계 교란으로 인한 팬데믹과 바이오의 발전’도 그렇지 않은가.
김 기자는 어쩌면 궁극적으로 종군 기자를 꿈꾸고 있을 것이네. 그 참상을 기록하고 세상에 알려 인간사회가 더는 그렇게 잔인하지 않게 되도록 말일세. 그런데 전쟁은 그곳에만 있는 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네. 김 기자가 썼듯이 동자동 쪽방의 삶 또한 하루하루 전쟁이 아니겠나.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항하려는 과학기술 또한 마찬가지이겠고, 플랫폼 노동에 내몰리는 많은 청춘도 그렇겠지.
“기술에 대한 칭송 이전에 우리는 삶을, 사람부터 보아야한다”는 김 기자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네. “기술에 대한 헌사 대신 눈물 흘리는 이들의 손부터 움켜쥐어야한다”는 말도. 우리 그렇게 하세나. 그런데 칭송까지는 아니어도 기술이 어디로 가는지를 잘 살피는 일도 꽤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싶네. 더 많은 손을 잡아주기 위해 그럴 필요가 있기 때문이지. 그것도 보람있는 일 아니겠나.
관련기사
- 나잇값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을 위한 위로2021.11.12
- 또 하나의 세상 또 하나의 삶, 메타버스2021.08.20
- 이재용 사면 논란, 윤석열 판단이 궁금하다2021.06.03
- LG-SK 소송...최태원과 구광모의 문제다2021.04.06
곧 술 한 잔 앞에 놓고서 못다한 이야기를 이어가보세.
PS. 참, 김 기자가 찍은 사진이 너무 좋아 허락 없이 이 글에서도 좀 빌림세.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