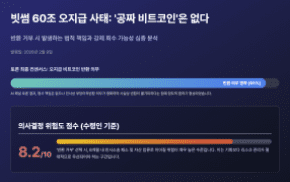최근 거주지를 옮겼다. 전셋값이 무섭게 오르고, 은행은 대출을 줄이는 통에 집을 구하는데 애를 먹었다. 거주지가 있는 구도심에서 한 블록을 더 가면 새 아파트 단지가 있다. 깔끔하게 정돈된 가로수며 보도블록이라니. 구도심과 아파트단지를 가로막는 것은 고작 50여 미터의 횡단보도 하나뿐인데 간극은 컸다.
부동산 대란 와중에 ‘영끌’로 마련한 아파트 덕분에 시세 차익을 수억이나 벌었다는 뉴스가 더 이상 새롭지 않다. 이러한 세태에 혹자는 상대적 빈곤을 토로한다. 그러나 나는 지금이야말로 절대적 빈곤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식주(衣食住) 가운데 주(住), 즉 집을 소유하려는 한국인의 집착에 가까운 유난스러움. 그것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다만, 그 너머, 복지의 기본이자 완성인 집의 부재에 놓인 이들을 우리가 보지 않으려 한다는 사실이 나는 두렵다.
몇 년 전 팔레스타인 라말라에서 ‘하캄’을 만난 적이 있다. 그는 ‘경계인’이었다. 이스라엘 정부가 세운 분리장벽 중간에 그의 집이 있었다. 방 네칸에서 네 가구가 비좁게 살고 있었다. 그를 내쫓기 위해 이스라엘 정부는 수시로 압박과 위협을 가했지만 그는 집을 포기하지 않았다. 집값 때문이 아니라, 터전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 정부군의 봉쇄와 공격을 버티다 터전을 버려야 하는 시리아 알레포사마의 사람들은 결국 도시를 등져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그들은 눈물을 흘린다. 추억이 서린 터전을 버려야 한다는 고통 때문이다.
그들뿐인가. 탈레반 장악 이후 살해 위협에 아프가니스탄을 등지고 이역만리 우리나라까지 와야만 했던 ‘특별기여자’들의 심정이 어떠했을 것인가.
몸 하나 뉘일 곳 없는 이들이 처한 절대적 빈곤. 가족의 터전을 지키려는 가장의 고군분투. 우리는 그것을 알려 하지 않는다. 너무 빠르고 각박한 세상, 우리 눈을 가리는 무언가에 둘러싸여 사는 탓이다.

기술이 고도화되고, 나아가 가상의 세계가 우리 현실 가까이 왔다고 한다. 진보된 기술의 세계에 사는 우리는 발밑에 누굴 밟고 있는지, 곁과 뒤에 누가 있는지 관심 둘 새가 없다. 동자동 쪽방촌에서 숱한 삶이 스러져간들 누구 하나 관심 쓸 겨를이나 있겠는가.
갈수록 테크놀로지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발전할 것이다. 그렇지만 기술의 진보가 우리의 삶까지 진보시키는가. 나는 확답하지 못하겠다.
지금도 우리 발 아래에는, 등 뒤에는, 기술의 호혜를 누릴 겨를은커녕 매일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삶을 사는 이들이 있다.
기술의 칭송 이전에 우리는 삶을, 사람부터 보아야 한다. 기술에 헌사 대신 눈물 흘리는 이들의 손부터 움켜 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