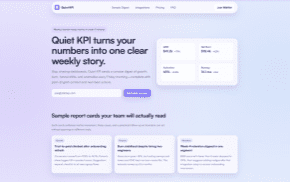암호화폐(가상자산) 산업을 최초로 법제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이후 블록체인 업계에 '용어 선택' 문제가 예상치 못한 과제로 떠올랐다.
지금까지 암호화폐, 가상화폐, 디지털자산 등 다양한 용어가 혼용돼 왔는데 특금법에 가상자산이 명시되면서 이제 가상자산으로 통일해 불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내년 3월 특금법이 시행되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거래소들은 벌써부터 가상자산을 적극 사용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가상자산은 관련 산업의 잠재력을 축소한 용어로, 굳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냐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않다. 가상자산의 '가상'은 실재하지 않는 허구의 것이라는 의미가 있고, '자산'은 가치는 있으나 화폐처럼 지급결제 수단으로 쓰이는 건 아니라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이다.
실제 '암호화폐, 가상자산, 디지털화폐 등 다양한 용어 중 산업에서 장기적으로 사용할 가장 적절한 용어가 무엇인지'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그동안 널리 사용해온 '암호화폐'를 계속 쓰는 게 좋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웠고, 다른 용어가 필요하다는 의견 중에는 '디지털화폐'와 '디지털자산'에 대한 선호가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나왔다. 가상자산에 대한 선호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산업이 발전하면서 성격과 사용사례가 다양해져 하나의 용어로 규정하기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고 보고, 맥락에 맞춰 적절한 용어를 찾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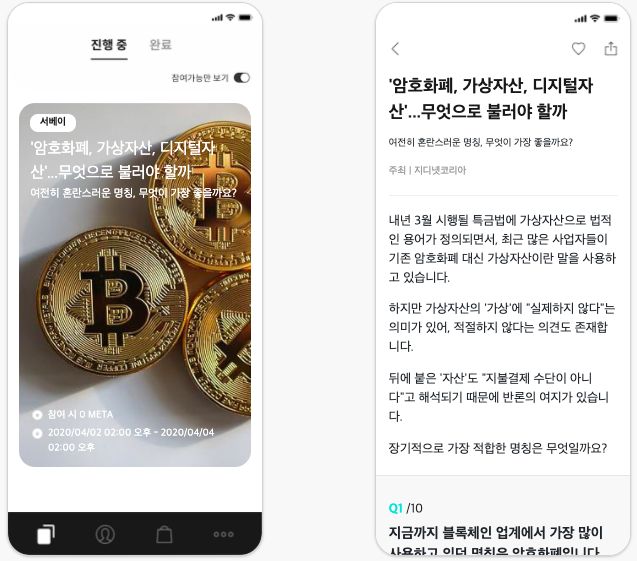
■'암호화폐, 가상자산, 디지털자산'...무엇으로 불러야 할까
본지는 블록체인 기반 투표조사 서비스 '더폴'을 통해 지난 2일부터 사흘간 이용자 273명이 대상으로 <'암호화폐, 가상자산, 디지털자산'...무엇으로 불러야 할까>란 주제의 설문을 진행했다.
먼저 블록체인 업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던 암호화폐란 용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49.6%가 '필요없다'고 답해, 암호화폐를 계속 사용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절반 가까이 나왔다.
암호화폐를 계속 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암호화 기술을 기반으로 새롭게 탄생한 화폐라는 의미가 적절해 보여서'란 응답이 63.7%로, '이미 널리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란 응답(36%) 보다 많았다.
암호화폐 대신 다른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면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이느냐는 질문에는 '디지털화폐'가 37.9%로 가장 많았고, '디지털자산'이 36.9%로 뒤를 이었다. '가상화폐'는 14.6%, '암호자산'은 8%였고, '가상자산'은 2.7%에 불과했다.
디지털화폐를 선택한 이유로는 '가상이나 암호라는 표현은 거부감이 들기 때문에 디지털이 적절한 것 같고, 자산보다 지불결제 수단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보여서'를 꼽은 사람은 59%로 가장 많았다. '글로벌하게 많이 쓰는 표현이라'는 응답은 20%, '리브라나 CBDC 같이 굵직한 사용사례를 가장 잘 드러내는 표현이라'는 응답은 19%로 나왔다.

■"사용 맥락에 맞게 적절한 선택 필요"
설문에서 응답자들의 선호가 높게 나온 암호화폐, 디지털화폐, 디지털자산 등은 각각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가지고, 다른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다.
암호화폐는 기술적으로 암호학을 사용해 구현했고, 발행과 작동원리가 탈중앙화됐으며, 쓰임새로는 화폐 역할을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암호학 전문가 웨이 따이다. 그는 1998년 사이퍼펑크(암호학 기술로 검열에 저항하고 프라이버시를 강화하자는 사회 운동) 그룹 내 메일링 리스트에서 암호화폐란 개념을 제시하며 "암호학을 사용해 중앙화된 주체 없이도 발행과 거래가 가능한 새로운 돈의 형태"라고 소개했다.
그때까지 아이디어로만 존재했던 암호화폐를 최초로 구현한 것이 2009년 탄생한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재단도 비트코인을 '최초의 암호화폐'라고 소개하고 있다.
비트코인재단 외에도 이더리움재단 등 대부분의 퍼블릭 블록체인 프로젝트와 바이낸스, 비트스탬프 등 글로벌 대형 거래소들은 글로벌 규제 강화 분위기와 상관 없이 암호화폐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디지털화폐나 디지털자산은 이전까지 아날로그 형태였던 화폐나 자산을 '디지털 토큰화'했다는 의미가 강하다. 블록체인 기술 사용 여부나 탈중앙화 여부 보다 디지털화를 통해서 더 쉽고, 빠르고, 편하게 가치를 전송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는 관점이 담겼다.
따라서, 디지털화폐는 각국 중앙은행이나 페이스북 같이 중앙화된 기업에서 지급결제 수단으로 발행한 화폐를 부를 때 사용하는 게 적합하다. 디지털자산은 부동산, 주식, 미술품, 게임 아이템 등 경제적 가치를 가진 모든 종류의 자산을 토큰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다.
비트코인이 탄생했을 때는 암호화폐라는 개념이 가장 적합했지만, 이제는 자산의 토큰화(STO), 대기업의 화폐 발행,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CBDC) 등 새로운 사용사례가 나오면서 용어도 분화하는 모양새다.
관련기사
-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담은 특금법, 국무회의 통과2020.04.08
- 가상자산 법제화, 특금법 다음 수순은 '과세'2020.04.08
- 특금법, 가상자산 산업에 약일까 독일까2020.04.08
- 사실상 가상자산 사업자 허가제 도입...특금법 주요 내용 총정리2020.04.08
전문가들은 이에 용어를 하나로 통일하려는 노력보다 맥락에 맞춰 적절한 용어를 찾아 정의하는 게 혼란을 줄이는 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인호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교수(고려대블록체인연구소장)는 "화폐의 성격, 자산의 성격, 계약 도구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어서 하나로 정의하기가 어렵다"며 "용어 성격에 따라 적용하는 법이 달라지고 세금문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용되는 맥락에 맞게) 정의를 다이나믹하게 내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