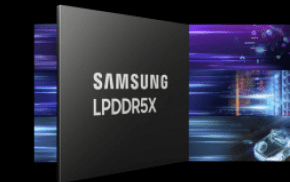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반독점 소송 중인 퀄컴이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은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특허 라이선스 관행 시정 명령 집행을 유예해달라는 퀄컴의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야후 파이낸스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26일(이화 현지시간) 보도했다.
퀄컴은 지난 5월 FTC와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다. 1심 재판을 담당한 루시 고 판사는 ‘라이선스 계약을 맺지 않을 경우 칩을 판매하지 않는(no license, no chips)’ 퀄컴의 전략이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퀄컴 측에 특허 라이선스 관행을 수정하라고 명령했다. 또 향후 7년 동안 이행 사항을 FTC에 보고하도록 했다.
당시 루시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퀄컴의 라이선싱 관행이 CDMA와 LTE 시장 경쟁을 억압하면서 경쟁사와 주문제작업체(OEM),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안겼다”고 지적했다.
판결 직후 퀄컴은 곧바로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했다. 이와 동시에 1심 재판부에는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판결 집행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루시 고 판사는 퀄컴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퀄컴은 항소심을 담당할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에 1심 명령 집행 유예를 신청했다.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의 이날 결정은 퀄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요청이 기각됐을 경우 곧바로 라이선스 관행을 수정해야 했던 퀄컴은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큰 힘을 받게 됐다.
■ 퀄컴 "1심법원 판결, 항소심서 뒤집힐 것으로 기대"
제9순회항소법원은 퀄컴의 유예 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크게 네 가지 조건을 고려했다.
첫째. 본안소송 합리적 승소 가능성.
둘째. 집행 유예하지 않을 경우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지 여부.
셋째. 집행 유예를 선언할 경우 다른 당사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
넷째. 공중의 이익.
이런 기준을 적용한 결과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1심 판결 집행을 유예해 달라"는 퀄컴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제9순회항소법원이 밝혔다.
항소법원은 “퀄컴이 최소한의 수준에서 1심 법원 결정에 심각한 의문점이 있다는 부분을 보여준 데 대해 만족한다”고 밝혔다. 즉 퀄컴이 OEM업체들에게 스마트폰 단말기 기준으로 특허 로열티를 부과한 것은 독점금지법 위반 행위는 아니란 점을 잘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본안 소송 승패와는 직접 관계는 없다. 제9순회항소법원 역시 “(1심 판결 집행 유예) 신청 때는 승소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는 없다”면서 “다만 승소할 ‘합리적 개연성’ 혹은 ‘상당한 전망’을 보여주면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1심 판결 집행을 유예했다는 건 최소한 항소심을 통해 제기한 이슈를 충분히 살펴볼 가치가 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점에서 퀄컴에겐 나쁘지 않은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결정에 대해 퀄컴은 “제9순회항소법원이 우리 요구를 수용한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1심 법원의 결정이 항소심에서 뒤집어질 것으로 믿는다”고 논평했다.
■ 2017년 1월 FTC 제소로 시작
이번 소송은 지난 2017년 1월 FTC 제소로 시작됐다. FTC는 퀄컴이 모뎀 칩 시장의 지배적인 위치를 이용해 단말기업체들로부터 과도한 로열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서 시작된 소송에서 FTC는 퀄컴이 3G, 4G 칩 분야의 시장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를 통해 퀄컴이 애플 같은 단말기 생산업체들에게 과도한 로열티를 받아냈다는 주장이다.
관련기사
- 美 법원 "퀄컴, 특허 라이선스 관행 즉시 시정"2019.08.27
- 애플 유탄 맞은 퀄컴, '애플과 화해' 덕 볼까2019.08.27
- "칩 공급+라이선스 연계금지"…퀄컴에 5대 시정조치2019.08.27
- 美 법원 "퀄컴, 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2019.08.27
특히 FTC는 퀄컴의 이런 행위를 막지 않을 경우 5G 시장에서도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퀄컴은 FTC가 잘못된 법 이론을 적용하고 있다고 맞섰다. FTC가 문제 삼은 ‘특허 라이선스를 하지 않을 경우 칩을 판매하지 않는 정책’도 궁극적으론 소비자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