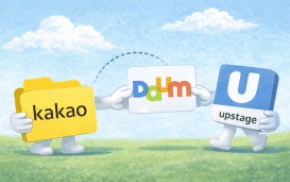한 때 인터넷은 공론장으로 기대를 모았다. 신분이나 주제 제한 없이 자유로운 토론이 오가는 공간. 하버마스가 18세기 카페와 살롱에서 찾았던 그 공간이 전 지구적으로 확대될 것이란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아름답게 흘러가지 않았다. 인터넷엔 ‘정보의 바다’란 빛 대신 ‘정보 편식’이란 어두운 그림자가 더 짙게 드리워졌다.
대화 가능성은 커졌지만, 의미 있는 대화는 더 줄었다. 토론을 통해 숙의에 도달하는 모습은 찾기 힘들어졌다.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파편화(fragmentation) 현상 때문이다.
하버드대학의 캐스 선스타인 교수는 10여 년 전부터 이런 문제를 경고해 왔다. 그는 인터넷이 ‘집단 극단화(group polarization)’를 더 가속화시킨다고 주장했다. 비슷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소통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더 극단적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가장 극렬하게 드러난 플랫폼이 유튜브다. 유튜브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토론은 없고, 선전선동만 난무하는 공간으로 전락했다. 선거나 중요한 이벤트 때마다 유튜브가 ‘가짜뉴스의 온상’이란 비판을 받는 것도 그 때문이다.
조금 심하게 비유하자면 지금 유튜브는 분단시대를 맞고 있다. 좌와 우로 갈라져 서로 비방과 험담만 일삼고 있단 의미다.

■ 확증편향 시대에 대화의 창 연 것만으로도 의미 충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유튜브 토론은 그래서 더 큰 의미를 갖는다. 이념 편향의 반대편에 서 있는 두 사람이 유튜브에서 보기 드물게 유쾌한 논쟁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흔쾌히 박수를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대표적인 좌우 논객인 두 사람은 유튜브에서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유 이사장이 운영하는 알릴레오는 구독자 83만명에 이른다. 홍 전 대표의 TV홍카콜라 구독자도 29만 명이다.
두 사람은 3일 ‘홍카x레오’란 콜라보 토론 프로그램을 통해 2시간 40분 동안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주제는 한반도 안보, 리더, 패스트트랙 등 10가지 키워드였다. 두 사람이 제시한 다섯 개씩의 키워드 중 자유롭게 뽑아서 원고 없이 토론하는 방식이었다.
토론 자체는 특별할 건 없었다. 열띤 공방을 기대했던 사람들에겐 오히려 밋밋할 수도 있었다. 격렬한 인파이팅보다는 거리를 둔 아웃복싱에 가까웠다.
하지만 난 이번 토론이 최근 우리 사회에 던진 메시지는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번 토론 덕분에 알릴레오 구독자들은 홍 전 대표의 생각을, TV홍카콜라 구독자들은 유 이사장의 생각을 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정보 편식과 확증편향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이 시대엔 보기 드문 맞장토론이었던 셈이다.
유 이사장이 토론 시작 전 홍카콜라 구독자들에게 던진 인사말은 새겨들을 만했다. 그는 “편식은 몸에 해롭다. 괜찮다면 열 번 홍카콜라 보시다가 한 번 정도 알릴레오 봐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보 편식 시대에 한번쯤 실천해볼만한 권고였다.

소셜 플랫폼 시대가 되면서 니콜라스 네그로폰테가 1990년대에 제기한 ‘나만을 위한 뉴스(The Daily Me)’란 비전이 현실이 되고 있다. 내가 관심 가질 만한 뉴스를 골라주는 알고리즘 덕분이다.
이런 정보혁명은 축복만 가져다준 건 아니었다. 보고 싶어할만한 뉴스만 접하는 ‘정보편식’이 생각보다 심해졌다. 이런 현상은 확증 편향이란 또 다른 부작용으로 이어졌다. 이런 현상이 극대화되면서 나타난 것이 ‘가짜뉴스 문제’다. 그 결과 유튜브 분단시대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관련기사
- 유튜브 인기 정치채널, 보수가 다수…1위는 진보2019.06.04
- '동영상 채널' 유튜브, 검색시장서 네이버 위협2019.06.04
- 유튜브 천하…우리는 왜 실패했을까2019.06.04
- 사람들은 왜 '거짓뉴스'에 더 끌리는 걸까?2019.06.04
‘홍카x레오'가 예사롭지 않은 건 이런 상황 때문이다. 물론 아쉬운 점이 없었던 건 아니다. 두 논객은 여전히 자기 주장을 되풀이했다. 중간 중간 상대방을 치켜세워주긴 했지만, 토론을 통한 숙의와는 거리가 멀었다. TV홍카콜라가 '무삭제 방영' 원칙을 깬 점도 다소 아쉽긴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토론 시도엔 흔쾌히 박수를 보낸다. 유튜브를 대표하는 좌우 논객인 두 사람이 '분단시대'를 이어줄 대화의 창을 열었다는 점만으로도 적지 않은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시도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꾸준히 계속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