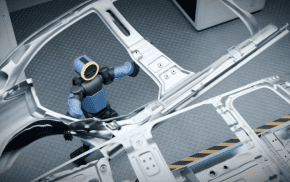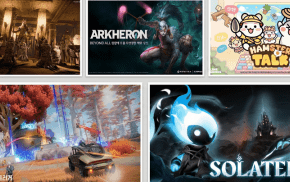‘애플 쇼크’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3일(현지시간) 뉴욕증시, 나스닥 모두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이날 애플 주가는 10% 가량 떨어졌다. 6년 만에 최대 낙폭이다.
이 모든 게 팀 쿡 최고경영자(CEO)가 투자자들에게 보낸 편지 때문이다. 쿡은 전날 12월 마감된 2019회계연도 1분기매출 전망치를 840억 달러로 낮춘다고 밝혔다. 890억~930억 달러였던 당초 예상치에 최대 90억 달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쿡은 중국 사업 부진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지난 해 하반기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훨씬 나빴다는 것. 여기에다 미중 무역분쟁까지 겹치면서 아이폰을 비롯한 애플 제품 판매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단 설명이다.
내가 주목한 건 그 다음 대목이다. 팀 쿡은 이날 편지에서 “아이폰 매출이 기대에 못 미친 것이 (매출) 예상치를 낮춘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이폰을 제외한 다른 사업 부문은 지난 해보다 19% 성장했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아이폰 부진 역시 주된 이유는 중국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팀 쿡은 “선진국 시장에서도 업그레이드가 기대에 못 미쳤다”고 설명했다.
그 이유가 재미 있다. ▲달러 강세 ▲통신사 보조금 감소와 함께 ▲배터리 수리비용 인하를 꼽았다. 잘 아는대로 애플은 배터리 성능 고의 저하 논란에 휘말리면서 2018년 한해 동안 배터리 수리비용을 대폭 낮춰졌다. 이 조치가 아이폰 업그레이드 수요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는 게 팀 쿡의 설명이었다.
물론 세 가지 요인 모두 일시적일 순 있다. 달러는 언젠가는 다시 약세로 돌아설 것이다. 그리고 배터리 수리 비용은 2019년부터는 다시 예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 배터리 교체해서라도 구형 모델 쓰려는 소비자들
그렇다면 문제가 해결된 걸까? 애플에겐 미안한 얘기지만, 그렇진 않다고 봐야 한다. 역설적으로 팀 쿡이 아이폰 업그레이드 둔화 이유로 꼽은 저 상황들이 오히려 아이폰이 성장 한계에 달했다는 걸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 동안 아이폰은 혁신 아이콘으로 통했다. 아이폰4가 나왔을 땐 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후에도 ▲4G 도입 ▲화면 크기 확대 ▲배터리 효율 극대화 ▲줌 카메라 추가 ▲생체 인증 등 다양한 혁신 요소들이 추가됐다. 이런 혁신 덕분에 소비자들은 여전히 쓸만한 구형 아이폰을 포기하고 기꺼이 추가 비용을 지출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런 요소들을 찾기 힘들어졌다. 여전히 구형 모델이 쓸만한 상황에서 굳이 지갑을 열고 새 모델을 장만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배터리 수리 비용 인하가 업그레이드에 영향을 미쳤다”는 팀 쿡의 설명은 오히려 그런 상황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됐다. 소비자들이 웬만하면 배터리를 고쳐서라도 기존 모델을 쓰려고 하고 있단 의미이기 때문이다.외신들도 이 부분을 더 크게 보고 있다. 씨넷은 ‘아이폰 피로증’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화웨이, 오포, 비보 같은 중국 업체들의 공세 역시 애플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CNBC는 애플의 아이폰 고가 전략이 오히려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반면 IT매체 더버지는 애플의 이번 경고는 스마트폰 시장에 포화 상태에 다다랐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애플 뿐 아니라 삼성전자 역시 또 다른 돌파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관련기사
- 애플, 주가 10%폭락 쇼크…시총 4위로 밀려2019.01.04
- '중국 수렁' 빠진 애플…"혁신부족도 심각"2019.01.04
- 질주하던 애플, '아이폰+중국'에 발목 잡혔다2019.01.04
- 애플, 매출 예상치 낮췄다…"아이폰 판매 부진"2019.01.04
최근 들어 삼성이 폴더블폰에 공을 들이고, 퀄컴이 5G 스마트폰용 프로세서 생산에 박차를 가하는 것 역시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란 설명도 함께 덧붙였다.
결국 애플쇼크는 역설적으로 ’혁신’ 없이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 힘들 것이란 걸 잘 보여줬다. 리코드 간판 기자인 카라 스위셔가 “애플의 진짜 문제는 혁신 실종”이라고 경고한 것도 이런 부분을 꼬집은 것으로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