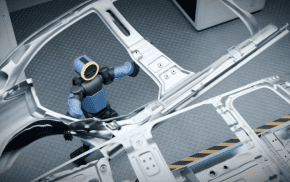이번엔 앨빈 토플러가 틀렸다. 그는 “미래는 언제나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찾아온다”는 말로 우리를 늘 긴장시켰다. 그런데 미래는 예측한 대로, 그것도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다.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WEF) 회장은 지난 1월 “기술진보로 시작한 4차 산업혁명이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거대한 물결처럼 밀려와 우리의 모든 시스템을 바꿀 것”이라고 경고했다. 석학이자 미래학자인 토플러가 설마 모를 리는 없었겠지만 지금 지구촌은 슈밥의 예측대로 4차산업혁명이 최대 화두다.
새삼 여기서 1, 2, 3차 산업혁명을 정의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또 4차는 기존과 어떻게 다른 지도 거론할 이유가 없는 듯 하다. 우리 대다수는 이미 혁명을 체감중이다. 기계 스스로 커뮤니케이션하는 사물인터넷(IoT)의 위력도 봤고, ‘알파고 아바타’처럼 앉아 있는 아자황의 모습에서 인간의 초라함(?)도 확인했다.
그래도 4차 산업혁명이란 이름은 아직도 부자연스럽다. 보통 혁명이란 단어는 사건이 전개된 후 사용된다. 후폭풍의 규모나 의미를 판단한 뒤에 붙이는 말이다. 그런 측면에서 4차산업혁명은 예외적이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견한 후 아예 혁명으로 명명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현재 지구촌의 경제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선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열망이 앞섰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지금 부터다. 그 열망을 현실화하기엔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
벌써 여기저기서 지나친 단순화의 오류가 눈에 띈다. 다보스포럼에서 나온 몇가지 개념과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가 4차 산업혁명의 전부인양 떠든다. 때 맞춰 인공지능 분야에 몇 백억을 퍼붓는 정부의 고질적인 유행병도 도지고 있다.
하지 말자는 얘기는 결코 아니다. 먼저 우리가 처한 위기의 본질이나 보유한 역량부터 보자는 얘기다. 진단이 정확해야 올바른 처방이 나오기 때문이다 .
이와 관련해 해외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미국은 클라우드산업을 중심으로 한 4차산업을 강조한다. 독일은 제조업4.0 을 역설하고 일본은 로봇을 활용한 제조기술로 부흥을 꿈꾼다. 중국역시 막강한 내수를 앞세워 제조강국 그것도 인터넷을 활용한 산업 업그레이드를 추진한다.
4차 산업혁명이란 지향점을 같지만 방법론은 제 각각 다르다. 단 이들의 공통점은 나라별로 자기들이 잘할수 있는 것들을 자국 경제 상황에 맞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4차 산업 혁명은 현 위기상황을 풀 해법이 돼야하고 가능하면 자신들의 리소스로 한다는 게 각국의 기본 전략이라는 점을 주의깊게 봐야한다.
여기에는 또 4차 산업혁명이후 새롭게 형성될 글로벌 수출시장을 겨냥한 선점의 노림수도 숨어 있다.
각국의 노림수가 이럴진대 아직도 4차산업 혁명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과 등식으로 보고 무작정 따라하자는 목소리가 커져서는 안된다. 자칫하면 또 선진국만 배불려주는 들러리가 되기 십상이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은 분명 가야할 길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 경제위기의 본질인 공급과잉, 소비침체, 성장절벽이라는 악순환을 끊을 해법의 방향은 마련한 뒤 방법론으로서 활용하고 투자해야 할 분야다. 무턱대고 목표로서 가야할 길은 아니다.
이 지점에서 필자는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은 ‘창조적 뉴딜’이 돼야 한다고 제언하고 싶다.
남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유한 강점을 토대로 위기의 본질을 직시해서 우리만의 창조적인 방법으로 풀었으면 한다는 뜻이다.
단계적 추진 해법은 말 그대로 전면적이고 혁명적이어야 한다. 4차산업혁명의 성공은 산업에 국한돼서는 담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 시스템의 부재와 규제의 덫 투성이인 정부 정책 전반을 총체적으로 바꿔야 한다. 5년후 초등학생의 65% 이상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갖게 된다는데 지금의 교육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우리나라 규제의 덫은 알파고도 이길수 있다는 농담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4차산업혁명이 뉴딜에 가까운 방식으로 칸막이 없이 총체적으로 진행돼야 하는 이유다.
문제는 강력한 리더십이 아니면 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그냥 선진국 흉내 내기로 끝낼거라면 안하는게 낫다. 다리 하나 걸치는 식으론 어림없다. 가는 방향이 맞고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해법이라면 우리도 독일의 메르켈 총리처럼 대통령이 직접 나서 4차산업혁명이 나라를 살릴 뉴딜이라고 선포하고 제대로 했으면 한다.
그렇다고 또 이것저것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여기저기 위원회나 새로운 기구 등은 만들지 말고 이미 잘 짜여진 있는 것들이 있으면 리모델링해 활용하는 것이 맞다.
창조혁신센터가 좋은 예다. 현재 클러스터 형식으로 전국에 퍼져있는 창조혁신센터는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안성맞춤이다. 혁신센터에 대기업 벤처스타트업 상생모델을 강화해 활용하는 게 새로 만들어 호들갑 떠드것보다는 효과적이다.
제발 이번 만큼은 쇼윙이 아닌 본질에 충실했으면 한다.
관련기사
- '4차산업혁명' 남 얘기 아니다2016.07.12
- 폭스콘의 로봇 대체, 4차산업혁명 신호탄?2016.07.12
- "판교를 4차 산업혁명 기지로"...‘스타트업 캠퍼스’ 개소2016.07.12
- 4차 산업혁명…"첨단업종 남녀격차 더 심화"2016.07.12
현재 우리가 직면한 위기의 본질이 뭔지,이를 타개할 해법의 본질은 뭔지를 충분히 고민했으면 한다.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이 주는 답은 ‘창조적 뉴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