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트로이트는 1990년대 미국 전통산업의 중심지였다. 포드를 필두로 GM, 크라이슬러 등 3대 자동차업체가 모두 터를 잡고 있던 곳이기 때문이다. 굳이 비유하자면 요즘 실리콘밸리와 비슷한 역할을 했다.
세계경제포럼(WEF) 창립자이자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은 ‘제4차 산업혁명’에서 디트로이트와 실리콘밸리를 수평비교했다.
1990년 디트로이트 3대 대기업의 시가 총액은 360억 달러, 매출은 2천500억 달러였다. 2014년 실리콘밸리 3대 기업의 시가 총액은 1조900억 달러로 훨씬 많았다. 매출은 2천470억 달러로 디트로이트와 비슷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다. 당시 디트로이트 3대 기업의 근로자는 120만 명이었다. 반면 실리콘밸리 3대 기업은 13만7천명 남짓한 수준이었다. 10분의 1 인력으로 같은 매출을 올리고 있단 비교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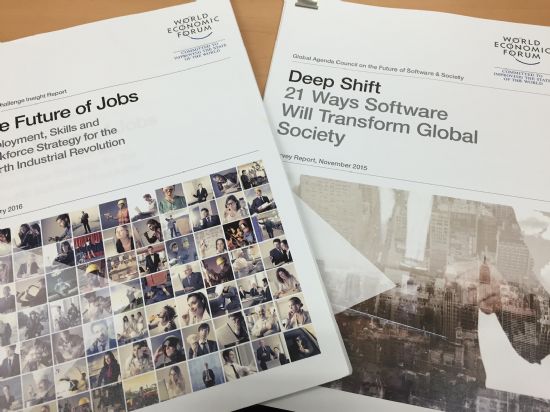
■ 폭스콘 "6만명 로봇 대체"…아디다스 "로봇 생산 투입"
어제 오늘 연이어 접한 뉴스 때문에 ‘4차산업혁명’이란 화두를 떠올리게 됐다. 아디다스와 폭스콘의 로봇 투입 소식이었다.
세계적인 스포츠용품업체 아디다스는 내년부터 아시아 지역을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본거지인 독일로 생산시설을 옮기겠단 얘기다. 1993년 운동화 생산기지를 동남아를 비롯한 저임금지역으로 이전한 지 24년 만이다.
그렇다고 독일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것도 아니다. 로봇으로 운동화를 생산할 계획이다. 미리 짜여진 알고리즘에 따라 반복생산 작업하는 것이니만큼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아이폰 조립생산업체로 유명한 폭스콘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6만명의 직원을 줄였다. 역시 줄인 직원의 자리는 로봇으로 대체했다.

그런가하면 피자 전문 체인인 피자헛에는 로봇 계산원이 등장했다.
슈밥은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문제는 대부분 공급과 관련한 노동과 생산 부분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특별할 것 없지만, 곰곰 되새기지 않을 수 없는 얘기다. 부의 불평등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란 무서운 경고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세상은 평평하다’는 저술로 유명한 토머스 프리드먼은 일찍이 “자신의 일을 아웃소싱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알고리즘화된 일에 종사할 경우엔 미래가 없다는 경고였다.
■ 상상 초월하는 변화 속도와 범위, 어떻게 대응할까
물론 격변기엔 늘 엄청난 변화가 뒤따랐다. 산업혁명 시기에도 기계파괴운동인 ‘러다이트’로 사회가 시끄러웠다. 문제는 속도와 범위다.
클라우스 슈밥의 지적처럼 4차산업혁명은 속도, 범위와 깊이, 시스템 충격 면에서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파괴력을 갖고 있다. 폭스콘과 아디다스의 움직임은 그 자그마한 단초에 불과하다.
관련기사
- "폭스콘, 직원 5만~11만명 로봇으로 대체"2016.05.26
- 인공지능 시대, 당신은 준비됐습니까2016.05.26
- IT 강자들, '인공지능(AI) 비서' 개발전쟁2016.05.26
- 제4차 산업혁명 '대변혁'..."교육·고용·복지 틀 바꾼다"2016.05.26
올초 세계경제포럼에선 나왔던 충격적인 전망을 떠올려보라. “지금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중 65%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직업에 종사할 것이다.”
이런 무서운 변화와 속도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당연한 얘기지만, 사회적 담론과 합의가 절실한 상황이다. 요즘 북유럽에서 나오는 ‘기본 소득’ 담론도 그 일환일 수 있다. 뻔한 얘기일 수 있지만, 더불어 함께 사는 방법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때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