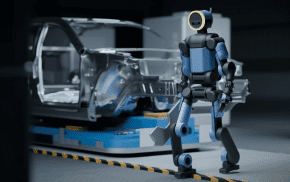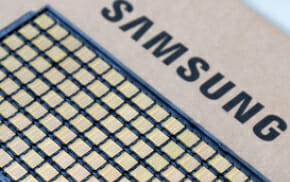"포기함으로써 좌절할 것인가, 저항함으로써 방어할 것인가, 도전함으로써 비약할 것인가."
박경리 선생의 ‘토지’ 서문 마지막 문장이다. ‘토지’를 읽을 땐 지금보다 훨씬 피가 뜨거웠나 보다. 저 문장을 접하면서 진한 감동과 부끄러움이 범벅이 된 묘한 감정에 휘말렸던 기억이 있는 걸 보면.
저 문장은 글쓰는 사람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감정 과잉’이나 과장이 아니었다. 실제로 선생은 저 세 가지 선택지를 놓고 불면의 밤을 지새야 했던 모양이다.
선생은 ‘토지’ 1부를 쓸 당시 암 수술을 받았다고 한다. 이제 막 시작한 대하소설의 긴 여정. 하지만 그 여행을 마칠 수 있을 지 확신할 수 없었던 상황. 저 서문은, 그리고 그 서문을 덧댄 불세출의 명작 ‘토지’는 이런 시련 속에서 탄생했다.

■ "대하소설 중간에 들쳐 읽는 느낌 드는 신문"
IT 기자가 '토지' 얘길해서 뜬금 없을 수도 있겠다. 물론 ‘토지’ 서문이 느닷없이 떠오른 건 아니다. 어떤 분에게 들은 얘기 때문에 ‘토지’ 서문까지 내 의식이 이어졌다. 말하자면 일종의 ‘의식의 흐름’인 셈이다.
대충 이런 얘기였다.
대학 갓 졸업한, 혹은 졸업했을 나이쯤 되는 젊은 친구가 기자들에게 특강을 했다. 그는 신문 읽길 그만둔 한 친구 얘길했다고 한다.
한 때 열정적으로 신문을 읽던 친구가 어느날 신문을 딱 끊었더라는 것. 그래서 그 이유를 물었다고 한다. 돌아온 대답은 이랬다.
“10권짜리 대하소설을 7권부터 읽는 느낌이다. 배경 지식을 충분히 알지 못하면 따라가기 어려운 매체가 신문이었다.”

전해들은 얘기라 자세한 맥락은 잘 모른다. 하지만 저 정도만으로도 어떤 얘길하려는지 짐작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다. ‘맥락’을 전해주지 못하는, 그래서 더 이상 즐거운 읽을거리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신문의 현주소를 예리하게 건드린 말이기 때문이다.
요즘 언론들이 참 힘들다. 일단 경기가 너무 안 좋다. 하지만 경기 불황이 전부라면 오히려 다행이다. 경기 풀릴 때까지 허리띠 졸라매면서 견디면 되기 때문이다. 그도 아니면 ‘위기는 기회’라며 더 적극적으로 뛰어다니거나.
지금의 문제는 겉으로 드러난 경기 때문만은 아니다. 딛고 서 있는 땅이 울렁거리고 있는 게 더 큰 문제다. 지난 2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서서히 완성된 문법의 골격이 흔들리고 있단 얘기다.
따지고 보면 ’10권 짜리 대하소설 7권부터 읽는 느낌’이란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런 변화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10권짜리 대하소설 밖에 없을 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읽었을 테다.
■ 험난한 여정을 이겨낼 불굴의 힘은?
하지만 이젠 다른 읽을거리들이 너무 많다. 게다가 그 읽을거리들은 깊이와 재미를 함께 제공해준다. 그러니 ‘고리타분한’ 전통 기사들에선 재미도, 감동도, 찾을 수 없었을 게다.
전통 언론 앞엔 ‘토지’를 쓸 당시 박경리 선생이 겪었던 시련과 비교할만한 험난한 길이 기다리고 있다. 혹자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내년보다는 후년이 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는다.
그래서일까? 끝이 보이지 않는 험난한 여정을 무사히 끝낸, 그래서 우리들에게 멋진 자산을 남겨준 선생이 새삼 존경스럽다.
난 ’토지' 서문의 마지막 문장으로 운을 뗐다. 그런데,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앞에서 소개한 건 마지막 문장은 아니다. 그 뒤에 한 문장이 더 있다. 그 문장은 이렇게 돼 있다.
관련기사
- 대도서관·도티·양띵, 기자 중엔 나올 수 없을까2016.06.02
- NYT 편집국장의 예사롭지 않은 질문2016.06.02
- 백기 든 페북 창업자…'뉴스룸'의 처참한 실패2016.06.02
- 페이스북 '주제별 보기'가 무서운 이유2016.06.02
“다만 확실한 것은 보다 험난한 길이 남아 있으리라는 예감이다. 이 밤에 나는 예감을 응시하며 빗소리를 듣는다."
난 저 문장에서 선생의 냉정한 현실 인식과 불굴의 의지를 배운다 선생의 탁월한 스토리텔링 능력과 공감 능력을 읽는다. 그 냉정과 열정, 그리고 공감 능력이 ‘도전함으로써 비약하는’ 힘의 원천이 아니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