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을 초월한 우리 소중한 가치들을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지 결정해야만 한다.”
뉴욕타임스가 제법 진지한 질문을 던졌다. 2년 전 유출된 ’혁신보고서’ 때처럼 대대적인 연구팀을 동원한 결과물은 아니다. 하지만 담겨 있는 메시지의 무게는 그 때 못지 않다.
화두를 던진 것은 딘 베케이 편집국장이었다. 베케이는 지난 2014년 5월 질 에이브럼슨에 이어 뉴욕타임스 편집국장에 임명된 인물. 당시 뉴욕타임스는 첫 여성 편집국장 후임자로 사상 첫 흑인 국장을 임명해 화제가 됐다.

■ "뭘 해야 할 지 전략적 계획 필요하다"
베케이 국장은 지난 4일(현지 시각) 편집국에 간단한 메모를 하나 보냈다. 당시 뉴욕타임스는 2015년 4분기 순익 5천200만 달러로 한 해 전에 비해 48% 증가했다고 발표한 직후였다. 특히 뉴욕타임스는 디지털 사업 호조에도 불구하고 매출(4억4천500만 달러)은 제자리 수준에 머물렀다고 강조했다.
베케이는 메모에서 디지털 부문 강세에도 불구하고 종이신문 매출 감소 충격을 계속 느끼고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담았다. 전환기인 만큼 비용 관리를 정말 정교하게 잘 해야 한다는 얘기도 빼놓지 않았다.
이런 바탕을 깔고 그가 던진 질문이 사뭇 진지했다.

“뉴욕타임스가 무엇을 해야만 할 지 전략적 계획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시간을 초월한 우리 가치를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 지도 결정해야 한다.”
베케이의 질문 중엔 전통 신문사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부분도 적지 않았다.
대표적인 것이 선택과 집중 문제였다. 종이신문에만 전적으로 의존한 편집 전략을 탈피해 ‘멀티 플랫폼 전략’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선 어떤 쪽에 방점을 찍어야 할 것이냐는 존재론적 질문이었다.
베케이는 “편집국의 종이신문과 디지털 부문, 그리고 시각 담당 인력들을 총 투입할 가치가 있는 속보는 어떤 것들인지에 대한 해답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 얘기와 함께 베케이 국장이 던진 화두는 곰곰하게 따져볼 가치가 있다. ‘강력한 데스크 시스템’을 어디까지 작동시켜야 할 것이냐는 물음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 출입처-데스크 시스템도 재점검 시사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베케이 국장은 편집국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기후 변화나 교육 문제처럼 출입 영역(coverage areas)을 뛰어넘는 광범위한 주제들을 다룰 때는 ‘강력한 데스크 시스템’이 방해가 되지는 않을까”란 질문에 대해 계속 탐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뉴욕타임스가 국제 이슈 쪽에 좀 더 무게 중심을 두는 상황에서 편집국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것이 좋을 지에 대해서도 계속 연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좀 더 근본적인 얘기도 있었다. “사람들이 우리를 읽는 방법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 그는 또 “뉴욕타임스가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한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뉴욕타임스는 왜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 지난 해 4분기 순익이 전년에 비해 48%나 늘어난 상황에서 편집국장은 왜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했을까?
게다가 뉴욕타임스는 지난 해 4분기 디지털 유료 구독자 5만3천 명을 신규 유치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덕분에 뉴욕타임스의 디지털 구독자 수는 110만 명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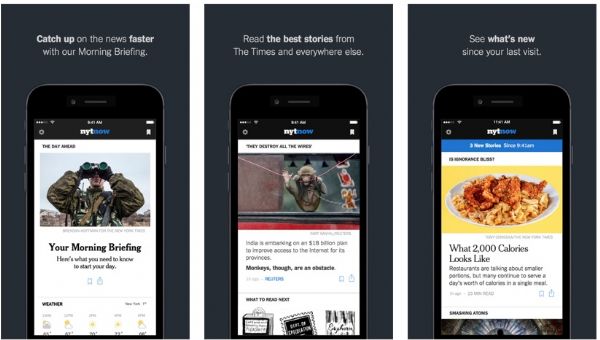
4분기 디지털 광고 매출은 7천만 달러로 11%나 증가했다. 이제 디지털 부문은 뉴욕타임스 전체 광고 매출의 3분의 1 가량을 책임지는 수준까지 입지가 커졌다.
지난 해 전체로 범위를 넓혀도 나쁘지 않았다. 연간 매출 15억8천만 달러에 순익이 6천300만 달러였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디지털 성장 속도’ 뺨치는 종이신문 광고 수익 악화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해 4분기 종이신문 광고 매출은 7% 감소했다. 이 때문에 분기 전체 광고 매출은 오히려 1년 전에 비해 1% 가량 줄었다.
■ 디지털 전환 시대 맞아 존재론적 질문 던져
편집국을 책임지고 있는 베케이 국장이 정색하고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 것도 이런 상황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쇠락하는 종이신문 사업과 성장하는 디지털 부문의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선 정말로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만 한다는 의미였다. 일부 언론 보도처럼 ‘비용 절감’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니었다. (참고로 베케이 국장은 “That means the company must continue to carefully manage its costs”라고 강조했다.)
베케이 국장의 메모가 예사롭지 않은 건 이런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그가 던진 질문 속엔 디지털 시대의 비즈니스 및 저널리즘 환경에 적응하려먼 ‘어떤 조직’이 되어야만 할 것이냐는 존재론적 성찰을 담고 있다.
실제로 베케이 국장은 “어디로 가야 할 지 명확한 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비용을) 줄이거나 늘이는 대신 우리 임무와 가치를 분명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좀 더 사려깊게 접근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질문을 던지는 자체에서 의미를 찾긴 힘들다. 질문이나 연구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 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 로봇 기사가 '사람 기자'에게 던지는 경고 메시지2016.02.06
- 백기 든 페북 창업자…'뉴스룸'의 처참한 실패2016.02.06
- '카카오 억대 연봉' 해프닝과 전자 슈터2016.02.06
- 뉴욕타임스, 구글과 손잡고 VR 콘텐츠 제공2016.02.06
하지만 질문조차 던지지 않을 경우엔 아에 발전할 가능성조차 없다. ‘익숙한 것’ ‘관행적으로 해 온 것’들만 계속 반복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과연 뉴욕타임스의 이런 질문은 어떤 ‘실행 파일’로 이어질까? ‘부자집 걱정’만큼 주제 넘은 짓은 없지만, 그래도 ‘레거시 미디어 대표주자’의 남다른 질문에 많은 관심이 쏠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