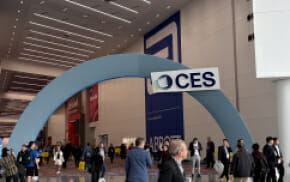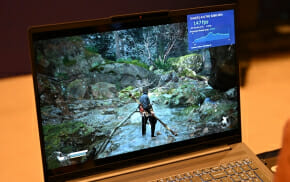탑건이란 말을 유행시킨 영화 ‘탑건’이 개봉됐다. 우주왕복선 챌린저호 폭파 사고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지금은 분할된 소련에선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폭파 사고가 터졌다.
한국에선 아시안게임이 열렸다. 지금은 잊혀진 부천서 성고문 사건과 5.3 인천사태도 그 해 우리 신문을 장식한 사건들이었다. 지금 최전성기를 맞고 있는 코리안 메이저리거 박병호 선수와 대세 배우 유아인도 그 해 태어났다.
짐작했겠지만 모두 1986년 국내외에서 벌어진 일들이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겐 엄청난 사건들. 하지만 이젠 세월과 함께 잊혀졌다. 30년은 그만큼 길다. 당연한 얘기지만, 그 사이에 기술도 많이 달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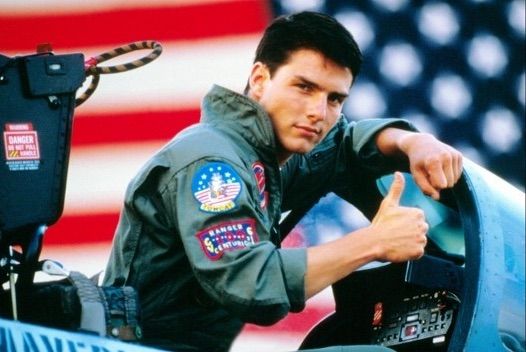
■ 1986년 제정된 ECPA, 시간 흐르면서 '디지털 악법' 전락
그 해. 미국에서 법이 하나 제정됐다. 전자커뮤니케이션프라이버시법(ECPA)으로 명명된 법. 아직 월드와이드웹과 인터넷이 제대로 대중화되기 전에 만들어진 법이었다.
ECPA는 1968년 제정된 연방도청법(FWA)을 보완한 법이었다. FWA는 유선 전화를 통한 대화를 ‘가로채는’ 것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었다. 컴퓨터나 다른 디지털, 전자 기기를 활용한 통신은 법 바깥 영역에 있었다. ECPA는 그 부분까지 법의 테두리 안에 넣기 위해 마련됐다.
1986년 제정된 ECPA는 크게 세 개 타이틀로 구성됐다.
타이틀1은 ‘도청법’으로 불렸다. 유선, 전자 및 구어 통신 내용을 무단으로 가로채는 걸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다만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한해 법원이 최대 30일간 통신 내용을 중간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영장을 발급해줄 수 있도록 했다.

타이틀2가 바로 ‘저장된 커뮤니케이션 법(Stored Communication Act)’이다. 이 부분은 서비스 제공업체 등에 파일로 저장돼 있는 내용을 열라하는 부분에 대해 규정했다.
그리고 타이틀3에선 통화한 전화번호를 계속 기록하는 장치인 펜 레지스터(pen register) 등을 규제 영역에 포함시켰다.
물론 이 법엔 예외 조항도 꽤 있다. 일단 수색영장을 받게 되면 저장기간에 관계없이 사업자에게 비음성통신 기록을 요구할 수 있었다. 판사가 영장을 발부할 땐 서비스 사업자에게 사전에 알려줄 필요도 없었다. 국가 긴급상황 때는 영장 발부 전에도 도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180일 지난 이메일' 영장없이 수색조항 쟁점
하지만 이 법의 더 큰 구멍은 다른 곳에 있었다. 제정 당시엔 별 문제가 없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독소조항으로 바뀐 것들이 적지 않았다. 대표적인 것이 이메일 같은 전자 소통 기록 압수수색 관련 내용이었다.
의회는 ECPA 제정 당시 ‘받은 지 180일 지난 이메일’은 영장 없이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이 제정되던 1986년엔 저 조항이 크게 문제될 것 없었다. 당시엔 이메일을 180일 이상 보관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이다.
잘 아는 것처럼 1986년엔 PC나 인터넷은 아무나 쓸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서류는 캐비넷에 보관했다. 압수수색이라고 하면 당연히 사무실을 뒤지는 걸 떠올리던 시절이었다. 중요한 문서나 연락 역시 이메일로 하던 때가 아니었다. 월드와이드웹과 브라우저가 등장한 건 1990년대 중반 이후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젠 이메일이나 메신저 같은 서비스는 대표적인 통신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180일이 아니라 수 십 년 지난 전자통신 기록도 그대로 서비스업체들의 서버에 보관하는 시절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기관들은 케케묵은 법을 빌미로 걸핏하면 압수수색과 도감청을 요구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를 비롯한 서비스업체들은 연일 계속되는 법 집행 요구에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합법적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론 불법이나 다름 없는 활동을 버젓이 승인하는 법 때문이었다.
미국 하원이 27일(현지 시각)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이메일 프라이버시 법(EPA)은 이런 모순을 바로잡기 위한 법이다.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뒤늦게 나마 이런 모순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엔 기꺼이 박수를 보낸다. 비록 바다 건너 남의 나라 일이긴 하지만, 인터넷 이용자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기 그지 없다.
이날 하원에서 EPA 처리를 위한 토론 때 한 의원이 했다는 말이 계속 뇌리에 맴돈다. 수잔 델빈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현행 ECPA 하에서는 서버에 있는 이메일보다는 캐비넷에 들어 있는 서류가 더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이런 자조섞인 얘기가 나오는 건 시대착오적인 법 때문이다.
■ 헌 옷 입은 디지털 법, 우린 없을까
법 집행기관이 법을 준수하는 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불법 압수수색이나 도감청을 자행하는 건 엄격하게 제재해야 한다. 하지만 그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이 있다. 기술이 발전하기 전 제정된 법을 빌미로 SNS와 클라우드 시대를 규제하는 일이다.
관련기사
- 美, '영장없는 이메일 수색' 금지법 만든다2016.04.28
- 국가와 싸우는 애플과 MS가 부러웠던 이유2016.04.28
- MS 뿔났다…"비밀수색 남용" 법무부 제소2016.04.28
- 애플 또 강수…'아이폰 백도어' 정식 제소2016.04.28
앞으로 EPA가 미국에서 공식 발효되기 위해선 상원에서도 과반수 지지를 받아야 한다. 만장일치로 지지한 하원과 달리 상원에선 만만찮은 공방이 예상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물론 상원을 통과한 뒤엔 대통령이 서명해야 법으로 공식 인정을 받는다.
무명 배우 톰 크루즈를 스타로 만들어준 영화 ‘탑건’이 개봉되던 해 제정된 전자통신 관련 법을 고치려는 미국 의원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한 쪽에선 찜찜한 느낌이 스물스물 올라온다. ECPA 못지 않게 ‘개인의 밀실’을 자주 들여다보는 우리들의 슬픈 현주소 때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