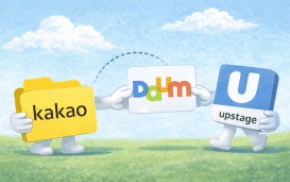실리와 명분. 사람을 움직이는 두 가지 이치다. 손해를 봐도 명분이 있으면 따른다. 명분이 없어도 큰 이득이 생기면 쫓는다. 실리와 명분을 모두 갖추면 사람의 마음을 쉽게 돌린다.
사람이 그런데 기업은 말할 나위 없다. 기업이 돈을 쓸 때는 그만한 까닭이 있어야 한다. 실리든 명분이든 원하는 것을 주어야 기업이 움직인다. '관행'이란 이유로 수억원을 쓰는 기업은 드물다.
오는 11월, '지스타 2013'이 부산 벡스코서 열린다. 지스타는 명실상부 국내 최대 게임쇼다. 지난해까지 성황리에 행사를 치렀다. 실리야 어땠는지 몰라도 기업들은 '정부가 주관하는' 게임쇼의 명분을 쫓았다. 대작 온라인 게임을 먼저 만나려는 이용자들도 많았다.
올해 지스타는 여러모로 상황이 다르다. 행사 주최가 정부에서 민간으로 실질 이양된 첫 해다. 시장 환경도 급변했다. 게임 산업의 꽃은 누가 뭐라해도 '모바일'이다. 대형 온라인 게임사들도 수익 창출 원천으로 모바일을 주목한다.
그런데 정작 모바일 게임업체들은 지스타 참가에 머뭇거린다. 모바일 게임사가 지스타에 참가해 무엇을 얻느냐는 근본적 물음 때문이다. PC방으로 대표됐던 온라인 게임과 달리, 모바일 게임은 특정한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다. 모바일 게임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한다.

이용자들이 굳이 행사장까지 찾아와서 모바일 게임을 해보려 할까요?
취재차 만난 모바일 게임사들의 중론이다. 널린게 모바일 게임. 일주일에만 수십개의 게임이 쏟아진다. 화려한 홍보 문구로 치장한 모바일 게임들이 손님 눈길 끄느라 매일 각개전투다. 이용자들은 굳이 부산까지 안가도, 각종 마켓 검색 한 번으로 매일 새 게임을 찾을 수 있다.
업체들도 모바일 게임 한두개 들고 행사에 참가하긴 어렵다. 본전은 둘째 치고, 관람객 흥미라도 끌려면 신작을 여럿 선보여야 한다. 내년 게임 라인업을 들고가야 한다는 이야긴데, 지금 같은 시장 환경서 모바일 업체들이 1년치 로드맵을 세우는 것은 의미가 없다. 트렌드는 달마다 바뀐다.
기본이 몇 억이에요. 부스만 차려요? 숙소도 마련해야 하고, 식대도 들죠. 차비, 이벤트, 홍보에 외부 인력까지…. 게임업체들이 많이 모인 판교에서만 해도 이런 부대 비용은 줄어들텐데….
부스를 차리는 비용 대비, 얻는 실리도 적다. B2C와 B2B 모두 독립 부스는 75만원, 조립 부스는 135만원이다. 중소 개발사들이 10% 할인 받을 수 있는 부스 규모는 최대 20개. 손님 맞이 공간을 고려, 20개 부스를 차린다해도 업체별로 1천500만~2천700만원이다. 텅 빈 하얀 부스를 차릴 때 드는 비용만 따져서다.
여기에 부스 인테리어, 이벤트, 홍보 물자 비용이 덧붙는다. 잘 꾸미려고 하면 개별 부스당 인테리어 비용이 수백만원이다. 멀리 부산까지 사람이 내려가니 숙소와 교통편에도 돈이 든다. 그나마 좋은 숙소는 행사 전에 모두 예약이 꽉 찬다. 작은 개발사들은 숙소 하나 구하려 부산까지 발품을 팔아야 한다.
물론 지스타 사무국인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구 게임산업협회)도 노력한다. 부스를 차리는 중소개발사에 업체당 1명 3박 숙박권과 통역을 지원한다. 사전 예약, 연속 참가, 협회 회원사 등에 각각 10%씩, 최대 30%까지 부스를 할인한다. 게임스컴 같은 해외 전시와 비교하면 부스 비용 자체가 저렴하다.
그러나 이같은 지원은 전체 비용과 비교하면 매우 적다. 올 상반기 일부 게임사를 제외한 다수 모바일 게임사들의 수익성은 저하됐다. 누군가의 말처럼, 상반기 영업익이 몇억원대에 불과한 업체들이 즐비하다. 제대로 지스타에 참가하려면 상반기 번 돈을 탈탈 털어야 한다. 지스타에 참가 안하고 이용자 마케팅을 하는 편이 낫다는 판단도 한다.
부산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도 있다. 지스타로 '게임도시'가 된 부산 지역 의원들이 올해 초 앞장서 게임 산업 규제에 나섰다. 당시 남궁 훈 위메이드 전 대표는 공개적으로 지스타 보이콧을 하자고 제안했다. 게임을 술담배와 일선에 놓고 강제 징수금을 걷으려는 지역 의원들의 생각에 상처를 입어서다.
그럼에도, 모바일 게임사들은 상당수 B2B 전시에 참여한다. 지스타 사무국에 따르면 9일 현재 약 800여 석에 이르는 B2B 부스 참가 신청이 이뤄졌다. B2C 참가율 대비 높은 성적이다. 10월, 참가사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 때까지 부스 신청도 계속 받는다. 잘만 하면 지스타 부스를 모두 판매할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이다.
관련기사
- 위기의 지스타, “비디오 게임 너마저…”2013.09.12
- 위기의 지스타, 비즈니스 행사로 전락?2013.09.12
- 게임쇼 지스타, 위상 무너지나...2013.09.12
- 게임업계 달래기…“지스타 보이콧 멈출까”2013.09.12
올해 지스타 부스를 모두 채울수는 있다. 다만, 문제는 그 이후다. 게임사들이 이미 지스타에 매력을 잃기 시작했다면, 내년 그리고 내후년의 지스타는 더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한 중소 게임 개발사는 앞서 열린 해외 전시서 수출 계약을 이뤘거나, 상시적으로 있는 미팅서 퍼블리셔를 만난 업체들이 굳이 부산까지 갈 이유가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실리든, 명분이든 지스타는 게임업체들에 무엇이든 던져야 한다. 당사자가 즐거워 하지 않는 축제는 존재 자체가 의문이다. 수억원을 내더라도 지스타에 가면 얻을 그 무엇이 있던가, 아니면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던가, 그도저도 아니면 모바일 게임이 이용자와 한 공간에서 만나서 즐길 수 있는 마케팅 아이디어를 갖던가. 지스타가 사랑받는 축제가 되기 위해 풀어야할 숙제는 산더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