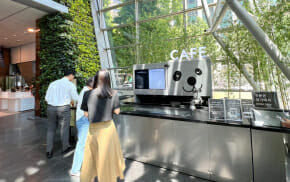LG전자 스마트폰이 전 세계 3등이 됐다. 판매량과 매출액 모두 명실상부 확고한 3등이다.
1등 지상주의 우리나라에서 3등이 큰 자랑은 아니지만 치열한 전 세계 스마트폰 경쟁 상황을 감안하면 대단히 놀라운 성적이다. 그도 그럴 것이 LG전자는 불과 3년 전인 2010년 1분기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휴대폰 부문에서 7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스마트폰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무시하고 경영적 오판을 내린 뼈아픈 결과다.
LG전자가 제친 것은 HTC, 노키아, 모토로라, 소니에릭슨 등 쟁쟁한 상대들이다. 불과 2009년에도 노키아, 삼성전자 양강구도에서 3위를 차지했다. 4년 만에 제자리를 찾은 셈이다.

확고한 1등과 2등이 있는 시장에서 3등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3등을 해야 2등을 노릴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여전히 LG전자가 애플이나 삼성전자와 대등한 경쟁을 하기까지는 몇 번의 변곡점과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이처럼 LG전자가 단 시간 내에 실수를 만회할 수 있었던 저력은 무엇이었을까. LG전자 스마트폰의 지난 3년을 되짚어봤다.
■그룹 차원의 전사적 기술지원 ‘적중’
LG전자가 스마트폰에 대한 제대로 된 개념을 잡은 시점은 HTC나 소니 에릭슨 보다 늦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만회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다름 아닌 막강한 기술을 지닌 LG 계열사다.
특히 LG디스플레이와 LG화학의 역할이 컸다. 수많은 버그와 오류로 악명이 높았던 옵티머스Q를 시작으로 형편없는 디자인과 UX를 가진 초창기 LG전자 스마트폰이 내세울 것은 밝고 선명한 화면 뿐이었다.
또한 LG전자 스마트폰은 동급 제품 중 가장 넉넉한 배터리를 제공한다. 비교적 최근 제품인 옵티머스G의 최고 경쟁력은 배터리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다. 두께가 얇고 가벼울 뿐 아니라 고밀도 기술로 전력량을 향상 시켰다. 이 모든 것이 2차 전지분야 세계 1위인 LG화학의 기술력 덕분이라는 평가다.

비록 삼성전자처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나 메모리를 직접 생산하지는 못했지만 다른 주요 부품에서 수직계열화를 이뤘다는 점이 다른 경쟁사와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게 된 원동력이 됐다.
여기에 퀄컴, 엔비디아 등 AP업체와 안드로이드OS를 만드는 구글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제품 완성도가 한층 업그레이드 됐다. 엔비디아와 협업을 통해 듀얼코어 스마트폰을 세계 최초로 출시했으며, 퀄컴의 최신 스냅드래곤을 탑재한 제품 역시 매번 경쟁사보다 한발 빠르게 선보였다.
LG전자 자체의 연구개발 노력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LG전자 한 관계자는 “휴대폰 부문 7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도, 스마트폰 R&D 예산을 한 번도 줄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 제품 오류는 확연하게 줄었으며 UX는 좀 더 세련되고 편리해졌다.
특히 LTE로 넘어오면서 LG전자는 그야말로 날개를 단다. LTE 기술 만큼은 자신 있었기 때문이다. LG전자는 미국 투자은행 제프리스앤드코가 선정한 가치있는 LTE 특허 1천400개 중 23%를 보유해 1위에 올랐다. LG전자 스마트폰이 이제 좀 쓸만하다는 평가를 받은 첫 제품도 ‘옵티머스 LTE’다.
■확 바뀐 조직문화...오너 경영의 힘
이 모든 것은 시점상 구본준 LG전자 부회장 취임 후 이뤄졌다. 한 명의 유능한 경영자가 회사를 살릴 수도 있고 망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공(功)이 경영자에게 돌아가서는 안된다. LG전자 임직원들의 땀과 노력이 먼저 평가 받아야 한다.
다만 구 부회장이 그룹 오너 일가라는 점에서 좀 더 계열사의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졌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또한 그가 오면서 바뀐 한 가지가 있다. 바로 조직문화다.
한 LG전자 전직 임원은 “LG전자는 백색 가전으로 성장한 기업인 만큼 정보통신 쪽 인력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경향이 있다”며 “한때 직원들은 휴대폰을 만드는 MC(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사업본부로 가는 것을 좌천으로 여기기도 했다”고 말했다.

구 부회장은 휴대폰 사업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이 같은 조직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수 차례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상징적으로 7분기 연속 적자 속에서도 박종석 MC사업본부장을 끝내 믿고 유임시켰다. 또한 회사 내 유능한 인재들을 MC사업본부로 배치하도록 지시했다는 후문이다.
무엇보다 지속적인 적자 속에서도 투자를 줄이지 않을 수 있었던 것 역시 오너 경영 체제에서 가능한 부분이다. 단적인 예로 소니, 모토로라, 노키아, HTC 등은 모두 대규모 감원을 피해갈 수 없었다. LG전자 역시 구조조정에 대한 이야기는 끊임없이 흘러나왔지만 자연 감소분이나 희망 이직을 제외한 인위적인 대규모 감원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스마트폰 연간 1억대, 두 자릿수 점유율 ‘과제’
올해 2분기 LG전자 스마트폰 판매량은 1천210만대로 지난 분기 1천30만대를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 같은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 스마트폰 5천만대 돌파도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다.
무엇보다 전체 휴대폰 판매에서 스마트폰 비중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지난해 1분기 LG전자 휴대폰 중 스마트폰 비중은 36%에 불과했다. 그러던 것이 올해 2분기는 무려 68%까지 늘었다.
휴대폰은 이동통신사를 통해 판매하는 특수한 유통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와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관계는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LG전자는 전 세계를 상대로 오랜 휴대폰 사업을 통해 이 같은 영업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발 빠른 전환이 가능했다는 평가다.

LG전자 2분기 스마트폰 전체 판매량 1천210만대 중 약 10% 가량은 국내서 판매됐다. 나머지 90%가 전 세계 수출됐으며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가 바로 미국이다. LG전자의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증권가에 따르면 LG전자 수출 비중은 미국이 30%,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20%, 중남미 지역이 20%, 나머지 10% 정도로 추산된다. 대체적으로 전 세계 고루 퍼져있다는 이야기다.
다만 극복해야 할 과제도 분명하다. 낮은 영업이익률이다. LG전자 MC사업본부의 2분기 영업이익은 612억원, 영업이익률은 2%로 매우 저조하다. 간단히 말하면 100만원짜리 핸드폰 하나 팔아서 2만원 남긴다는 이야기다.
관련기사
- [LG전자 IR]中 스마트폰 맞설 전략은..2013.07.26
- LG전자 "전략폰 'G2' 내달 국내 출시"2013.07.26
- LG전자, 2Q 영업익 4천793억 전년比 9%↓2013.07.26
- LG전자, 내달 7일 뉴욕서 ‘G2’ 공개2013.07.26
같은 스마트폰을 팔아서 애플은 30%대의 이익률을 올리는데 반해 LG전자는 2%밖에 남기지 못하는 데는 이유는 마케팅 비용을 투입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완전한 프리미엄폰 전략은 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아직까지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점도 한 몫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LG전자가 스마트폰 이익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간 1억대, 더 나아가 시장점유율을 두 자릿수 까지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