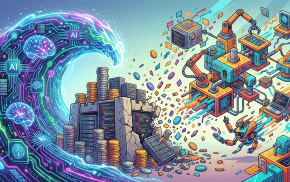고가 스마트폰이 비싼 통신비의 주범으로 지목된 후 최근 제조업체들이 내놓은 고육지책이 역효과를 낳고 있다. 가격을 낮춘 스마트폰이 정작 유통시장에선 환영받지 못하는 현실 때문이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통신비 규제 정책, 스마트폰 시장 경쟁 심화 등으로 출고가를 둘러싼 제조업체들의 눈치 싸움이 격화되고 있다. 상황 타개를 위해 출고가를 낮춰 잡아도, '보조금을 많이 준' 스마트폰에 수요가 집중되는 웃지못할 상황이 발생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국내 첫 풀HD폰으로 주목받은 팬택 베가넘버6 풀HD다. 지난 달 84만9천원에 출시됐다. 신작 스마트폰으로는 이례적으로 80만원대에 출고가를 책정해 높은 주목을 받았다.
팬택은 베가넘버6 풀HD의 출고가를 밝히며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제품 발표 당시 이준우 팬택 부사장은 합리적인 가격을 강조하며 전작의 판매량인 90만대를 뛰어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100만대 판매를 자신했다.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베가넘버6의 하루 평균 개통량은 3천대 수준으로 알려졌다. 경쟁작인 LG 옵티머스G 프로가 출시되고난 후에는 이마저도 힘에 부치는 모습을 보였다.

옵티머스G 프로의 출고가는 96만8천원. 베가넘버6와 비교하면 12만원이나 더 비싸다. 구작인 갤럭시노트2는 출고가가 109만원이나 했지만 하루 1만대 이상 판매를 유지하고 있다.
비슷한 사양이라면 소비자들의 손은 더 저렴한 제품에 가는게 시장 논리다. 그런데 휴대폰 시장은 이상하게도 그렇지 않다. 일반 제품과 달리 휴대폰 출고가에는 제조원가와 영업이익(마진) 외에, '장려금'이란 항목이 붙어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휴대폰 판매점에서 보조금을 얹어 깎아 주겠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이 장려금이다. 이 장려금이 지나치게 많아 깎아줄 것을 대비해 휴대폰 출고가를 높여 잡는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질수록 장려금으로 운용할 '총알'이 많아진다. 판매자가 가격을 조절할 수 있는 휴대폰이 일선 판매점에선 인기가 높은 것은 당연하다.
한 휴대폰 판매점 관계자는 제품 선호도별로 판매량에 차이는 있을 수 있다면서도 비싼 휴대폰에는 그만큼 보조금이 많이 붙어, 시장 유통 라인에서 리베이트가 많은 쪽으로 제품을 돌리는 영향도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휴대폰 제조업체가 이동통신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B2B 사업자라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이동통신 대리점이나 휴대폰 판매점을 통해 스마트폰을 산다. 삼성전자나 LG전자에서 휴대폰을 직접 구입하지는 않는다. 판매점에서 어떤 제품을 추천하는지, 어느 제품의 가격을 더 깎아주는지가 판매량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한 제조업체 임원은 휴대폰을 값싸게 내놔도 판매점에서 보조금을 더 줘 결국 실제 판매가는 같게 만든다며 90만원짜리 휴대폰을 10만원 깎아 줄 때와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20만원 깎아 줄 때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비용은 80만원으로 동일해도 보통 후자를 택한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휴대폰 출고가에도 이동통신사가 영향을 미친다. 제조업체들은 통상 신제품을 발표하고 난 후 출시 직전까지 가격을 비밀에 부친다. 통신사와 협의중이란 말을 수 차례 반복한다. 출고가 자체에 장려금이 포함돼 있으니 통신사 입김을 무시할 수 없다.
관련기사
- [갤S4 공개]풀HD 스마트폰 3종 스펙 비교2013.03.27
- "우리가 보조금 주도?" SKT-KT “억울”2013.03.27
- 이통시장, 하루만에 보조금 사라진 '빙하기'2013.03.27
- “과다 보조금”…청와대 칼 빼든 이유2013.03.27
또 다른 제조업체의 임원은 사람들은 삼성이나 LG같은 제조업체들이 스마트폰 가격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줄 아는데 오산이다라며 실제 출고가는 이동통신사와 협의하고 있고, (통신사 의견이) 반영된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통신비 논란의 화살이 제조업체에만 쏠리는 것 같아 억울하다며 통신사들의 힘이 아직 더 센 상황에서 제조업체들이 직접 휴대폰을 유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뚜렷한 방도를 찾기 힘들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