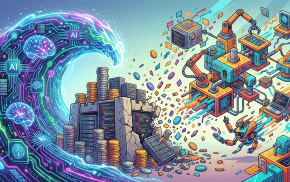네이버 ‘뉴스스탠드’ 전환에 대한 국내 미디어 업계의 기대와 우려가 연일 교차되고 있다. 하지만 신문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급격히 낮아지고 뉴스 소비 패러다임이 모바일로 이동하는 추세에서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작년 8월23일~10월5일 전국 18세 이상 국민 5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최근 발표한 ‘2012 언론수용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4.7%가 인터넷에서 본 뉴스가 어느 언론사가 작성해 제공한 것인지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거의 다 알고 있다’는 응답은 6.3%에 그쳤다.
인터넷 뉴스의 이용 방법(복수 응답)으로는 ‘포털사이트 메인페이지의 뉴스 제목을 보고 클릭해서’라는 답이 87.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또 ‘실시간 검색순위에 오른 인물이나 사건을 찾아서’라는 답은 57.3%나 됐지만 ‘포털 뉴스란에서 특정 언론사 뉴스를 찾아서(16.1%)’, ‘처음부터 기존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가서(14.6%)’ 등 적극적으로 언론사를 선택해 기사를 보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네이버 뉴스캐스트의 영향이 크다. NHN이 지난 2009년 1월 1일부터 시작한 뉴스캐스트는 네이버에서 뉴스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사이트로 바로 넘어가는 구조를 취했다. 이는 언론사에 트래픽을 안겨주고 네이버를 우월적 편집권 행사를 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게 해줬다.
트래픽의 달콤함에 취한 닷컴사들은 매일 자사 뉴스를 포털에 넘겨줬다. 포털은 이를 사들여 공짜로 인터넷에 뿌렸다. 독자들은 신문에서 인터넷으로 급격하게 눈을 돌렸다. ‘모든 뉴스는 포털에 가면 볼 수 있다’는 새로운 뉴스 소비 방식에 길들여지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곧 기존의 저널리즘을 위협하는 결과를 냈다. ‘뉴스는 무료’라는 인식을 고착화시키면서 구독료를 내고 종이신문을 볼 이유를 무색하게 만든 것이다.
성동규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뉴스캐스트가 뉴스공급자에게 뉴스편집권의 독립, 트래픽에 따른 광고 수입 증가 등 여러 이점을 가져다준 것은 사실이나 유통력 면에서 포털이 신문사보다 커져버리면서 오히려 언론사들의 포털 종속성을 심화시켰다”고 말했다. 포털의 뉴스파워는 점점 강해지면서 기존 매체의 브랜드파워는 떨어졌단 지적이다.

네이버 뉴스캐스트는 언론사들의 트래픽 확보를 위한 과다 출혈 경쟁이라는 병폐를 낳았다. 언론사들은 네이버 뉴스캐스트로부터 유입되는 페이지뷰를 늘리기 위해 ‘충격’ ‘경악’ ‘헉!’ 등 자극적인 기사 제목을 내걸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독자들의 피로감이 쌓이면서 문제제기가 계속되자 NHN은 뉴스캐스트에 과감히 칼질을 감행한다. 새해 1월 1일부터 시작된 뉴스스탠드가 이 실험의 결과물이다. 뉴스스탠드는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독자가 보고 싶은 언론사를 ‘마이뉴스’로 설정해 구독하는 것이 골자기 때문이다.
NHN이 마이뉴스 설정건수로 뉴스스탠드 첫 화면에 무작위 노출되는 기본형 언론사의 진입과 퇴출을 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언론사들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한 언론사 관계자는 “언론사 간부들 사이에는 (마이뉴스 설정건수를 위해) 불법 아이디를 중국서 사오거나 PC방에 로비를 벌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우스개소리가 오고 가기도 한다”고 전했다. 현재 독자들을 상대로 전사적인 마이뉴스 설정 독려 캠페인이나 이벤트를 벌이는 매체도 있다.
관련기사
- 카톡 어쩌나...네이버, 무료 웹소설 플랫폼2013.01.12
- 김상헌 NHN, 차기 인기협회장 내정2013.01.12
- [단독]네이버, 구글 앞선 신기술 선봬2013.01.12
- 네이버 뉴스캐스트 “변화는 이것부터...”2013.01.12
NHN측은 “사용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하지만 형식적인 선택권에 우선하다 보니 실제 독자들의 구독권은 제대로 배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택할 수 있는 언론사는 52개로 한정돼 있을 뿐 아니라 언론사 제호를 클릭하고 뷰어를 실행시켜 뉴스를 고르는 방식 자체가 뉴스 소비에 적극적인 이들에게도 꽤나 번거롭다는 평가다.
사용자들의 뉴스 소비 경로가 모바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도 뉴스스탠드의 파급효과에 의문을 던지게 한다. 성 교수는 “뉴스 소비 형태가 모바일 스마트폰 미디어로 넘어가는 중”이라며 “모바일 뉴스캐스트는 여전히 언론사를 줄세우기 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