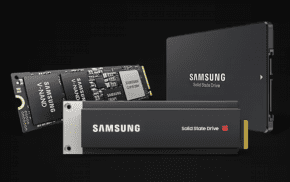오라클이 결국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MS)와 정면대결에 나섰다. 수년간 부정하고 거부해온 퍼블릭 클라우드에 ‘서비스로서의 인프라(IaaS)’도 제공하게 됐다.
래리 엘리슨 오라클 CEO는 1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오픈월드2012’ 첫날 기조연설에서 “오라클 클라우드가 IaaS, PaaS, SaaS 등 3개 계층 모두를 제공하게 됐다”라고 발표했다.

그는 오라클 클라우드 전략을 소개하며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판매 사업에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새 사업 영역을 추가하고 있다”라며 클라우드 사업 본격화를 선언했다. 지난해 출시된 오라클 클라우드는 퓨전 미들웨어 기반의 'PaaS'와 퓨전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SaaS'로 구성돼 있었다. 올해 가상서버와 가상 스토리지를 제공하는 'IaaS'를 출시한 것이다.
지난 2008년 엘리슨 CEO는 클라우드 컴퓨팅 트렌드에 업계가 '완전히 횡설수설'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미친 얘기'인데 언제쯤 '이런 얼빠진 짓'을 그만둘 거냐고 비아냥 거렸다.
오라클 클라우드 사용자는 서버와 스토리지 인프라를 사용한 용량에 따라 비용을 내면 된다.
그는 “단순한 애플리케이션이나 플랫폼 제공은 불충분하다고 여겼고, 고객들이 IaaS를 요구했다”라며 “오라클 엔지니어드 시스템에 기반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컴퓨터를 판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WS나 MS 애저, 구글 컴퓨트엔진 등과 똑같은 콘셉트의 IaaS지만 오라클의 퍼블릭 클라우드 전략은 근본적인 차이점을 갖고 있다. 이는 래리 엘리슨 CEO에서 오라클 클라우드가 엔지니어드 시스템에 기반한 것이라고 누차 강조하는 모습에서 찾을 수 있다.
AWS나 MS, 구글 등의 인터넷 서비스 회사들은 퍼블릭 클라우드를 구축하는데 저가의 하드웨어와 오픈소스 SW를 사용해 비용을 절감하고, 서비스 요금을 인하한다. 결과적으로 이들 서비스는 저가 인프라에서 돌아가는 저렴한 IT자원으로 통하고 있다.
반면 오라클은 ‘엑사데이터’, ‘엑사로직’, ‘데이터베이스 어플라이언스’ 등 고가의 엔지니어드 시스템을 사용한 클라우드란 점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최고급 사양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으로 이른바 ‘명품전략’이다. 외신들은 “오라클이 ‘대성당’이란 콘셉트를 들고 나왔으며, AWS나 MS 애저는 ‘슬럼’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명품 전략은 오라클의 노림수가 IaaS 자체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라클 클라우드는 사실상 이 회사의 SW와 하드웨어, 그리고 엔지니어드 시스템과 서비스 기술력을 강조하기 위한 일종의 레퍼런스 역할을 한다.
오라클은 엔지니어드 시스템에 기반해 고객사에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해주고, 별도로 오라클 소유의 데이터센터에 연결시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프라도 고객사에 있지만, 임대형식으로 과금하는 형태다. 기존 하드웨어, SW 유지보수 개념을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에도 적용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퍼블릭 클라우드든 프라이빗 클라우드든 이 회사의 IaaS는 고객에게 엑사시리즈를 사용하게 한다는 목표를 향한다.
관련기사
- 오라클 "전혀 새로운 DB를 발명했다"2012.10.02
- 오라클, 3세대 엑사데이터 'SAP 뭉개기'2012.10.02
- 오라클 "IBM·MS 잡았고 이제 테라데이타"2012.10.02
- 'HW부터 달라…' 오라클, IaaS 차별화 전략2012.10.02
오라클과 가장 유사한 전략을 사용하는 회사는 HP다. HP는 오픈소스인 오픈스택을 이용해 ‘HP 클라우드’를 제공하고 있다. HP 역시 자사의 퍼블릭 클라우드와 HP의 하드웨어를 연동에 따른 성능 극대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공급을 통한 유지보수 매출을 노린다.
클라우드 컴퓨팅과 하드웨어 사업은 양날의 검으로 통한다. 오라클은 이를 교묘히 이용해 클라우드 사업을 하드웨어 사업을 위한 지렛대로 변화시키려 시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