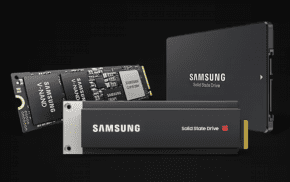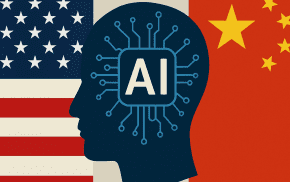제4이통사 출범이 문턱에서 또 주저앉고 말았다.
1·2차 때와 달리 2개 컨소시엄이 이동통신 사업에 도전장을 냈지만 진입장벽을 넘는데 실패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와이브로 기간통신사업 허가 심사’에서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컨소시엄 모두 탈락했다고 밝혔다.
석제범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획득해야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되는데 KMI는 65.790점, IST는 63.925점으로 미달했다”며 “KMI는 자금 조달 계획 부족, IST는 심사기간 중 주요주주의 변경으로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KMI와 IST 모두 와이브로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미흡하다”며 “ 때문에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12월 중 허가 심사 결과를 통보하겠다”고 밝혔다.■재정 능력, 또 ‘발목’…해결 방안은?
앞서 2차례의 심사 탈락이라는 고배를 마셨던 KMI와 IST 컨소시엄 모두 재정 능력이 또 다시 발목을 잡았다.
25점 만점의 재정 능력 평가에서 KMI는 16.806점, IST는 15.123점을 획득했다. 2개 컨소시엄의 미달 점수가 각각 4.21점과 6.075점이란 점을 감안하면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셈이다.
실제, 심사위원단은 “KMI의 경우 참여 주주들의 과도한 출자 약속과 자금 조달 계획 부족을, IST는 주요주주의 변경으로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어렵고 지나치게 시장을 낙관적으로 분석해 안정적 사업운영에 약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IST의 경우 와이브로 어드밴스트(Advanced) 기술인 802.16m에 대한 표준화 및 제조사의 일정 등을 고려하지 않아 내년 10월까지 상용서비스 개시가 실현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는 2차례의 허가 심사 경험을 갖고 있는 KMI와 달리 짧은 시간에 사업계획서를 마련한 IST가 KMI를 의식해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그랜드 컨소시엄이 답이다
업계에서는 2개 컨소시엄이 모두 탈락한 이유를 상대 컨소시엄에 대한 ‘네거티브 전략’으로 꼽고 있다.
수조원대의 천문학적 투자가 필요한 기간통신사업에 중소기업 위주의 컨소시엄을 꾸린 KMI와 IST가 협력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KMI에 몸 담았던 양승택 전 정보통신부장관의 IST행(行)으로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방통위가 2개 컨소시엄 중 고득점을 한 측에 주파수를 할당한다고 발표한 것이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상황을 만들었다.
상대적으로 사업계획 마련의 노하우를 가진 KMI와 중소기업들의 자금을 엮어낸 IST가 동반자 관계로 뭉쳤다면 4~6점차의 안타까운 탈락은 면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여기에 통신망 활용과 기술개발 측면에서도 KMI의 드림라인과 IST의 세종텔레콤이 합쳤다면 조금 더 양호한 사업계획 마련이 가능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4G로 일컬어지는 광대역 모바일 인터넷 시장이,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 중 50분의 1인 100만명에 불과한 초기시장인 만큼 아직까지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기사
- 제4이통사 또 불발, 이유는?2011.12.16
- [긴급]제4이통 끝내 불발…지원자 모두 탈락2011.12.16
- [긴급]현대, '제4이통 철수 번복' 재번복2011.12.16
- 현대 빠진 ‘제4이통 IST’ 심사 뭐가 달라지나?2011.12.16
특히 제4이통사의 출범이 끝내 불발될 경우 우리나라 순수 기술로 개발한 와이브로가 LTE(Long Term Evolution)에 묻혀 사장될 수 있다는 우려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갈등이 불거진 컨소시엄 이라면 주요인사가 대승적 차원에서 한 발 물러날 것은 물러나 파괴적 혁신을 시도해야 할 때”라며 “지금은 한국 통신산업의 미래를 생각할 시점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