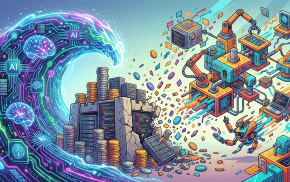애플은 원래 개인용 컴퓨터(PC)를 만드는 회사다. 요즘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와 같은 통신 제품이 대표 상품이 됐지만 매킨토시로 대변되는 애플은 축적된 PC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기업이다.
그 중에서도 맥북에어는 집약된 애플 PC기술의 결정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볍고 튼튼하면서 빠르고 오래간다. 요즘에는 애플이 가격 정책에 있어서도 매우 합리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아이폰 열풍 만큼이나 애플의 PC 제품에 열광하는 사람이 크게 늘고 있다.
심지어 애플에게는 매우 불리한 우리나라 IT환경에서도 맥북에어는 날개돋힌 듯 팔리고 있다.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해 윈도우를 설치해 사용하는 불편함도 기꺼이 감수하면서 말이다.
불과 수년전만 하더라도 PC 사용자들은 3kg이 넘는 무거운 노트북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무게가 조금이라도 가볍게 설계되면 가격은 무섭도록 올라갔다. 그러다가 넷북을 통해 가벼워도 얼마든지 저렴한 노트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욕심은 끝이 없었고 급기야 얇고 가벼우면서 충분한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을 가진 제품을 찾기 시작했다.
초창기 맥북에어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했다. 가격을 제외하면 말이다. 그러다가 인텔 코어2듀오를 장착한 3세대 제품부터 가격을 100만원 초중반대까지 대폭 낮췄다. 이후 4세대에서는 최신 2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를 장착하고도 오히려 가격을 소폭 내리는 과감함 마저 보인다.

이러한 맥북에어의 등장은 윈도우를 중심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다른 PC 제조사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한마디로 맥북에어의 대항마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 가운데 인텔은 울트라북이라는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차츰 선보일 예정인 울트라북이 과연 맥북 에어의 대항마가 될 수 있을지 전 세계 PC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아무나 울트라북이 될 수 있었다면...
성능은 가격에 비례하고 무게와 구동시간에 반비례한다는 것이 노트북 업계의 오랜 상식이다.
울트라북은 이러한 상식에 정면으로 반박한다. 기술적인 진보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2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 샌디브릿지와 차세대 코어 프로세서인 아이비브릿지가 탑재될 예정인 울트라북은 일반 노트북과 비교해 결코 뒤지지 않는 성능을 자랑한다. 뿐만 아니라 울트라북에는 엄격한 기준이 존재한다.
우선 두께가 0.8인치(2.032cm)를 넘으면 안 된다. 두께를 이 정도로 줄이기 위해서는 별도 외장형 그래픽카드 장착이 거의 불가능하다. 2.5인치 하드디스크드라이브는 물론 CPU 쿨러 조차 두께를 줄이는데 방해가 된다.

때문에 CPU의 저전력, 저발열 구동이 필수적이다. 또한 별도의 그래픽카드가 없어도 CPU에 내장된 그래픽 처리 성능이 우수해야 한다. 하드디스크드라이브는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로 대체할 경우 해결이 가능하다.
두 번째는 대기상태에서 빠른 화면 전환이 가능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인텔은 AOAC(Always On, Always Connect)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이는 노트북의 강력한 경쟁 상대로 부상한 태블릿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기존 노트북을 보면 불과 수십 초밖에 되지 않는 작은 기다림이지만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에 익숙한 사용자들에게는 큰 불편함이 될 수 있다.
가령 기존 노트북 사용자는 아주 간단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십 초의 부팅시간을 기다려야 했지만 울트라북은 화면을 닫아두었다가 열 경우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마치 스마트폰의 화면을 켜는 것과 같다.
세 번째 울트라북은 별도의 전원 공급 없이도 최소 5, 8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 역시 태블릿과의 경쟁에서 결코 뒤쳐지지 않아야 한다는 인텔의 의지가 엿보인다. 현재 넷북을 제외한 대부분 휴대성을 강조한 노트북의 배터리 구동 시간은 3시간 전후다. 맥북에어 조차 11인치 제품의 경우 3시간 가량 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넉넉한 용량을 가진 배터리를 사용하면 된다. 문제는 두께와 무게다. 결국 밥을 많이 못 준다면 밥을 덜먹고도 일할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하다. 인텔이 울트라북을 내놓은 것도 이러한 저전력 기술에 자신감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마지막 조건은 제품을 분실할 경우에 대비해 충분한 보안기능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트북은 태블릿에 비해 콘텐츠 생산 및 각종 개인정보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사용자가 아예 비밀번호를 걸어놓지 않았다면 방법이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강력한 보안을 통해 자료를 보호해야 한다.
이렇듯 인텔이 다소 가혹한 조건을 내걸고 있지만 기술적으로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다. 삼성전자의 시리즈9이나 소니의 바이오Z 등 이미 시장에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제품이 출시돼 있는 상태다.
■1천달러의 꿈, 기술 진보로 가능
결국 문제는 가격이다. 앞서 예를 든 제품들의 가격은 200만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심지어 소니의 신형 바이오Z의 출고가는 300만원 중반대다. 일반 소비자들이 구입하기에는 너무 비싼 가격이 아닐 수 없다.
공식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인텔이 제시한 기준은 1천달러(한화 약 108만원)로 알려져 있다. 이는 현재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평균 가격과 동일하다. 애플의 맥북에어 최저가가 999달러라는 점도 이러한 가격 정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가격이 중요한 이유는 울트라북이 경쟁해야 할 상대가 맥북에어 뿐만 아니라 태블릿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부분 태블릿의 가격은 600-700달러 수준으로 형성돼 있다. 이와 직접적으로 경쟁하기 위해서는 더 나은 기능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두 배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다.
인텔은 이를 위해 최소 3억달러(한화 약 3천246억원) 규모의 기금을 마련하고 이를 울트라북 제조사들에게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울트라북은 확실히 급변하는 IT환경에서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노트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결국 관전 포인트는 과연 이러한 꿈의 노트북이 소비자들이 수긍할만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나올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기술의 진보는 이를 충분히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 역사적 사례를 통해 증명됐다. CPU는 그 자체로 충분한 성능을 발휘하고 있으며 SSD, 디스플레이 등 각종 부품의 가격은 계속 내려가는 추세다.
관련기사
- 인텔 "울트라북, 2013년 해즈웰로 완성"2011.09.23
- 인텔 울트라북 전격공개...3D칩·두께 17mm2011.09.23
- 인텔 비전 제시…울트라북 초점2011.09.23
- [IFA2011]삼성전자 울트라북이 기대되는 까닭은?2011.09.23
스티브 잡스 애플 CEO는 과거 태블릿은 승용차, PC를 트럭에 비유했다. 승용차와 트럭 모두 이동 수단이라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결국 많은 사람들은 승차감이 좋고 운전이 편한 승용차를 선호할 것이라는 메시지가 깔렸다.
물론 현재 사람들은 이동수단으로 승용차를 선호한다. 단순히 출퇴근을 하기 위해 트럭을 구입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트럭이 승용차 못지 않게 좋은 승차감과 뛰어난 외관을 가지고 있다면 상황은 180도 달라진다. 마치 SUV처럼 말이다. 울트라북이 기대 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