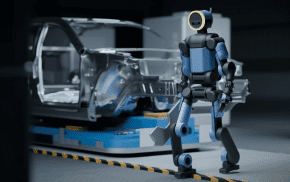월드컵 3D 열풍에 3D 방송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정부와 국회가 3D 산업 부흥을 외치고, 국내 가전업체도 3D TV를 외치고 있다. 세계 최초의 지상파 3D 실험방송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지상파 3D 실험방송은 국내 지상파 방송사의 3D 기술과 정부정책이 엇박자를 내며 시작부터 주춤하고 있다. 설비, 기술, 인력 등 모든 부분에서 한계를 드러낸다. 방송통신위원회의 3D 활성화 정책이 성공하기까지 갈 길이 멀다.
방통위가 국내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성과내기에만 집중한다는 불만이 서서히 제기되고 있다. 규제기관 눈치보기로 적극적인 입장표명도 힘들어 업계의 고민만 커지는 상황이다.
■'지상파 3D 실험방송' 준비 덜 됐다
방통위와 지상파 4사(KBS, MBC, SBS, EBS)는 지난달부터 지상파 3D 실험방송을 시작했다. 66번 채널을 통해 남아공 월드컵을 비롯, 각 방송사의 드라마, 다큐멘터리,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등을 방송한다.
하지만 3D 방송에 대한 반응은 미지근하다. 무엇보다 월드컵이라는 킬러 콘텐츠를 3D로 방송하고 있음에도 그렇다.
당초 방통위는 월드컵을 3D로 방송하면서 국민들의 주목을 끌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지상파 직접 수신 세대, 수도권 거주, 3D TV 보유 등 여러 조건이 붙는 실험방송을 실제로 본 가구는 얼마 되지 않는다.
국내 3D TV 보급대수는 3만대 정도다. 판매량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많다고 보기 어렵다. 셋톱박스를 보유할 경우 3D 시청이 가능하지만 시중에서 3D지원 셋톱박스를 구하기는 더 힘들다.
전국적으로 지상파 방송 직접 수신 세대는 20% 안팎이다. 80%가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을 이용한다. 케이블TV의 3D 방송은 몇몇 SO에 한해 진행된다. 그마저도 SBS의 월드컵 3D 중계화면은 빠진다.
또한 실험방송의 전파가 관악산에서만 이뤄져 3D 방송의 수신지역은 수도권으로 제한된다.
콘텐츠도 문제다. 월드컵 3D 중계는 카메라 구도, 배치 등에서 만족스럽지 않아 성공이라 장담하기 어렵다. 그외 프로그램들도 재방송이 대부분이다. 월드컵이 끝나고 나면 마땅히 방송할 만한 콘텐츠가 없다.
제작 설비를 갖추지 못한 때문에 향후 킬러 콘텐츠가 지상파 방송에서 3D로 제작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MBC 관계자는 “아직 제작설비도 갖춰지지 않아 프로그램 제작은 엄두도 낼 수 없다”라고 말했다.
■국내 3D 방송은 걸음마 단계…해외 의존도 높아
방송사들은 아직 3D 방송을 활성화하기에는 준비가 부족하다고 호소한다. 제작인력과 기술이 갖춰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너무 서두른다는 지적이다.
KBS는 지난달 ‘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 중계를 위해 3D 카메라 5조를 ‘쓰리얼리티’에서 임대했다. 운영을 위한 엔지니어 40여 명도 외부인력이었다. SBS의 월드컵 3D 중계도 소니사가 제작해 송출한 화면에 해설만 입혀 내보낸다.
KBS 관계자는 “아직 국내 3D 방송 산업은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라며 “3D 콘텐츠 유행이 불면서 갑자기 뛰어든 감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방송사들은 또한 3D 콘텐츠 제작에 투입되는 비용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3D 카메라는 1세트 당 10억원에 달하고, 3D 중계차, 조명, 편집장비 등 모든 것이 새로 갖춰야 한다.
방송사의 한 관계자는 “3D 콘텐츠 제작비는 일반 제작비의 3~4배가 소요된다”라며 “후반작업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동강도도 몇 배에 이른다”라고 말했다.
수익모델이 없다는 점도 투자를 꺼리게 되는 이유 중 하나다. 이 관계자는 “3D 콘텐츠 제작에 거액이 투자되는 만큼 수익을 거두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라며 “과거 HD 콘텐츠의 경우도 제작비 상승에도 수익증가가 없어 제작사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방통위와 문화관광부에서 내놓는 정책은 투자비용 지원이 대부분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에서 제작비용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도 좋지만 콘텐츠 수익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장 광고비만 해도 일반 방송과 똑같다”라며 “광고부분이 어렵다면 세제혜택 등의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파수 회수하고, 풀HD급 3D 방송을?
주파수 부분에서도 방송사와 방통위의 입장이 엇갈린다. 방통위는 현재 지상파가 보유한 주파수만으로도 충분히 3D 방송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방송사들은 풀HD급 3D 방송을 위해서는 여유 주파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지상파 방송사는 2012년 아날로그방송을 완전히 종료하고 700MHz 대역 주파수를 반납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 주파수를 통신 서비스 등에 이용해 경제적 가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방송사는 여유주파수 없이 새로운 방송 서비스를 내놔야 한다.
현재의 지상파 3D 방송은 주파수 대역폭 6MHz에서 두가지 화면을 동시에 송출한다. 화면을 MPEG2, MPEG4로 구분해 압축해 송출하면, 수신장비가 이를 받아 한 화면으로 내보낸다. 시청자는 안경을 써야 3D 화면을 볼 수 있다.
방통위는 화면 압축기술이 발달해 주파수 대역 하나만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 현재 기술 수준은 SD급만 가능하지만 10월이면 HD급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방송사들은 하나의 주파수 대역만으로 풀HD급 3D 방송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향후 무안경식 3D 방송을 위해서라도 여유 주파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도 덧붙인다.
이처럼 방통위와 방송사가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방송기술 연구가 집중력을 잃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방송기술 전문가는 “방송기술이 3D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송사는 3D 방송에만 올인할 수 없다”라며 “UD TV 등 초고화질 방송이나, 지상파 방송의 IP기반 전송기술 등 연구할 것은 많지만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중장기 로드맵 갖고 지상파 3D 방송 추진 필요
업계에서는 3D 방송이 아직 지상파 방송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콘텐츠, 국내 기술상황, 주파수 등에서 시기상조란 것이다.
학계의 한 전문가는 “해외의 경우를 보더라도 위성방송을 중심으로 3D 방송이 진행되고 있다”라며 “유료방송은 3D TV가 없어도 셋톱박스 지원이 용이하고 기술적으로도 어렵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상파 방송의 3D 상용화는 2013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며 “조급해 하면서 실험방송에 집착하기보다 생산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기초체력을 쌓아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케이블TV 월드컵 3D 중계 언제쯤?2010.06.22
- 2D→3D 변환, 3DTV 활성화에 '약인가 독인가'2010.06.22
- 방통위-문화부, 같은 날 다른 ‘3D’2010.06.22
- 3DTV 인체 유해성 논란 검증 '스타트'2010.06.22
방송가에서는 정부가 성과에 집착한다는 불만을 토로한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차근차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작년 정부에서 방송산업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3D는 관심사항도 아니었다”라며 “유행을 따라서 성과를 내보이겠다는 생각으로 서두르면 일을 그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