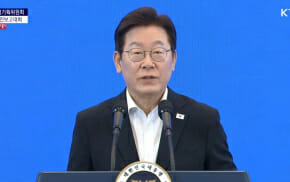“인터넷 접속 서비스와 네트워크 자원 일부를 공유하지만, 망 중립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서비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7일 배포한 ‘망 중립성 정책의 이해’ 해설서에 네트워크 슬라이싱 개념을 대신해 ‘특수서비스(specialized service)’를 이같이 설명했다.
물리적으로 하나의 네트워크를 논리적으로 분리된 여러 네트워크로 만들어 개별 서비스 특성에 맞는 맞춤형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기술을 뜻하는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5G 국제표준으로 논의되고 있다.
다만 국내에서는 5G 최초 상용화에도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망 중립성에 위배될 수 있다는 논의가 진행됐고. 지난해 말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면서 가능케 됐다.
이날 과기정통부가 배포한 해설서는 가이드라인을 비롯해 개정 논의에서 이뤄진 논의를 담은 것으로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가능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인터넷접속서비스와 특수서비스로 개념을 나눴다. 미국에서는 non-BIAS (Brodband Internet Access Services) 개념으로 정리하고 있고, 유럽은 국내와 같이 특수서비스로 정의했다.

해설서는 특수서비스를 두고 “인터넷접속서비스와 네트워크 자원 일부를 공유하지만 제공범위, 용도, 목적 등의 측면에서 구별되는 서비스를 뜻한다”면서 “일부 이용자의 특정 용도를 위해 품질보장을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특수서비스의 대표적인 사례는 IPTV와 인터넷 전화(VoIP), 음성 LTE(VoLTE) 등이 꼽힌다. 아울러 5G 시대 만개할 서비스로 지목을 받은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비롯해 원격의료, 스마트팩토리 영역에서 활용될 네트워크 등이 있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특수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기술 중 하나로 꼽았다.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서 이 기술 자체를 다루지는 않았다.
해설서는 “망 중립성은 기술중립적인 개념으로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는 기술 자체의 허용 여부를 묻는 것은 잘못된 질문”이라며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은 특정 기술의 망 중립성 위반 여부가 아닌 특정 서비스의 망 중립성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는 기술에 기반하고 있더라도 원격의료와 같이 일정 수준 이상의 지연속도 등 품질을 요하고 특정한 용도에 한정된 서비스라면 특수서비스로 허용될 수 있는 반면, OTT와 같이 일반인터넷을 통해서 제공될 수 있고 범용성이 확보된 서비스인 경우에는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이 규정하는 불합리한 차별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관리형 서비스에서 특수 서비스로
지난 2011년 LTE 시대가 시작될 때 제정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서는 IPTV와 VoIP를 최선형 인터넷과 별개의 관리형 서비스로 정의했다.
새롭게 개정된 가이드라인에서는 관리형서비스를 특수서비스 개념을 도입하면서 망 중립성의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가장 큰 변화는 기술방식으로 구분하던 것을 서비스 속성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IPTV와 VoIP는 기존 가이드라인의 관리형 서비스와 새 가이드라인의 특수서비스에 모두 해당하지만, 대가 기반의 우선 전송(paid prioritization)은 최선형 인터넷에 적용된다고 봤다.
즉, 과거에는 우선전송은 망 중립성에서 별개인 개념으로 따졌지만 새 가이드라인에서는 포함되면서 특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을 더욱 명확하게 정리했다는 설명이다.
과거 관리형 서비스는 최선형인터넷 품질이 적정 수준 이하로 저하되지 않는 범위로 조건을 달았지만, 새 가이드라인에서는 기존 조건에 더해 기술 발전에 따른 인터넷 품질 적정수준의 변화 가능성과 인터넷 품질유지 노력 등을 고려해야 하고 망 중립성 규제 회피 금지 조건이 추가됐다.
■ 특수서비스는 어떻게 구현될 수 있나
특수서비스 개념을 도입하면서 5G와 6G로 이어지는 데이터 전송 기술 발전에 따라 신규 융합서비스 혁신의 조화가 추구된 점이 주목할 부분이다.
ISP의 공급 측면에서 기술적인 제공 가능성 외에도 특수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존재해야 한다는 뜻이다. 해설서는 “ISP의 이익은 물론 수요자인 CP나 최종 이용자(end user) 요구에도 부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새 가이드라인에서 특수서비스의 정의는 ▲제공 범위의 측면에서 인터넷 종단점(end point)에 대한 보편적 연결을 제공하지 않을 것 ▲용도 측면에서 특정한 용도에 국한된 서비스일 것 ▲목적 측면에서 네트워크 자원을 구분해 이용하거나 별도 트래픽 관리기술을 적용해 일정 전송 품질을 보장하는 서비스일 것 등으로 규정됐다.
이를테면 제한된 범위의 단말장치나 서버에서만 연결되고, 심장박동 모니터링 기기와 같이 특정 용도를 갖는 등이 해당한다.
관련기사
- 5G 네트워크 슬라이싱 서비스 길 열렸다2020.12.27
- "5G 망중립성 논의, 차별과 차별화는 분리해야”2020.11.11
- 케이블TV도 IPTV 방식으로 방송...기술중립성 도입2021.11.26
- 21대 국회 과방위에서 주로 논의될 46개 현안 도출2020.06.08
가이드라인 8조2항에서 특수서비스 제공조건을 인터넷접속서비스 품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품질 적정 수준은 기술 수준 발전에 따라 달라지며 ISP는 지속적인 망 고도화로 최선형인터넷 품질을 유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정리했다.
해설서는 이에 대해 “규제기관이 품질 적정 수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것은 ISP가 적정 수준 품질만 유지해 망 투자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했다”며 “이용자들이 5G 품질수준은 4G보다 높을 것이기에 5G 환경에서 4G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는 것은 특수서비스 제공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