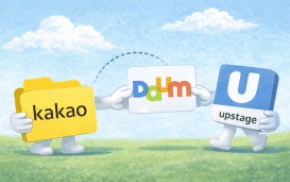해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되면 기념행사가 열린다. 행사장의 화려한 조명이 허망한 이유는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의 위치가 여전히 낮고, 개선돼야 할 점이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온갖 차별과 편견에 시달리는 정신장애인의 처지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우리사회가 이들을 대하는 태도는 미디어가 이들을 어떻게 묘사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우리 미디어는 정신장애인을 좋아한다. 바보, 사이코, 살인마 등 여러 모습으로 묘사하는데 있어 정신장애인만큼 만만하고 잘 팔리는 대상이 없다. 미디어 중에서도 언론은 특히 이들을 더욱 선호한다. 언론은 정신질환이 원인이 된 범죄·자살·가정파괴 등 사회적 부작용이나 부정적 결과에 초점을 맞추길 좋아한다.
악의적 의도가 있다기보다 선정적인 뉴스가 속칭 ‘잘 팔리는’ 언론의 속성에 부합한 선택인 셈이다. 이 선택은 생각지 못한 파장을 가져온다. 사람과 사람을 거치며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더 굴절되고 왜곡돼 간다.
화재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방화를 의심한다. 용의선상에 거론된 사건 관계자에 대한 조사 과정 중에 빠지지 않는 게 바로 정신병력 여부다. 용의자로 확인할 증거가 수집돼 특정되면 수사 브리핑에서 그간의 수사 결과가 발표된다. 그때 브리핑에 참석한 한 기자가 묻는다.
“피의자에게 정신질환이 있나요?”
“예.”
이제부터 경쟁이다. 어떤 기사 제목을 붙이느냐가 관건이다. ‘조현병’, ‘정신병력’ 여부를 기사 제목에 굳이 집어넣으면 방화 범죄는 정신질환자 범죄로 뒤바뀐다. 곧 기사는 포털사이트 메인에 소개된다. 수백,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고 조회수가 치솟는다. 온라인 광고액수도 덩달아 뛴다.

이런 뉴스는 정신장애인에게 깊은 생채기를 낸다. 폐해는 상처에서 끝나지 않는다. 뉴스는 여론과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이들에 대한 강화된 편견과 낙인은 정신장애인을 관리하고 통제해야할 대상으로 여기게끔 만든다. 더 잘 팔리는 기사를 만들고픈 언론의 얄팍한 욕심이 가져온 예상 밖의 결과다.
지난 2018년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대국민 정신건강지식 및 태도조사를 보면, 응답자 10명 가운데 6명은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위험한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60.5%).
또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에만 정신장애인 1601명이 목숨을 잃었다. 하루 4명꼴로 이어지는 죽음의 행렬. 정신장애인의 자살률은 타 장애인 자살률보다 3배가량 높고 전체 자살률보다 8.1배 높다.
한국 언론은 언론의 자유를 말하기 전에 정신장애인의 고립사나 자살,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차별 개선을 촉구하는 뉴스 제작에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끊임없이 정신장애인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뉴스의 홍수 속에서 언론 자유, 국민의 알권리라는 변명은 궁색하다.
지역에 정신장애인이 살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말을 들었어요. 사회적 약자가 가해자로 둔갑되고, 복지 사각지대에서 자기 관리에 실패한 일부의 일탈을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조현병, 너무 흔한 질환이에요. 누구에게나 발병할 수 있어요.
한 정신장애인이 체념하듯 기자에게 들려준 말이었다. ‘배제’란 대개 이런 방식으로 이뤄진다. 미디어가 흡사 ‘2등 국민’인 것 마냥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그들은 정신장애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