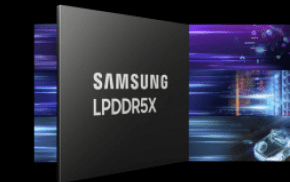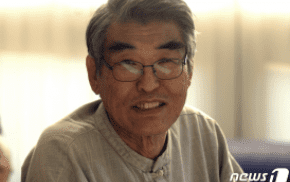2016년 11월 2일자 뉴욕타임스에 흥미로운 광고가 하나 실렸다. 협업 툴 전문기업 슬랙이 게재한 광고였다. ‘친애하는 마이크로소프트(Dear Microsoft)’란 광고 제목부터 눈길을 끌었다.
뉴욕타임스 맨 뒤면을 꽉 채운 이 광고는 그 무렵 ‘팀즈(Teams)’란 협업 툴을 내놓은 MS에게 보낸 편지였다.
이 광고에서 슬랙은 MS에 애정어린 충고를 보냈다. 크게 세 가지 충고를 했다.
첫째. 중요한 건 제품의 기능이 아니다.
둘째. 오픈 플랫폼이 꼭 필요하다.
셋째. 애정을 갖고 이런 작업을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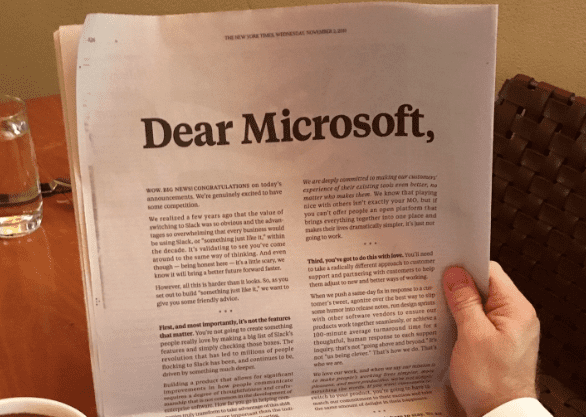
'팀즈' 내놓은 MS에 충고했던 슬랙, 4년만에 팔려
슬랙의 광고를 이해하려면 당시 상황을 알아야만 한다. 그 해 MS는 슬랙 인수를 추진하다가 실패했다. 그러자 ‘팀즈’란 자체 협업 툴을 만들었다. 슬랙은 ‘팀즈’가 자신들의 제품을 베꼈다고 생각했다.
‘소프트웨어 강자’ MS가 경쟁 제품을 내놓는 건 위협적인 일이다. 초기 인터넷 혁명을 주도했던 넷스케이프의 몰락을 통해 ‘운영체제 번들 판매’가 얼마나 무서운 지 목격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슬랙은 자신만만했다. 협업툴 분야에선 MS처럼 접근해선 성공하기 힘들다는 자신감을 강하게 드러냈다. 고객들과 긴밀한 대화 끝에 ‘지금의’ 협업툴을 만들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눈에 보이는 성능만 베껴선 시장에 제대로 안착하기 힘들 것이란 뉘앙스를 감추지 않았다.
MS의 장점은 윈도를 중심으로 한 생태계다. 슬랙이 보기엔 ‘폐쇄된 플랫폼’이었다. 반면 협업툴은 폭넓은 대화와 소통을 연결해주는 도구다. 그러니 ‘MS 방식’으론 성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대충 이런 의미를 담고 있었다. 천하의 MS에게 이런 충고를 하는 게 조금은 당돌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협업툴’이란 원론만 놓고 보면 그렇게 틀린 지적도 아니었다.

그런데 시장은 슬랙의 충고와 다르게 흘러 갔다. 윈도를 중심으로 한 폐쇄적 생태계는 ‘협업툴’ 확산의 걸림돌이 아니었다. 오히려 윈도 후광 효과가 생각보다 훨씬 강하게 작용했다. MS 팀즈와 슬랙의 이후 상황을 보면 이런 차이가 그대로 보인다.
팀즈가 처음 등장하던 2016년 11월 슬랙 이용자는 400만 명이었다. 2020년 슬랙 이용자는 1천200만 명 수준이다. 4년 만에 이용자가 3배 늘었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실적이다.
하지만 경쟁 제품인 팀즈의 위세와 비교하면 초라해보인다. 팀즈는 불과 4년 만에 이용자 1억1천500만명을 확보했다. 물론 오피스365 후광효과 덕분이다.
이쯤되면 브라우저 시장과 비슷한 모양새다. MS가 익스플로러란 브라우저를 내놓을 무렵 넷스케이프가 인터넷 관문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윈도의 후원을 받은 익스플로러는 순식간에 넷스케이프를 밀어냈다.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독립제품'이 통합 플랫폼 앞에서 얼마나 무력할 수 있는지 잘 보여줬다.
슬랙은 협업툴 시장에 뛰어든 MS에게 ‘중요한 건 제품 성능이 아니다’고 충고했다. 그런데 그 충고는 4년만에 자신들에게 되돌아 왔다. 중요한 건 제품 성능이 아니라 '유통망'과 막강한 영업력이란 또 다른 진리 앞에 무력하게 무너져 내렸다.
슬랙은 1일(현지시간) 세일즈포스와 277억 달러 규모 합병에 합의했다. 2019년 IBM의 레드햇 인수(340억 달러)에 이어 최근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성사된 합병 중에선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소프트웨어 시장의 한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
IT매체 더버지 기자 출신인 케이시 뉴튼은 이번 합병에 대해 ‘한 시대의 종언’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뉴튼의 분석을 좀 더 따라가 보자. (☞ 케이시 뉴튼 글 바로 가기)
그 동안 발 빠른 사람들은 효율적이고 성능좋은 툴들을 직접 골라 썼다. 입 소문을 탄 툴들은 ‘얼리 어답터’들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키워나갔다. 소집단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면서 점차 대중적으로 확대됐다.
슬랙은 이런 방식으로 성장한 대표적인 기업이다. 출범 18개월만인 2015년 하루 이용자 100만명을 돌파했다. 한 해 뒤인 2016년엔 이용자가 400만명으로 늘었다.
슬랙의 성공 스토리는 “최고 제품이 결국 시장에서 승리한다”는 평범한 진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미 시장의 문법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거대한 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에선 ‘일회성 혁신’보다는 ‘배포망’과 규모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시장에서 승리하는 앱들에겐 꼭 필요한 요소가 있다. 막강한 영업력이다.
케이시 뉴트는 “MS는 그걸 갖고 있었지만, 슬랙에겐 없었다”고 분석했다. 결국 슬랙은 부족했던 영업력(salesforce)을 세일즈포스로 채울 수밖에 없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합병은 협업툴 같은 생산성 소프트웨어 시장의 미래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
관련기사
- 세일즈포스의 슬랙 인수…국내·외 시장 전망은?2020.12.03
- 세일즈포스, 슬랙 인수…277억 달러 '빅딜'2020.12.02
- "세일즈포스, 1일중 슬랙 인수 공식 발표"2020.12.01
- CRM 최강 세일즈포스, 슬랙까지 손에 넣나2020.11.26
과연 군소 혁신 기업들에게 미래는 있을까? 과연 이들은 ‘독불장군(maverick)’으로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그렇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대답에 힘이 실리지 않는다. MS, 구글, 혹은 세일즈포스 같은 기존 강자들의 '거대한 우산'이 갖는 힘이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게 다가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