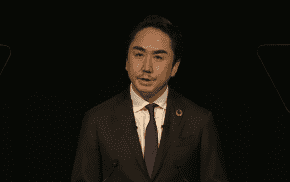'소셜 네트워크(The Social Network)'란 영화가 있다. 마크 저커버그의 페이스북 창업 과정을 그린 영화다. 2003년 저커버그의 대학시절부터 그린 이 영화는 10년 전에 '소셜 네트워크'란 제목을 달았다.
페이스북이 탄생할 무렵엔 이미 트위터를 비롯한 유사 서비스들이 인기를 끌었다. 조금 뒤엔 구글 플러스가 등장하면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란 용어는 일상생활 속에 자리 잡게 했다.
SNS가 익숙한 서비스가 된 지는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 영화 '소셜 네트워크'나 나온지도 벌써 10년이 지났다.
그럼에도 SNS의 본질에 대해선 여전히 적잖은 오해가 남아 있다. 11일 국내에서도 이런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일이 벌어졌다.
이날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페이스북 간의 세기의 재판 항소심 판결이 있는 날이었다. 이 소송은 1심부터 엄청난 이목을 끌었다. 이날 항소심에서도 취재진이 몰려 재판장을 정돈할 정도로 높은 관심이 이어졌다.
그런데 이날 SNS에 대해 재판부가 내놓은 설명은 황당하기 이를 데 없었다. '세기의 재판'으로 엄청난 화제를 모은 소송의 재판부가 분쟁 대상이 된 서비스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우선 재판부는 페이스북이 SNS 이용자가 불편을 겪을 것을 알면서도 서비스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했고, 이는 관련 법조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문제는 제한 행위가 이용자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현저하게 침해하지 않았다"고 봤다. 그런데 그 근거가 황당했다. 동영상과 사진 콘텐츠는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게시물 작성이나 메시지 전송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원고 측인 페이스북아일랜드리미티드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서비스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용자가 동영상과 사진 콘텐츠는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도 텍스트 작성만 가능하면 괜찮다는 이야기인 셈이다. 해당 서비스를 한번이라도 제대로 이용해 본 사람이라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논리였다.
2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이해하는 SNS의 특성과 본질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SNS는 말 그대로 이용자와 이용자 간 네트워킹을 제공하는 플랫폼 서비스다. 동영상, 사진, 텍스트 등의 콘텐츠와 링크 게시물, 메시지 등 콘텐츠 제공 방식을 구분하지 않고 서비스 자체가 친구와 친구를 연결해주는 네트워킹에 방점을 두고 있다.
넷플릭스 같은 OTT라면 재판의 대상이었다면 현저성이란 쟁점을 따지기 쉬웠을지도 모른다. 따질 것 없이 '동영상 콘텐츠 시청'이 서비스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페이스북이 운영하는 SNS는 나와 다른 누구를 연결해주는 네트워크가 핵심이다. 개별 콘텐츠가 아니라 전체 서비스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재판부는 어떤 종류의 콘텐츠는 이용할 수 있었으니까 괜찮다고 해석했다. SNS가 정확하게 어떤 서비스인지, 이용자들이 어떤 부분을 불편하게 생각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치열한 법리 공방 과정을 보면서 승소와 패소 여부를 점치기 어려웠다. ISP와 CP의 갈등, 이용자 보호 정책과 대형 글로벌 CP의 무책임의 충돌은 하루 아침에 이해할 것들은 아니다. 하지만 이같은 근거를 들고 있는 판결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이용자 이익 침해로 시작된 행정처분이고 이에 대한 처분 취소 소송이다. 이용자 관점으로 돌아가 보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같은 SNS 상에서 맺어진 친구가 동영상 콘텐츠 링크를 게시했을지, 사진을 찍어 올렸을지, 트위터처럼 140자 이내의 짧은 생각을 글로 올렸을지 모른다.
관련기사
- 방통위 또 패소… 법원 "동영상·사진 안돼도 페북 문제없다”2020.09.11
- 유럽→美 '개인정보 전송경로' 완전히 막힐까2020.09.10
- [기자수첩] 페북 이용자는 '구제할 수 없는 피해자'인가2020.08.31
- 페북-방통위 2심 쟁점 살펴보니2020.09.07
그저 SNS 친구들의 최근 활동을 보고 싶었던 것뿐이다. 내가 고른 것은 친구끼리 연결을 해주는 서비스일 뿐이지, 특정 콘텐츠만 보겠다고 한 것은 아니다. SNS 친구들이 어떤 콘텐츠를 올렸을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판사의 생각처럼 인스타그램에서 사진 없이 해시태그로 붙여진 텍스트만 보려고 한 것은 더욱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