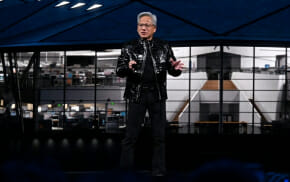# 국내 유료방송 시장이 거대한 자본을 보유한 IPTV 3사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전통적으로 상대적 약자 입장에 놓였던 ‘콘텐츠’ 시장 경쟁력 강화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수합병(M&A)을 통해 몸집을 불리는 IPTV가 상대적으로 강한 협상력을 통해 콘텐츠 시장을 압박할 경우 국내 콘텐츠 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이는 고화질 콘텐츠 제작이 불가능해지는 악순환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인터넷동영상(OTT) 서비스의 성장으로 국내 콘텐츠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린다.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는 콘텐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진단한다. [편집자주]
“IPTV와 케이블TV로부터 받는 프로그램 사용료로는 드라마 제작비용의 3분의 1도 충당할 수 없다. 대부분의 비용은 광고로 충당된다. 우리나라 콘텐츠 제작사는 엄밀히 말해 광고영업사에 가깝다.”
콘텐츠 업계 관계자는 국내 방송 시장 내 콘텐츠 제작 현실에 대해 이렇게 털어놨다. 유료방송 저가화가 고착되면서, 제작사는 콘텐츠 대가가 아닌 광고나 협찬 등 부가가치로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콘텐츠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호평에도 불구하고, 일선 콘텐츠 제작 사업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글로벌 시상식에서 작품성을 인정받는 등 전 세계적으로 국내 콘텐츠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지만, 불균형적인 수익 구조가 언제든 콘텐츠 경쟁력 하락을 부르는 뇌관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다.
PP 업계 관계자는 “높은 콘텐츠 경쟁력을 두고 승부해야 할 콘텐츠 사업자들이 콘텐츠에 대한 대가가 아닌 광고 및 협찬과 같은 부가가치를 통해 다시 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정상적인 수익구조가 심화되고 있다”며 “국내 콘텐츠 산업에 대한 관심이 부족할 경우 넷플릭스나 디즈니 등 해외 사업자에게 시장을 잠식당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 턱없이 부족한 콘텐츠 대가…케이블보다 IPTV가 더 적다
콘텐츠를 제작하는 프로그램사용(PP)사업자는 IPTV·케이블TV 등에 제작한 콘텐츠를 송출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PP는 이 수수료를 또다시 콘텐츠 제작에 투자한다. 건강한 구조라면 콘텐츠 제작 대부분이 IPTV나 케이블TV 등 플랫폼사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로 구성돼야 한다.
그러나 국내 PP의 수익구조에서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3분의 1에 불과하다. 대다수는 광고가 차지한다. 2017년 기준 PP의 수익구조는 ▲광고 44.8% ▲플랫폼에 받는 수수료 29.8% ▲협찬 9.2% 등으로 나타났다.
PP 사업자들은 특히 IPTV가 지급하는 콘텐츠 대가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토로한다. 2018년도 기준 IPTV가 PP에게 지급한 콘텐츠 대가(프로그램 사용료)는 2천373억원이다. 같은 해 IPTV가 기본채널 수신료로 벌어들인 매출이 1조5천138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매출의 약 15.7%를 PP에 지급한 셈이다.
이는 케이블TV와 비교하면 차이가 현저하다. 2018년 케이블TV(SO)는 약 2천529억원을 PP에 지급했다. SO의 수신료 매출이 5천890억이라는 점을 떠올리면, 매출의 약 26.1%를 PP에 콘텐츠 대가로 지급했다.
PP 업계 관계자는 “IPTV 사업자는 콘텐츠 대가를 투자가 아닌 비용으로서 인식하고 있다”며 “나날이 증가하는 제작비와 구매비를 오롯이 콘텐츠 제작사에 전가하면서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 콘텐츠 활성화, 제도적 고민 필요…과기정통부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 추진할 것"
국내 콘텐츠 업계는 합리적인 대가 산정을 통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콘텐츠 분야가 작년 한 해에만 약 20조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이뤄낸 신산업인 만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완화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PP 업계는 국내 유료방송사업자의 가입자당 평균 수익(ARPU)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정부가 방송법과 IPTV법에 따라 채널·상품·요금 수준 등을 규제하면서 유료방송 사업자 간 상품 구성의 차별성이 사라졌고. 유사한 상품을 보유한 사업자가 ‘저렴한 요금’에 초점을 맞춰 경쟁하면서 유료방송 저가화가 고착됐다는 지적이다.
PP 업계 관계자는 “유료방송 이용요금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각종 규제로 방송 상품 구성 자율성을 제약받고 있다”며 “방송법 개정을 통해 유료방송 이용요금 신고제를 도입하거나 다양한 방송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요금 변경 절차 간소화 등 제도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 유료방송 채널 개편 연 1회→2회로 확대…찬반 갈려2020.03.11
- 최기영 장관, 유료방송 협회장과 잇따라 면담…산업 활성화 논의2020.03.11
- “유료방송 M&A, 지역 콘텐츠 위기 부른다”2020.03.11
- ‘KT>LG>SK’ 순으로 유료방송시장 구도개편2020.03.11
이에 과기정통부는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유료방송 시장 규제 개선은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아이템을 찾고 있는 중”이라며 “이용 요금 신고제 등은 앞서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통해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로, 규제 개선을 통해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기본적인 입장은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