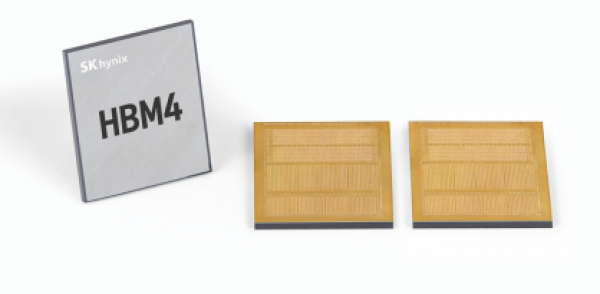“도심을 달리는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기 위해선 비싼 가격과 안전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5G와 AI, 빅데이터 등 ICT를 활용하면 이런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1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 페스티벌’에 발표자로 나선 김영락 SK텔레콤 뉴모빌리티 TF장은 이렇게 말했다. 자율주행차 개발에 완성차와는 전혀 관계자 없는 통신사업자가 뛰어든 배경에 대한 설명이다.
김영락 TF장은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2개의 기업을 예로 들었다, 테슬라와 구글이다.

테슬라는 비교적 저렴한 장비인 카메라를 탑재해 완성차의 가격 부담을 낮춤으로써 ‘팔릴 수 있는’ 차량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완성된 자율주행차는 날씨나 상황에 따라 오작동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구글은 고가의 장비인 ‘라이다’를 탑재해 정교한 자율주행 차량을 개발하고 있다. 다만 완성된 차량의 가격이 너무 비싼 탓에 일반 승용차로는 활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단점이다.
김 TF장은 ICT를 통해 테슬라와 구글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변 차량과 사물이 통신으로 연결된다면 고가의 장비가 없더라도 안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김 TF장은 “자율주행차를 중심으로 모든 자동차가 통신으로 연결되면 비싼 라이다나 센서를 적게 탑재하거나 저렴한 제품을 쓰더라도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다”며 “운전석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동차와 모든 사물이 연결되는 V2X 기술이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선 특히 5G가 중요하다, 5G가 초저지연이라는 특성이 있는 만큼, 즉각적인 정보 수집 및 제어가 자율주행의 안전에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김 TF장은 “지연시간이 10ms일 경우, 100Km/h 달리는 차량은 28cm가량 움직인다”며 “지연시간이 짧을수록 긴급 상황 시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 여유를 갖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내년 5월부터 자율주행차 여객·물류 시범 운행2019.12.19
-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안전성 기술표준 국제 공조 논의2019.12.19
- 中 베이징, 자율주행 테스트에 최고 3억 지원2019.12.19
- 11월부터 자율주행버스 세종시 달린다2019.12.19
SK텔레콤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 현황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지연시간을 줄일 수 있는 5G MEC(모바일엣지클라우드) ▲자율주행차량이 보낸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플랫폼 ▲도로의 차선·차량 등 정보를 수집하는 단말인 ‘로드러너‘ ▲양자암호 기반의 보안 서비스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김 TF장은 ‘C-ITS’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와 손잡고 추진 중인 C-ITS는 도로에 구축한 5G 네트워크를 통한 안전한 자율주행 인프라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김 TF장은 “서울시와 함께 120Km에 이르는 도로에 5G 기지국을 설치하고, 도로를 달리는 차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등 자율주행 실증단지를 만들고 있다”며 “미래 모빌리티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안전한 자율주행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