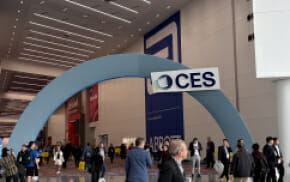15일 저녁 7시. 아침 10시에 들어와 끝나고 보니 저녁이다.
계단을 내려와, 온종일 있었던 그곳을 돌아본다.
아침에 들어갔을 때와는 다른 어둑한 저녁 속에 웅장하게 빛나는 그곳, '내가 중심이다'를 외치는 듯한 둥근 뚜껑을 뒤집어쓴 거대한 대칭 구조물.
국회.
눈앞이 뿌옇다. 내 눈이 뿌연 것인지, 세상이 뿌연 것인지. 국회서 나오는 빛은 뿌연 공기 속으로 흩어져 눈앞에 아른거린다.
오늘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빛은 그 자체로 아름답지만, 그 빛을 전달하는 매개체의 탁함은 그 아름다움마저도 희미하게 만든다. 마치 실재가 아니라 허상인 것처럼.
오늘의 국회는 저 먼지 속의 흩어진 빛과 같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국회이지만,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이지만, 그 아름다움과 숭고함이 가려진 이유는 뭘까. 그 아름다움이 실재가 아니라, 허상같이 느껴지는 이유는.

기자가 돼 처음으로 직접 들어가 본 국정감사장은 영상으로 보던 것보다 훨씬 권위적이고 일방적이었다. 한 국회의원은 증인의 태도를 나무랐다. 자신의 질의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답변을 했다는 게 그 이유다.
다른 한 의원은 기어코 그 증인에게 호통을 쳤다. “어디 국회의원한테”라며. 그리고 덧붙였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한다고. 그러니 지금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는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고.
누가 국회의원에게 “어디 (감히)”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권한을 주었나. 비판과 호통은 엄연히 다르다. 그들의 목소리가 통쾌하지 않고 불쾌하게 느껴진 이유다.
필요할 때만 갖다 붙이는 ‘국민의 대표’
그는 또 호통친다. 질의하지 않았는데 답변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리고 질의하라고 준 7분의 시간을 주구장창 자신의 말만 하다 끝내버린다. 질의는 하지 않는다. 아니, 답변을 원하지 않는 것 같다. 답변을 하려 하면 그 입을 가로막는다.
결국 기자의 컴퓨터 화면 속 커서는 몇 칸을 채 가지 못하고 그저 깜빡거리며 서 있다. 그 어떤 제대로 된 답변도 담아내지 못한 채.
호통을 친 의원은 답변을 듣고는 싶었던 걸까. 답변할 시간도 주지 않은 채 반말을 섞어가며 호통치는 그 목소리는 진정 국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가.
국정감사를 하는 이유는 정부에 대한 비판사항을 국민에 알리기 위해서다.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부분, 알아야 하는 부분을 대신 질문해주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이다. 그에게 대신 부여해 준 것은 '질문할 권리'이지 호통치는 '갑질'이 아니다.
오히려 그 갑질 때문에 정말 얻어내야 할 답변을 못 얻고 있진 않은가.
답변을 들을 생각은 안하고 질책과 호통만 치는 그 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그 자리는 국민을 위한 자리인지, 자신의 표심을 얻기 위한 보여주기식 자리인지.
그들이 고민해야 할 것은 망신 주기와 호통치기가 아닌, 날카로운 질문과 그를 통해 얻어내는 진실과 변화를 담아내는 목소리다.
관련기사
- "개인정보 보호원 설립은 규제만 늘려"2018.10.16
- 휴대폰 유통 갈등…"SKT 판매 않겠다"2018.10.16
- 국감, NIPA 원장 후보자 적합성 지적2018.10.16
- "NIPA, 최근 5년간 환수 못한 R&D 사업비 41.5억"2018.10.16
빛이 뚜렷이 전달될 때, 비로소 호통은 비판이 되고, 불쾌는 통쾌가 되고, 허상은 실재로 존재할 수 있다.
국회. 그곳은 누구를 위한 자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