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발자나 이공계 출신들과 얘기하면 답답할 때가 많다. 뭔가 한 마디로 잘 요약해주질 않는다. 결과보다는 과정을 장황하게 설명한다. 이런 한계, 저런 한계를 덧붙일 때도 많다. 그럴 거면 연구 결과는 왜 발표한 건지 모르겠다.”
#2.
“문과 사람들은 너무 쉽게 얘기한다. 뻔히 보이는 한계를 쉽게 생각하는 것같다. 실제보다 더 크게 얘기하는 걸 자주 경험한다.”
얼마 전 이과 출신 A와 나눈 대화다. 문과 출신인 내가 #1번과 같은 문제 제기를 하자, A는 곧바로 #2번으로 맞받았다.
A는 “개발자들에게 뭔가를 지시할 땐 모든 경우의 수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래야 정확한 알고리즘이 나온단 설명까지 곁들였다.
지난 며칠 동안 ‘인간을 왕따시킨 AI의 반란’이 화제를 모았다. 인간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AI란 공포감까지 확산됐다. 하지만 여러 가지 팩트체크 결과 ‘언론의 과잉보도’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 같다.

이번 해프닝의 가장 큰 문제는 ‘무분별한 인용보도’다. 영국 타블로이드신문이 보도한 내용이 ‘팩트체크’ 없이 확대 재생산됐다. 최소한의 의심이나 확인 절차만 거쳤어도 쉽게 하기 힘든 내용들이 사실인양 확산됐다.
■ 이과적 사고와 문과적 상상력의 조화 필요
물론 그 얘길 하자는 건 아니다. 난 이번 사안에서 좀 더 흥미로운 논점을 제시하고 싶었다. ‘화성에서 온 문과, 금성에서 온 이과’ 얘길 하고팠다.
나를 포함한 문과 출신들은 대개 결과를 중시한다. 어떤 연구를 했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데?”란 의문부터 갖는다. 그래서 어떤 논문이 발표됐단 소식을 들으면 당장 삶에 미칠 영향부터 찾는다.
하지만 이공계 논문 중 상당부분은 ‘실험실 환경’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게 실생활에 적용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문과 출신들이 보기엔 “왜 저렇게 자기 연구를 축소하려고 하지?”란 의문이 들 정도로 여러 한계 얘길 하는 건 그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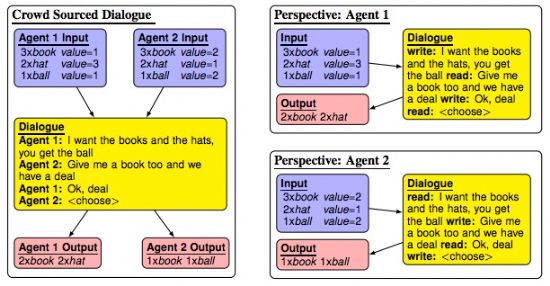
이번에 문제가 된 페이스북의 AI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다. AI가 ‘자기들만의 언어’로 대화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프로그램 오류 아냐?”란 생각을 하는 건 이과적 사고다. 반면 “가만, 저거 SF영화에서 흔히 보던 묵시록적인 미래 모습 아냐?”란 생각을 하는 건 문과적 상상력이다.
이런 얘길하면 “문과보다 이과가 우월하단 얘기냐?”고 힐난하실 분이 있을 것 같다. 우열을 가리려 꺼낸 얘기가 아니다. 학문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사고 체계가 그렇단 얘기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과 출신의 한계도 적지 않다. 문과 출신인 내가 보기엔 ‘융통성이 없어 보일 때’가 적지 않다. 유사한 사례도 비슷하게 처리하면 될 텐데, 그냥 시킨 일만 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럴 땐 ‘화성에서 온 문과 출신’인 나는 ‘금성에서 온 이과 출신’이 답답하고 얄밉다.
■ 과학 얘길할 땐 '금성서 온 이과' 논리를 이해해야
다시 얘기하지만 ‘화성에서 온 문과, 금성에서 온 이과’ 얘길 꺼낸 건 우열을 가리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 우열을 가릴 주제도 아니거니와, 가릴 방법도 없다. 다만 서로 다른 사고 방식을 이해하고 대화하잔 얘기다.
관련기사
- 'AI 왕따설'에 발끈한 페이스북…"낚시 기사다"2017.08.03
- 인간 왕따시킨 AI, 사실일까2017.08.03
- 네이버, AI가 음란물 알아서 막는다2017.08.03
- 구글 알파고는 어떻게 바둑경기 이겼나2017.08.03
그리고 또 하나. 상대방의 영역에 대해 대화하거나 보도할 땐 상대방의 사고 체계나 연구방식을 한번쯤 짚어볼 필요가 있단 얘길 하고팠다. 그래야만 ‘기계의 지배’ 같은 암울한 미래 얘기로 손쉽게 비약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서다.
통섭과 융합이 필요한 건 그 때문일 게다. 앞으론 이과 출신인 딸과도 이런 주제로 더 자주 대화를 해야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