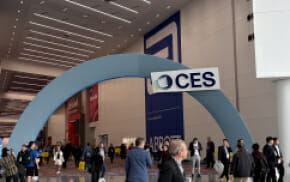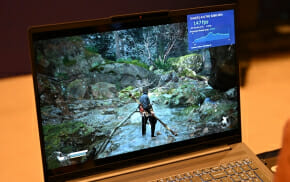영화 ‘해리포터’를 보면서 열광한 적 있다. 오해마시라. 스토리에 푹 빠진 건 아니다. 영화에 나오는 ‘예언자일보’ 때문이었다.
여기서 잠시 기억을 되살려보자. 마법 세계 소식을 전하는 ‘예언자일보’는 보여주는 신문이다. 때론 독자들의 눈앞에서 사건이 그대로 펼쳐진다. 간접적으로 전해주는 대신 직접 경험하게 해 준다.
200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다. 그 영화를 보던 난 “뉴스의 미래는 예언자일보가 될 것”이란 엉뚱한 상상을 했다. 그래서였을 게다. 그 무렵 ‘인터넷신문과 온라인 스토리텔링’이란 책을 쓰면서 마지막 장 제목을 ‘해리포터와 인터넷신문의 미래’라고 붙였다.
그 책 마지막을 대충 이렇게 마무리했던 것 같다. 조금만 마음을 열고 보면 ‘예언자일보’ 같은 몰입형 뉴스도 황당한 얘기만은 아니라고. 그게 어쩌면 인터넷신문이란 뉴미디어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 원래 뉴스의 출발점은 대화와 몰입
이런 생각을 한 건 물론 몬스터 고 때문이다. 몬스터 몇 마리 잡겠다고 이 더운 날 땀 뻘뻘 흘리며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들. 한 밤중에 캠퍼스를 휘젓고 다닌다는 바다 건너 사람들. 몬스터 있는 곳 찾아 속초로 몰려든다는 우리 이웃들 얘기 때문이다.
물론 안다. 뉴스는 게임이 아니란 걸. 사람들이 몬스터 고에 열광하는 건 증강현실(AR) 때문만은 아니란 걸. 그러니 이런 반론이 바로 날아올 거란 것도 잘 안다. “뉴스에 그만한 매력이 없으니, 뛰어봐야 벼룩 아니냐.”
따지고 보면, 뉴스는 원래 대화와 몰입을 지향하던 상품이었다. 자기가 보고 들인 얘길 다른 사람에게 흥미진진하게 들려주던 게 뉴스의 출발점이었다. 듣는 사람들이 추임새라도 넣어주면 더 신이나서 마구 ‘썰’을 풀어놓는 게 초기 뉴스 소통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다. (내 얘기가 아니라 저명한 학자들 얘기이니 믿어도 된다.)

이런 저런 생각을 하던 차에 흥미로운 칼럼을 하나 보게 됐다. 미국 포인터연구소 사이트에 실린 칼럼. 제목이 눈에 확 들어왔다. ‘저널리스트들이 포켓몬 고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What journalist can learn from Pokemon Go).’
칼럼 필자는 포켓몬 고를 계기로 AR 관련 보도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하게 됐다고 했다. 구글 글래스를 뛰어넘는 새로운 보도가 가능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한다.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다. 포켓몬 고 같은 게임을 즐기면서 특정 장소에 갔을 때, 그 장소와 관련된 뉴스를 보여주면 어떨까? 이용자들이 그 뉴스를 보고 바로 반응을 보일 수 있다면?
포켓몬 고는 소통의 표본같은 느낌이 든다. 이를테면 이런 방식이다. 열심히 헤매다니면서 포켓몬스터를 잡는다. 그런 다음엔 몬스터 사진을 페이스북 같은 소셜 미디어에 올린다. 그러다가 몬스터 사냥 나온 다른 사람과 만난다. 자연스럽게 소통을 하게 된다.
■ 독자 마음 움직일 수 있는 스토리텔링, 가능할까
포켓몬 고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몰입(immersion)’은 디지털 뉴스산업 종사자의 오랜 로망이었다. “독자들이 포켓몬 고를 즐기듯, 뉴스에 몰입한다면”이라며 부러워하는 건, 어쩌면 자연스런 감정인지도 모른다.
관련기사
- 포켓몬 고 개발사, 왜 구글과 결별했나2016.07.15
- '포켓몬 고 열풍'의 명과 암2016.07.15
- 포켓몬 고, '콘텐츠+AR 전략' 통했다2016.07.15
- VR 저널리즘, 뉴스의 오래된 미래다2016.07.15
물론 안다. 그게 기술만으로 되는 게 아니란 것을. 독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한다는 걸. 기술은 그 다음 문제라는 걸. 사람들이 포켓몬 고에 열광하는 것 역시 AR 보다는 ‘유년의 추억’을 간직한 캐릭터(스토리) 때문이란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입과 참여, 그리고 소통을 통한 뉴스 부가가치 극대화란 꿈은 버릴 수가 없다. 물론 쉽지 않은 꿈이다. 하지만 그 꿈을 향해 한발 한발 나아가다보면, 척박한 디지털 저널리즘 환경도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