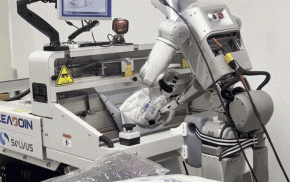‘저널리즘계의 아이튠스’는 세계 최대 신문시장인 미국에서도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
네덜란드의 기사 건별 판매 플랫폼 브렌들이 마침내 미국 대륙에 상륙했다. 지난 23일(현지 시각)부터 제한된 규모로 베타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승부수를 던졌다.
브렌들은 지난 2014년 '기사 건별 판매'란 새로운 개념을 들고 나와 화제가 됐던 언론 스타트업이다. 네덜란드 정부 혁신기금 20만 유로(약 2억6천만원) 지원을 받고 탄생했다.
설립 초기 네덜란드 주요 언론사 기사만 판매했다. 하지만 지난 해 6월 독일 최대 미디어그룹인 악셀 슈프링어도 파트너사로 가세했다. 덕분에 빌트, 디벨트를 비롯해 슈피겔, 디자이트 등 독일 유력 언론사들도 브렌들에서 기사를 판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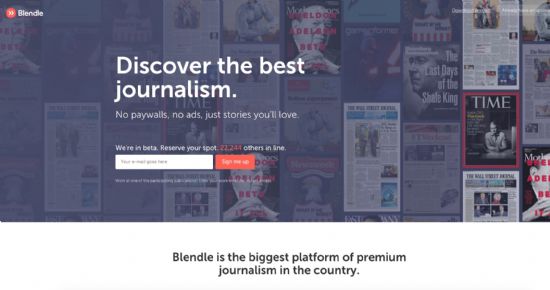
브렌들은 출범 10개월 만에 20만 가입자를 모집했을 정도로 초기부터 화제가 됐다. 현재 가입자는 65만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브렌들은 유럽 시장에선 어느 정도 안착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폭발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가입자 65만명이면 나쁜 수준은 아니다. 가입자 중 3분의 1 가량이 유료 구매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NYT-WP-WSJ 등 20개 주요 언론사 참여
하지만 미국은 조금 다를 수도 있다. 상대적으로 유료화에 대한 저항이 유럽보다는 강한 편이다. 브렌들의 미국 진출에 낙관론과 비관론이 엇갈리는 것은 이런 배경 때문이다.
일단 출반은 나쁘지 않다. 초기 파트너로 20개 사가 참여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참여사 면면들도 만만치 않다.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의 내로라하는 매체들이 동참했다. 타임, 뉴스위크, 이코노미스트 같은 유력 잡지들도 파트너로 참여했다.

미디어 비평 전문 매체 니먼랩에 따르면 브랜들은 초기엔 이용자 1만 명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가격은 신문 기사는 19~39센트, 잡지 기사는 9~49센트 수준으로 제한했다.
일단 구매한 기사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환불해준다. 수익은 참여 언론사가 70%, 브렌들이 30%를 갖는 구조다. 애플 앱스토어와 비슷한 방식이다.
브렌들이 ‘저널리즘계의 아이튠스’로 불리는 건 이런 사정 때문이다.
일단 시장 규모는 미국이 더 크다. 미국 인구는 3억1천900만명으로 서비스 출범 당시 독일(8천만)이나 네덜란드(1천700만)보다 훨씬 많다.
하지만 출범 당시 상황은 굉장히 다르다. 브렌들은 네덜란드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때 주요 신문, 잡지를 거의 모두 파트너로 영입할 수 있었다. 유럽 쪽에선 대부분 콘텐츠가 유료 제공되고 있던 상황이어서 파트너 모집도 상대적으로 수월했다.
■ 미국에선 '고급 콘텐츠 접할 수 있다'는 전략으로 접근
미국에선 상황이 조금 다르다. 20개 사가 초기 파트너로 참여하긴 했지만 여전히 공짜로 볼 수 있는 대체재가 많은 편이다.
그러다보니 브렌들은 미국 시장엔 유럽과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고품질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브렌들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인 알렉산더 클뢰핑은 니먼랩과 인터뷰에서 “미국에선 일반적인 경우라면 쉽게 읽기 힘들었던 콘텐츠를 찾는 데 도움을 준다는 부분을 더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 시장과는 강조점이 다르다는 얘기다.

특히 일단 브렌들 앱을 깐 이용자들은 다른 곳에서 공짜로 제공되는 콘텐츠도 기꺼이 구매할 가능성이 있다고 클뢰핑이 강조했다.
브렌들에 참여한 미국 언론사들은 구체적인 가격 정책도 공개했다.
니먼랩에 따르면 워싱턴포스트는 기사 건당 가격을 19센트로 책정했다. 이 회사는 또 신문에 게재된 모든 기사를 브렌들에도 송고할 계획이다.
이미 유럽에서 브렌들에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내 가격은 39센트로 책정할 계획이다.
반면 대표적인 시사 주간지인 ‘타임’은 브렌들을 새로운 독자들을 공략하는 기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전략에 따라 초기에는 잡지에 게재될 기사를 공급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브렌들에 최적화된 콘텐츠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유료화 저항 만만찮은 미국서도 성공할까
브렌들의 강점은 간편한 소액 결제 시스템과 환불 시스템이다. 일단 가격은 기사를 공급하는 언론사들이 자체적으로 설정하도록 돼 있다. 유럽에서 서비스될 때 브렌들에 올라온 기사 한건당 평균 가격은 20센트 수준이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할 경우 200원 남짓한 가격이다.
미국 언론사 중엔 워싱턴포스트가 비교적 평균치에 가까운 가격을 책정했다. 반면 월스트리트저널은 상대적으로 고가 정책으로 출발한 셈이다.
관련기사
- '저널리즘계의 아이튠스' 美서도 통할까2016.03.28
- 백기 든 페북 창업자…'뉴스룸'의 처참한 실패2016.03.28
- 애플은 사람 구글-페북은 알고리즘…왜?2016.03.28
- 뉴스 시장에도 '아이튠스 모델' 확산되나2016.03.28
물론 기사 한 건 가격이란 점을 감안하면 결코 저렴한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기사를 보는 가격이란 점을 감안하면 그렇게 비싸다고 볼 수도 없다.
유럽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출발한 브렌들은 과연 미국 시장에서도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 성공할 경우 기사 판매 패러다임의 거대한 변화를 몰고올 브렌들의 진짜 실험은 이제 막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