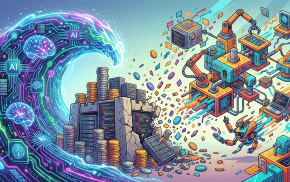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중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를 놓고 두 개의 전선(戰線)이 형성되고 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 폐지해야 한다"는 논리와 "시행 1년도 안 된 단통법 자체가 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는 형국인데, 업계가 이해관계에 따라 대립하고, 관련 정부 기관 사이에서도 미묘하지만 입장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미래부의 경우 폐지를 고려할 때가 됐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고, 방통위는 폐지 불가 입장이다. 소비자는 대다수가 폐지 쪽을 선호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 미래부 vs 방통위, 엇갈린 행보
진흥 기능이 우선인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와 규제 기능이 먼저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입장이 최근들어 엇갈리고 있다.
방통위는 단통법을 시행한 지 아직 1년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정할 경우 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것으로 우려한다. 또 개정할 경우 시장이 오히려 혼란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따라서 일단 더 지켜보자는 의견이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단통법 덕에 이통 시장이 안정화하고 있고, 이통사가 마케팅 비용을 줄인 대신 저렴하고 다양한 요금제를 내놓음으로써 가계통신비를 내리는 데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이 법이 요금 인가제와 함께 대표적인 규제법이고 규제 완화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손을 볼 때가 됐다고 보는 쪽이다. 이 법 시행 이후 크게 위축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단계적인 규제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미래부 한 관계자는 "이 법이 어차피 3년 한시법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게 일몰 이후에 시장 혼란을 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제조·중소유통점 vs 이통사
이 법 시행 이후 단말기 유통시장이 급격히 위축되자 제조사와 생계형 중소 유통점들은 상한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 법 도입 당시 삼성전자와 달리 찬성 입장을 냈던 LG전자는 상한제를 폐지해달라고 정부에 건의문까지 제출했다. 법 시행 이후 팬택이 파산 위기에 몰린 데다 자사 휴대폰 매출 또한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애틀러스리서치에 따르면, LG전자의 국내 휴대폰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11월 36%를 정점으로 지난 5월 19%까지 추락했다. LG가 잃은 점유율은 지난 연말 대화면 제품을 처음 선보인 애플이 대부분 가져갔다.
시장이 줄어든 데다 점유율까지 낮아지자 정부에 긴급 SOS를 신청한 셈이다.
시장이 축소되면서 생계형 대리점이나 판매점도 곤란해졌다.
유통 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단말을 다량 보유했다가 재고로 쌓여도 일정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조금을 얹어 소화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팔릴 때마다 한 대 씩 추가 주문을 넣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단통법 최대 수혜자가 택배나 퀵 오토바이일 정도"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와 달리 이통 3사는 대부분 상한제를 찬성하는 쪽이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상한제를 없앨 경우 과거처럼 소모적인 보조금 전쟁이 다시 불붙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서비스와 요금에 대한 본원적 경쟁을 할 수 없으며 기술 투자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통사가 규제를 찬성하는 역설
관련기사
- "요금할인 폭 확대 자급제 활성화 유도할 것"2015.07.03
-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12→20% 상향2015.07.03
- 지원금 상한 올라도 소비자 편익은 “글쎄”2015.07.03
- 갤S6 출시 앞두고 '보조금 상한' 얼마나 늘까2015.07.03
이 과정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이동통신 3사가 상한제에 관한 한 정부 규제를 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규제가 적을수록 더 반기는 법인데 이통 3사의 경우 상한제와 관련해서는 이례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
이와 관련 업계 한 전문가는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시장이 이미 포화된 상태에서 과거와 같이 보조금을 통해 이용자 유치 경쟁을하는 게 더 이상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단통법이 마케팅을 규제하는 법이기는 하지만 현재의 시장 구도 속에서는 이통사가 손해볼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제조사나 유통점의 편을 들 이유가 없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