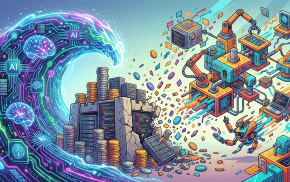서울시의 신고 포상제 시행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버가 공유경제, 혁신기술, 경제적 기회 등을 내세워 서비스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택시조합 로비로 서울시가 공유경제의 대표 모델이자 기술혁신을 일으킨 우버를 탄압, 형편이 어려운 기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논리를 편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우버 측 입장은 빈약한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 무엇보다 실정법(구체적으로 여객자동차운수법)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는 점을 제대로 인정해야 한다.
먼저 공유경제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한 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력 소비를 뜻한다. 한마디로 나눠쓴다는 뜻이다. 하지만 우버의 경우 회사가 중간에서 수수료를 챙기고 기사와 승객을 이어주는 서비스를 골자로 하는 것인데 이를 과연 공유경제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기술혁신에 있어서도 우버가 진짜 새로운 서비스인가도 되짚어볼 일이다. 결제 및 이용이 편리하긴 하나 이 또한 콜택시 서비스를 ‘전화’에서 ‘앱’으로 옮겨놓은 수준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우버는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원조 ‘이지택시’에 비하면 후발주자에 다름 아니다.
물론 기존 콜택시보다 편리하고 서비스 만족도가 높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반대급부가 적잖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 먼저 이용료가 높고 사고 발생 시 보험 적용 받기가 상대적으로 힘들다. 또 기사가 되기 위한 문턱이 낮다보니 외신을 통해 보도된 것처럼 성폭행 등 범죄 우려도 크다.
서울시가 생계를 이어가고자 하는 운전자들의 경제적 기회를 박탈한다는 주장도 다시 생각해볼 일이다. 우버는 서민인 기사들을 걱정해주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정은 다를 수 있다. 우버 이용약관을 살펴보면 운전자나 승객들에게 불리한 조항 투성이이기 때문다. 모든 책임이 운송제공자에게 있고, 승객은 불만 시 회사에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도록 돼 있다. 한 마디로 불공정한 약관이다.
특히 영어 약관과 번역 약관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영어 약관이 유일한 진본 문서로 간주되는 점이 그렇다. 한국에서 사업하는 외국 기업이 현지의 법과 이용자를 얼마나 '호구'로 생각하는 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다. 홈페이지에 안내된 고객서비스 내용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관련기사
- 우버, 서울시장에 ‘신고포상제’ 재고 촉구2015.01.06
- 우버 신고 포상제 내달 2일부터…포상금은?2015.01.06
- 2015년에 부각될 인터넷 핫이슈는?2015.01.06
- '설상가상' 우버, 검찰로부터 기소당해2015.01.06
정부의 중복 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국내 인터넷 기업조차 선뜻 우버 편을 들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현지 법과 환경에 대한 제대로 된 고민 없이 막무가내로 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으로 비치니 편을 들어주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기술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해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크다.
물론 우버를 옹호하는 여론도 일부 있다. 과거 택시들의 승차거부와 불친절에 피해를 본 이들이 대부분 우버에 호의적인 반응이다. 하지만 우버가 기존 택시의 대안이 될 수는 없다. 겉으로는 편리해 보여도 시장 질서를 무분별하게 파괴하고 법을 무시한 기업이 장수할 순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