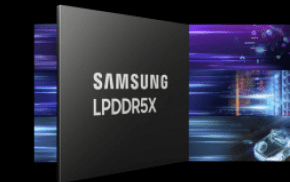[오스틴(미국)=손경호 기자]사람 없이 움직일 수 있는 무인 자동차 개발이 먼 나라 얘기만은 아닌 것 같다. 국내 대학 연구팀이 개발한 무인 자동차가 해외에서도 그 기술력을 인정 받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무인 자동차 개발을 위한 법적,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연구팀은 실제 주행 테스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개최 중인 내쇼날인스트루먼트의 연례행사 'NIWeek 2014'에서 진행 중인 '글로벌 스튜던트 디자인 컴퍼티션(GSDC)'에서 최종 수상 후보자 톱3에 국내 카이스트 연구팀이 개발한 무인 자동차 '유레카(EureCar)'가 이름을 올렸다.
최종 수상자는 5일 'NI 엔지니어링 임팩트 어워드'에서 발표되지만 한국NI 관계자에 따르면 25개국에서 본선에 진출한 28개 팀 중 여러 경쟁자들을 제치고 톱3에 든 것만으로도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연구팀을 이끌고 있는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심현철 부교수에 따르면 무인 자동차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것은 이미 5년 전부터다. 2010년 현대자동차가 주최한 '무인자율주행차량경진대회'에 출품작을 내기 위해 개발하기 시작한 무인자동차 연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다. 2회 대회에서는 현대차 중 소울을 개조해 만든 무인 자동차가 5등을 차지했다.

그 뒤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개발해 올해 10월 1일 개최 예정인 3회 대회에 나가게 된 무인 자동차가 바로 유레카다. 심 교수와 함께 프로젝트를 시작했던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이웅희 연구원㉙은 이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유레카의 특징 중 하나는 다른 무인 자동차에 비해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NIWeek 설명회 자리에서 발표를 맡은 이 연구원은 최고 시속 128km로 달리면서도 여러 센서를 동원해 주행상황을 확인해 필요한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기존 자동차는 이미 내비게이션이나 계기판 이외에 여러 부분들에 대해 전자장치를 통한 제어가 이뤄지고 있다. 이제 자동차는 기계라기 보다는 전자제품에 가깝다는 것이 관련 업계 공통의견이다.
유레카 역시 다양한 전자장치를 활용했다. 연구팀이 2년 동안 개발한 7개 레이저 스캐너와 4대 카메라는 도로주행상황, 장애물, 정지신호 등을 정확히 인식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유레카 개발 뒤 5개월 간 추가개발기간을 거쳐 제작된 유레카 터보는 보다 저렴하고, 적은 센서를 사용해 개발비를 대폭 낮췄다. 이를 통해 본격적인 상용화 가능성까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유레카와 비교해 유레카 터보는 개발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약 4분의 1로 단축했다.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와 함께 NI가 제공하고 있는 그래픽 기반 개발 소프트웨어인 'LabVIEW', 각종 센서로부터 받아들인 정보를 토대로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음대로 변경해 설계할 수 있는 'Compact RIO'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연구팀은 CPU, FPGA(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반도체), 각종 센서를 통해 입출력(I/O)된 정보를 받는 장치 등을 활용해 무인 자동차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현했다. 이 과정에서 사용된 것이 LabVIEW와 Compact RIO다. LabVIEW가 엔지니어들을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라면 Compact RIO는 이를 통해 무인 자동차가 장애물을 피하고, 속도를 조절하고, 원하는 경로로 이동하기 위한 모든 종류의 I/O를 처리하고 필요한 제어를 구현하는 하드웨어 역할을 한다.
무인 자동차는 특성상 정확한 타이밍에 빠른 속도로 판단해 핸들을 조정하거나, 브레이크, 가속페달을 밟는 등 동작을 수행해야 한다. 한국NI관계자에 따르면 랩뷰, 컴팩 RIO 조합을 통해 최대 25나노세컨드(ns) 수준으로 동작을 구현할 수 있다.
기술면에서는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산 무인자동차 개발이 활성화 되기 까지는 여전히 여러가지 해결해야할 어려움들이 산적해 있다.
이 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는 딱히 실험할 만한 곳이 없다는 점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사람이 운전하는게 아니라 안전성이 확보된 장소에서 테스트를 해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럴 만한 장소를 찾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심 교수는 예전 무인 자동차는 정해진 길만 따라가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됐지만 지금은 이보다 훨씬 기술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무인 자동차 테스트 자체가 법적 규정이 없어 테스트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관련기사
- 美 오바마 "드론 가이드라인 만들라" 명령2014.08.05
- 정부, 이스라엘과 무인기 개발 협력키로2014.08.05
- 지구 지배를 위한 구글 5대 프로젝트2014.08.05
- 美 FBI "무인車, 치명적 무기 될 수도"2014.08.05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 네바다, 플로리다 주 등에서 무인 자동차 테스트를 위한 라이선스를 발급한다. 유럽에서도 아우디 등 자동차 회사가 적극적으로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반면 좋은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구현할만한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심 교수는 연구를 계속해 일반 도로 환경에서도 끌고 다닐 수 있는 수준까지 기술력을 높일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민사소송 등이 문제가 얽힐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이 기술 개발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