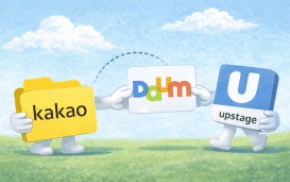LG그룹을 대표하는 전자정보통신기업인 LG전자와 LG유플러스의 마케팅 전략이 판이하게 달라 눈길을 끈다.
두 회사는 각각 제조업체와 이동통신 서비스 업체여서 처한 환경이나 사업 내용이 다르다. 하지만, 국내 시장에서 선두 업체를 추격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는 같은 입장에 있다. LG전자는 큰 격차를 두고 삼성전자를 뒤쫓아가는 입장이고, LG유플러스는 시장 2위인 KT와 1위인 SK텔레콤을 맹추격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 것이다.
재미 있는 것은 두 회사가 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펼치는 마케팅 전략이 많이 다르다는 사실이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선제 공격을 통해 시장을 흔드는 반면 LG전자의 경우 선두업체를 따라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최근 엄중한 시장 상황에서 보여준 두 회사의 가격정책이 대표적인 사례다.

■LG유플러스, 더 싼 LTE 무제한 요금제로 시장에 파란 일으켜
LG유플러스는 LTE 시대에 접어들면서부터 공격적인 마케팅과 상품 출시로 3G 시절 ‘헬지’의 설움을 날리고 있다. 이제는 ‘만년 꼴찌’보다 ‘퍼스트무버(First Mover)’라는 수식어가 더 어울릴 정도다. 특히 20년 넘게 고착화된 이동통신시장의 판도를 흔들고 있다는 점에서 업계 안팎의 주목을 받는다.
변화의 시작은 LTE망 구축부터다. 지난 2011년 7월 처음 LTE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과감한 전략으로 ‘최초’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2012년 3월에는 세계 최초로 LTE 전국망 구축을 완료했고, 지난해 4월에는 국내 최초로 문자·음성·LTE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내놓으며 변화를 주도했다.
한 발 앞선 전략이 ‘LTE는 유플러스가 진리’라는 광고 문구를 이용자들에게 각인시켰다. 고객 인식도 점차로 바뀌어가는 추세다. 실제로 LG유플러스는 지난해 번호이동 시장에서 지속적인 우위를 보이며 3사 중 유일하게 가입자가 순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지난해는 그동안 꿈쩍하지 않았던 통신시장에서 본격적인 판 바꾸기를 주도하고 변화를 이끌어내 LG유플러스의 이름을 세계에 떨친 한 해”라며 “올해도 치열한 경쟁 환경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객에게 차원이 다른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LG유플러스의 힘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의 ‘선도 전략’은 지난 2일 가격을 낮춘 LTE 무제한 요금제 출시에서도 드러난다. 이날 LG유플러스는 기존에는 10만원 이상 고가에만 머물러있던 LTE 무제한 요금제를 8만원대로 끌어내렸다.
이상철 부회장은 “경쟁사들이 따라왔으면 좋겠다”는 발언으로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SK텔레콤, KT 등 경쟁사들은 채 하루가 지나지 않아 유사한 요금제를 부랴부랴 쏟아낼 수밖에 없었다.

■LG전자, 프리미엄 정책 고수하다 삼성전자에 일격 당해
LG전자의 기본적인 마케팅 정책의 골자는 '프리미엄'이다. 기술 우위를 강조하며 당연히 고가의 가격을 책정할 만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점유율은 3~5위이지만 제품만은 세계 1~2위인 삼성전자와 애플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지난 2월 출시한 전략 스마트폰 ‘G프로2’가 대표적인 사례다. 국내 출고가가 99만9천900원이다.
문제는 세계 시장은 물론이고 국내 시장도 프리미엄 이미지만으로는 통하지 않는 상황이 됐다는 데 있다.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세가 주춤해지는데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얼마 뒤 신제품 갤럭시S5를 과거보다 10만원 이상 싼 86만6천800원에 내놓은 것도 그런 시장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LG전자로서는 1위 업체가 먼저 가격을 내린 상황에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대체적으로 LG가 G프로2의 스펙 우위를 주장하며 고가를 계속 유지할 수도 있겠지만 더 많은 돈을 주고 갤럭시S5 대신 G프로2를 살 사람은 많지 않아보인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관련기사
- 이상철 LGU+ “LTE무제한, 경쟁사 따라와라”2014.04.03
- 영업재개 LGU+, 8만원대 LTE무제한 초강수2014.04.03
- SKT, 갤S5 출시 강행…출고가 86만6800원2014.04.03
- 80만원 갤럭시S5 쇼크에 90만원폰 휘청2014.04.03
물론 해외 시장의 경우 어느 정도 상황이 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프리미엄 시장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박종석 LG전자 MC사업본부장(사장)은 “중국에서 단순 판매량보다는 브랜드 위상을 올리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씨를 뿌리는 과정에 들어섰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점유율을 얼마나 방어할 수 있느냐다. 특히 화웨이, 레노버 등 이미 LG전자 못지 않는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 중국 업체를 상대하는 일은 더 버거워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