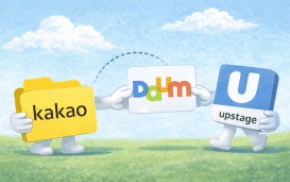이번에는 칸막이가 사라질 수 있을까?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차세대 국가 성장동력으로 '자율주행(무인) 자동차'와 '웨어러블 컴퓨터' 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토교통부와 지도서비스 관련 규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지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산업부가 무인 자동차와 웨어러블 컴퓨터 분야 투자를 위해 내건 명분은 사물인터넷 시대를 겨냥한 국내 '스마트센서' 산업 육성이다. 중장기적으로 단순히 센서를 넘어 정보기술(IT)과 거기에 기반한 서비스를 융합한 전략기술을 개발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연동될 지도서비스 관련 국토부 법률이 산업 육성의 족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무인 자동차는 사람을 태우지 않아도 주변 환경을 파악해 스스로 달리는 주행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을 말한다. 영상카메라, 위성항법장치(GPS), 각종 센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SW)가 동원된 구글의 '로봇카'가 유명하다.
웨어러블 컴퓨터는 각종 센서를 품고 몸에 걸친 채로 쓰는 기기를 통칭한다. 운동량 측정, 일상 기록, 증강 현실 등의 서비스 구현 가능하다. 구글이 시범 개발중인 스마트안경, 삼성전자가 출시한 스마트시계가 대표적인 사례다.
세계 각국 기업들은 특정 국가가 아니라 글로벌 무대를 겨냥해 무인자동차와 웨어러블 컴퓨팅 비즈니스를 준비중이다. 그런만큼, 지리적인 조건에 따라 기능이나 서비스 측면의 제약이 발생할 경우 경쟁력에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무인 자동차가 그 이름처럼 사람 없이 달리려면 자신의 위치와 주변 상황을 탐지할 센서뿐 아니라 그 정보를 바탕으로 출발 지점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경로를 판단할 지도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한다.
일상 기록, 생활 정보 탐색 등으로 일상에 활용할 웨어러블 컴퓨터 제품에는 사용자 위치정보, 동선을 활용할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나 서비스에 지도 데이터가 결합돼야 한다.
그런데 현행 국토부 소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측량법)'은 국내 지도의 국외 반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학술 목적으로는 허용된 적이 있지만 상업 용도엔 전례가 없다.
개발자나 서비스 업체가 무인 자동차나 입는 컴퓨터 관련 기술을 상용화한뒤 세계 시장을 겨냥한다면 국내 제품과 별개로 국외 제품 개발과 최적화를 위한 비용과 시간을 더 들여야한다는 얘기다.
소규모 업체는 이런 환경에서 중복 개발로 인한 시간적, 물질적 투자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시장성이 검증되지 않은 분야에서 지도반출 규제는 융합기술, 서비스 개발에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국토부 지도 관련 규제가 풀릴 가능성도 있다. 산업부가 지난 7일 '산업부-미래부 차관급 정책협의회'를 통해 부처간 협력체제를 갖추겠다고 밝혔고, 여기에 국토부가 무인 자동차 과제와 관련된 협력 부처로 이름을 올렸다.
관련기사
- 산업부-미래부, 중복 논란 미래 먹거리 사업 협력2014.03.10
- 정부, 5천억 투입 웨어러블 산업 육성2014.03.10
- 산업부, 스마트센서 육성에 1500억원 투입2014.03.10
- 한국서 구글맵스로 도보 길찾기 가능해지나2014.03.10
그러나 아직 국토부와의 협력은 가시화되지 않았다. 복수의 국토부 관계자는 산업부나 미래부 쪽으로부터 무인 자동차 관련 제도와 기술 분야에 대한 공조 요청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무인 자동차 관련 계획을 담당하는 산업부 관계자도 세부 실행 방향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정책 목표(기술 개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제를 검토해 필요한 부분은 국토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