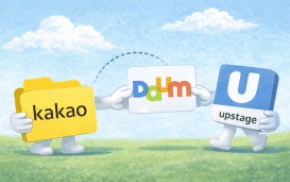KBS가 의문스럽다. 줄곧 외쳐온 ‘수신료 현실화’의 발목을 스스로 잡는다. 어쩌다 잘잘못을 가리지 못하는 처지가 됐을까 걱정이 들기도 한다.
‘공영방송’이란 역할에도 의문이 든다. 자사 홍보실의 해명자료를 주요 뉴스로 삼았다. 그마저도 왜곡이란 지적이 나온다.
보도 하루 뒤 앞뒤가 꽉 막힌 기자회견과, 그에 앞서 이사회의 날치기 인상안 의결 과정, 여야 추천 이사들의 논의 과정을 보고 있자면 정말 수신료를 올려받고 싶은 것인지 묻고 싶다. 대답이 ‘그렇다’라면 ‘한심하다’는 말 밖에 할 수 없겠다.
TV수신료 2천500원. 1981년에 정해진 금액이다. 당시 신문 구독료에 맞춘 것이라고 한다. 단순히 흘러간 시간만 보더라도 인상 필요성은 설득적이다.
공영방송이 맡은 사회적인 임무도 고려한다면 힘들다는 점, 이해한다. 공영방송의 광고 수익은 다음 문제로 치자. 일단 올해 방송광고 시장이 대폭 줄어 재원위기에 몰린 점도 헤아릴 수 있다.
딱 여기까지다.
수신료를 올려 받기 위한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내던 돈도 아까워지는 마음이다.
보도 공정성과 제작 자율성을 갖추고 수신료를 논하자는 목소리가 공영방송에게 뭐가 그리 힘든 문제였는지 모르겠다. 그 내용의 협의를 거치지 못해 여권 추천 이사들의 단독처리로 잡음을 빚었다니, 방송통신위원회 한 상임위원의 말처럼 그간 KBS 선배들과 이전 경영진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 수신료 인상, 왜 상업적인 의도로 보이게 만들었나
이사회가 의결하지도 않았다는 수신료 물가연동제와 TV수신료 징수 대상 확대라는 안건이 정부에 제출되는 공식 문서에 실린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
장기적인 정책 제안이란 핑계는 먹히지 않는다. 현행 방송법과 스스로 만든 개정안까지 싣고서 제안이라 할 수 있는가. 이 나라 법을 만드는 곳은 KBS가 아니다. 방통위도 아니다. 국회의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다.
그 내용은 더 한심하다. 국민의 주머니를 32년 동안 더 열지 못했던 사정을 고민하지 못했는가. 3년 단위로 KBS 재정현황과 물가를 반영해 조정하자는 자신감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부터 설명해야 한다. 물가 상승률만 고려해도 문제인 점을 자사 재정현황을 고려하자니 충격이다.
또 스마트폰, PC 등에도 징수하자는 내용은 돈벌이에 눈이 먼 상업적인 일반 기업으로만 보인다. 향후 TV 시청 행태 변화에 대한 KBS의 역할은 보이지 않고 수신료 부과 논리만 잔뜩 늘어놓았다.
과연 공영방송인가라는 물음만 남았다. 이 물음에 ‘그렇다’는 대답을 선뜻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영방송의 공익적 기능과 책무를 유지하기 위해 수신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졌다.
관련기사
- 스마트폰 수신료 논란…“KBS, 거짓말 말라”2013.12.19
- KBS "스마트폰·노트북도 수신료 내라"2013.12.19
- KBS, 4천원 수신료 인상 '골머리'2013.12.19
- KBS 수신료 2천500원→4천800원으로?2013.12.19
언론 학계 여러분의 말씀처럼 정말 차라리 잘 되었다 생각한다. 수신료 인상도 급하고 보도 공정성도 급한 문제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수신료 현실화 이전에 KBS와 공영방송의 현실화를 고민하기 시작하자.
사실 더 급한 문제다. 수신료를 올리기 어려웠던 것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어려워질 것 같다. 지금의 KBS를 보고 있으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