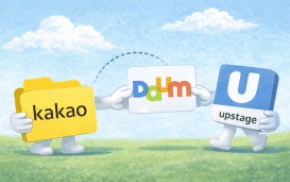#오전 8시 출근길. 관심 분야 주요 뉴스를 확인한다. 9시 반. 이메일을 보내 타 부서와 회의 시간을 잡는다. 점심 시간. 거래처 직원과의 약속 장소 위치 파악을 위해 지도를 열고 길을 찾는다. 저녁 7시 막히는 퇴근길. 어제 놓친 드라마를 내려 받았다. 밤 10시. 이번 주말 데이트 때 입을 셔츠 한 벌을 온라인 쇼핑으로 구입했다.
김 대리의 하루는 평범한 사람들의 그것과 닮았다. 하지만 이 김 대리가 시각장애인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NHN 자회사 ‘엔비전스’에서 테스트 엔지니어(Test Engineer)로 일하고 있는 김형섭㉛ 대리는 전맹(전혀 볼 수 없는 장애인)이다.
그는 일반 사람들과 같은 일상을 보낸다. 다만 볼 수 없고 들을 뿐이다. 길을 걸으면서 지도를 듣고, 드라마 감상도 화면해설의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 전맹은 시각장애인 중에서도 5%에 불과한 특수 장애인이다.

김 대리는 작년 2월부터 네이버 서비스가 장애인들의 실사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웹접근성 테스트를 주도하고 있다. 4일 NHN 그린팩토리 사옥. 사내 임직원들 대상 강연에서 김 대리는 메일·카페·검색·쇼핑·지도 등 네이버의 대표 서비스 시연을 진행했다.
“시각장애인들에게 다양한 메뉴의 서비스들이 한 화면에 모여 있는 포털은 무척 복잡합니다. ’홈유형 선택’, ‘목록 시작’과 같이 스크린리더가 읽어주는 소리를 듣고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파악해야 해요.” 능숙하게 네이버 화면을 조작하는 그의 시연 동작이 모니터로 비춰지자 직접 해당 서비스에 관여하고 있는 직원들의 ‘눈’이 바빠졌다.
시각장애인들의 입장에서 네이버는 꾸준히 진화하고 있다. 음성만으로 메뉴 카테고리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스크린 리더의 특성을 고려한 페이지 구조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11년 웹접근성 조직을 구성한 NHN이 작년부터 장애인 테스터들을 적극 기용한 결과다.

이런 노력에 불과 1년 전만 해도 불편한 것 투성이었던 네이버 서비스에 조금씩 변화들이 생기고 있다. 김 대리는 “예전에는 그림으로 된 보안 문자 입력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은 카페 가입조차 불가능했지만 이제 ‘음성으로 듣기’ 기능이 생겨서 문제 없다”며 “물론 버튼을 누르자마자 바로 음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좀 여유를 두거나 신호음이 나오는 식으로 더 개선되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인들이 편히 이용하는 자동완성 검색어 기능 등 아직 시각장애인에게는 ‘그림의 떡’인 서비스도 많다.이미 접근성이 어느 정도 구현돼 있는 웹페이지 내에서도 세심한 배려가 부족한 부분도 있다. 김 대리는 “가령 메일 같은 경우 ‘제목’이라고 말한 뒤 제목에 쓰인 글귀를 읽어주면 시각장애인들이 훨씬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될 것”며 “웹접근성은 이 같은 사소한 배려에서 출발한다”고 했다.
관련기사
- 웹접근성 지원, 인증마크가 걸림돌인가2013.04.05
- 장차법 시행 코앞, 갈 길 먼 ‘웹접근성’2013.04.05
- “장애인 웹접근성 개선”…SKT 솔루션 개발2013.04.05
- 네이버가 구글이 될 수 없는 이유2013.04.05
기업들만 웹페이지를 개선한다고 해서 웹접근성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그는 “포털 등의 사용성이 높아진다고 해도 스크린리더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능숙도 등이 더해져야 한다”며 “엔비전스는 시각장애인 중에서도 초보 사용자들이 차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NHN의 개별 서비스 담당자들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각장애인 전용 페이지를 만들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선 “장애인용 웹사이트를 별도로 두다보면 일부 기능 제한이 있을 수 있고 동등한 정보제공 측면서 분리되는 느낌을 줘 또 다른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웹접근성은 ‘연결된 사용성’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