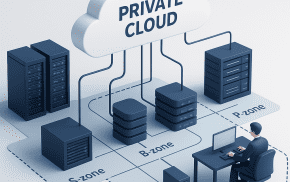같은 동물 세 마리를 나란히 놓아 터트리는 스마트폰 게임 '애니팡'은 두 달 만에 2천만 사용자가 즐기는 '국민놀이'가 됐다. TV 시청률로 환산하면 50%에 가깝다. 카카오톡 친구들과 실시간 점수를 비교해 '경쟁'하게 만드는 것, 애니팡의 인기 비결이다. 사람들은 근무 중이나, 한 밤 중에도 시간만 나면 '하트'를 날린다.
애니팡은 '어제 본 드라마, 예능 프로 그 연예인'의 자리도 빼앗았다. 이제 동료 셋만 모이면 애니팡 이야기를 한다. 아니, 애니팡을 직접 '한다'. 게임에 '말'이 낄 자리가 어딨겠는가. 주고 받는 대화는 하트가 갈음했다. 잠깐의 커피 타임, 주문 후 식사가 나오는 순간 까지도 모두들 스마트폰에 코 박고 어쩔줄을 모른다. 밥 먹을 땐 휴대폰 꺼내지말라고 야단치던 어머니 마저도, 애니팡 친구 순위 목록에서 만난다.
'카톡 친구들과 함께'라는 콘셉트 속에서도, 애니팡의 경쟁은 철저히 ‘나 홀로’가 기본이다. 애니팡은 5인치 미만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만 존재하는 가상공간이다. 나 혼자 두 눈을 5인치 세상 속에 한정시킨 후, 빠르게 동물을 맞추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그렇게 기록한 고득점을 친구들과 비교하는 것도, 게임이 끝난 후 올라가는 순위 속 화면에서만 가능하다.
TV가 등장하고 사람들은 공동체 와해를 걱정했다. TV가 가족간 대화 시간을 뺏는다고 지적했다. 책 읽을 시간이나, 성찰할 시간을 앗아간 TV를 ‘바보상자’라 불렀다.
스마트폰은 사람을 더 바보로 만든다. 사람들은 아침에 눈뜬 후, 다시 잠들 때까지 움켜쥔 스마트폰을 놓지 않는다. 대화는 커녕 생각할 시간 조차 없다. 스마트폰이 흘려보내는 정보를 서둘러 받아들이기도 바쁘다.

‘로그아웃에 도전한 우리의 겨울’의 저자 수잔 모샤트도 같은 지적을 했다. 그는 스스로 “아이폰에 홀딱 빠졌다”고 고백했다. 그는 아이폰과 점심 식사를 하고, 출퇴근 전차를 탔으며, 산책했다. 정보를 향한 갈증이 아이폰을 가장 친한 친구로 만들었지만, 결국 만족 없는 욕망의 블랙홀만 맛봤다고 모샤트는 말한다.
모샤트의 고백은 지금,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다. 가족도, 친구도, 애인도 스마트폰보다 나를 더 잘 알지 못한다. 문자, 통화, 웹 페이지 검색, 사진 촬영 등 내 일상의 세세한 부분은 모두 스마트폰에 기록된다. 스마트폰 없이, 단 하루 견디는 것은 지독한 고립을 경험하게 한다. 스마트폰이 등장한지 단 몇 년 만의 일이다.
사람들은 스마트폰 안에서 길을 잃었다. 누군가를 기억하고 경험하는 것을 스마트폰이 대신해 준다. 중요한 정보를 기억하는 것은 물론, 여가 시간까지 오롯이 나눠가진다. TV에서 컴퓨터, 다시 노트북에서 스마트폰까지, 점점 '스마트'해진 기기들은 개인을 그렇게 똑똑함 속에 가둬버렸다.
산업은 스마트기기들을 더 많이 팔기 위해 '똑똑함이 만드는 편안한 미래'를 광고하지만, 그 속에 갇힌 개인들은 말 그대로 소비자의 역할에만 머물 뿐이다. 누군가와 함께 무엇을 만드는 창조자가 필요한 시대에, 스마트 기기가 불러온 역설이다.
관련기사
- 세계 스마트폰 이용자 10억명 돌파2012.10.22
- 한콘진, '스마트콘텐츠 어워드' 출품작 접수2012.10.22
- 스마트폰 앱 불법복제 기승…21.5%↑2012.10.22
- 내년도 스마트폰 스크린 “대세는 5인치”2012.10.22
지난 7월 기준, 국내 스마트폰 보급량이 3천만대를 넘어섰다. 성인부터 초등학생까지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세상이다. 휴대폰은 물론, TV, 노트북, 태블릿에 가전제품까지 자꾸만 늘어나는 '스마트 기기'들은 조그만 화면 앞으로 사람들을 불러 세운다.
지금 이 시간, 수많은 사람들이 무료한 시간을 때우려 애니팡을 켠다. 애니팡의 동물들이 터지는 그 순간, 현실 세계를 경험할 우리 시간도 함께 터져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은 그저 기우일까.